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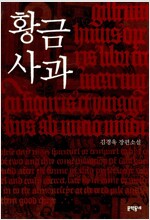
사과의 맛, 백설공주의 사과, 그리고 황금사과..가운데 끼인 저 설탕의 맛은 뭐지? 다름아닌 "김사과"의 글이다.
호,불호가 명확히 갈린다는 김사과의 글이 나는 좋다. 차갑게 말하는 그 속에서 두려움과 간절함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이다.

천국에서를 읽을 때, 그녀의 글에 심하게 몰입했었던 기억이 오롯하다. 무엇때문이었을까? 낯설게 다가온 것들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경험의 왜곡이 일어났다고나 할까? 여튼..사과처럼 상큼하고 달달하지 않은 그녀의 글과 그녀의 이름이 어쩐지 잘 어울리는 느낌. 부실한 이로 사과를 깨물때..머리끝까지 쭈삣해지는 시림을 느끼는 것 처럼..
사과에 일종의 포비아가 있다면 다들 웃는다. 바늘이나, 벌레에 대한 포비아에는 익숙하니까..하지만 그런게 있다. 내가 그렇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를 작가 김사과는 능숙하게 끌어내곤 한다. 그래서 그녀가 좋다. 그래서 그녀의 글이 호감인것이다. 단순하게도 말이다.
어느 날 즈음에 "사과야 미안해..널 오해했어"라고 사과에게 사과하는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과를 한다는 건, 어쩌면 용감해지는 것이며 자신의 오류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일지도 모른다.
사과를 한다는 것이 나약하고 비굴한 것이라는 이상한 통념과 학습효과가 부쩍 사과해야할 일들에 사과하지 않고 뻔뻔한 작태를 갖게 만드는 상황을 종종 마주한다. 소위 목소리 큰놈이 이긴다는 논리다. 버티면 이긴다는 수작이기도 하고..
올바르게 사과하는 법, 사과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건 아닐까?



정중하고 정확한 사과는 당연한 용서를 구할 수 있을거다. 그렇게 이어지는 관계들은 감정적인 호감이 아닌 이성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요즘 우리나라의 대표 화두가 되는 "소통"의 시작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김사과의 이야기에서 뜬금없이 소통의 이야기까지..삼천포로 빠진 이야기.
사실..김사과라는 이름이 좋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거다. 아참..김개미도 참 좋은 이름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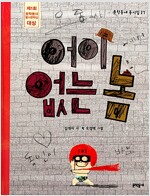
그리고 마침내 문을 열었다. 순간 밀려든 바람이 케이의 얼굴을 때렸다. 그건 생각보다 견딜 만했다. 그녀는 더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바깥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한걸음, 또 한걸음 이어지던 그녀의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지다 마침내 달리기 시작했다.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문득 그녀는 수족관 따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이상 두렵지 않았다. 기억의 푸른 물은 나를 익사시키지 못할 것이다. 헤엄쳐 그 강을 건널 거니까. 그렇다 헤엄쳐, 저 너머에 닿을 거다. 거기에 한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을 것이다. 그것이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다. 거기가 천국일지 지옥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가겠다. 아니, 지금 간다. 케이의 붉게 달아오른 뺨위로 이른 봄의 투명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봄이 왔음을 느꼈다. 여름에서 깨어날 시간이었다.
(천국에서 p341~ p 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