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
주제 사라마구 지음, 송필환 옮김 / 해냄 / 2008년 2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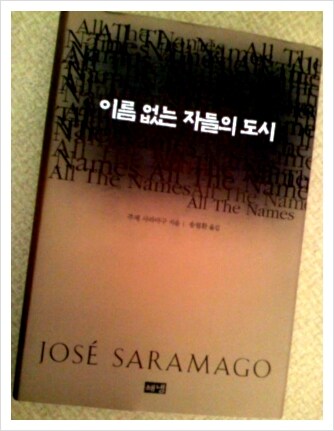
<눈먼 자들의 도시>와 <눈뜬 자들의 도시>의 뒤를 잇는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라는 책 소개를 보았고, 그 순서에 맞게 책일 읽기 시작했다. 앞의 두 권은 그렇게 흐름이 맞아 떨어진다. 그러나 이 책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는 그 흐름에서 저만치 떨어져 있다. 앞의 두 권처럼 연결이 되는 것도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 궁금증을 가진 채로 책을 마저 읽었고, 다 읽고 나서야 원래 이 책의 원제는 <모든 이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럼 왜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일까?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주제 씨’를 제외하곤 모두 이름 없이 묘사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눈먼 자들의 도시>의 연작이라는 점을 내세워, 유명세를 등에 업고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도록 만들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약간은 찜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난다면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이름들>도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제 씨가 등장한다. 출생과 사망의 서류가 공존하고 있는 중앙 호적 등기 보관소에서 일하는 주제 씨는 그야말로 무료하고 변화 없는 일상을 산다. 주위에서 보기에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생활을 하는, 즉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큼 말이다. 생각만으로도 따분함을 불러일으키는 그에게 낙이라면 하나, 바로 유명 인사들의 기사들, 기록들을 수집하는 것이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면식도 없는 어떤 여인의 기록을 손에 넣게 된다. 물론 절대로 자의는 아니었다. 그런데 순간 그에게는 그 여인에 대한 궁금증이 샘솟듯이 피어오른다. 그런 열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그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는 허상과 현실, 상상과 꿈속을 오가며 이곳저곳을 헤맨다.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혼란뿐이다. 드디어 그의 삶에서 무료함 내지는 지루함을 벗어던지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존재와 인식이라는 것. 이것은 이미 많은 곳으로부터 접해보았을 소재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또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주제 사라마구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인식하는 것들은 실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의 인식 활동만이 그리고 그에 의해서만이 존재한다고 말이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끔찍이도 이름을 소중히 여긴다. 자신의 이름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며, 자신의 이름이 욕되는 것은 죽어도 싫다. 이름, 참 중요하다. 대부분은 이름으로 서로를 인식하니까.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이름이 없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마저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우리도 때로는 숫자 번호를 부여받고서 “몇 번 대답해 봐.”하는 선생님의 말씀에도 “몇 번 손님!”하는 직원의 말에도 스스럼없이 응답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인식 하나하나도 헷갈리고 어려운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주는 소설을 읽으면서 자극받고 느끼는 게 있는 것이다.
결국 죽음이란 다 똑같은 거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섞이고 뒤바뀌면 어때,
어차피 세상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