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적을 만들다 - 특별한 기회에 쓴 글들
움베르토 에코 지음, 김희정 옮김 / 열린책들 / 2014년 9월
평점 :



움베르토 에코를 모르던 시절 우연히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며 화내는 방법>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 참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많구나' 감탄했었죠. 제게 유식한 사람이라곤 당시 좋아하던 과학 선생님 정도였으니까요. 즐거운 책읽기였고, 책을 덮은 후 어쩌면 저는 제 인생의 다음 단계로 이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시 움베르토 에코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인상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닥쳐오는 '읽어야 할 책' 목록에서 에코는 언제나 후순위로 밀렸었죠. 친구가 열광하는 <장미의 이름>도 아직 펼쳐보지 못했고, 저기 책장에 굳건히 꽂혀있는 <책의 우주> 역시 늘 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에코와 다시 만날 때가 아니었나 봅니다.
<적을 만들다>를 덮은 지금, 또 한 번 다음 단계로 자리를 옮겼을지 모르겠습니다만(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어찌되었든 제 소회는 이렇습니다. '다정하디 다정한 어느 노교수와 사석에서 그의 지적인 이야기들을 무지막지하게 얻어 들은 행복한 기분'이라 말이죠.
사실 행복하다기 보단 풍성하달까요. 이유인즉, 이 책은 문학과 인류학, 미학, 사회학... 과 같은 폭넓은 주제에 대해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해달라 조르는 어린 손자에게 들려줄 법한 상상 속 이야기('속담 따라 살기')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관심글'로 지정해두고 시간 날 때 집중해서 읽고 싶은 칼럼 같은 글('위키리크스에 대한 고찰', '적을 만들다')도 있고요, 종교와 역사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주제를 조명한 글('천국 밖의 배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채 소화도 되기 전에 새 정보를 가지고 공격해왔기 때문에 '아, 이번 전투는 완전한 패배다' 하는 심정으로 책장을 넘기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흠...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저를 열광시켰던 몇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무엇보다 책의 제목인 '적을 만들다'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인간 역사에서 주류(!)의 인사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규명하고 그들을 타자화 시켜왔습니다. 유럽인들은 유대인들을, 남자들은 여자들을,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기독교인들은 기타 종교를, 백인은 유색 인종을... 다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적'은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체계를 유지하고,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요즘 시대는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가요? 그건 모두 과거의 일이라고요? 어째서죠? 바로 오늘도 이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13세 소년, 이스라엘군 총격에 사망
적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 체계를 측정하고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그것에 맞서는 장애물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적이 없다면 만들어 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13쪽
평화를 사랑하는 온순한 사람에게도 적의 필요성은 본능적이다. - 35쪽
'적을 만'드는 문제에는 '차별'의 문제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종차별의 역사>(크리스티앙 들라캉파뉴, 예지 출판사)를 보면 '차별'에 관한 우리의 상식이 얼마나 허약한지 단번에 알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벙어리 장갑'이라 말하고 '체중'에 집착하고 타인과 나를 구분합니다. 나는 범주 안에 들고자 노력하며 그것이 성공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차별'과 '적'에 관한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며 항상 긴장하고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작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름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이자 우리의 고정 관념을 파괴하는 것이다. - 36쪽
'검열과 침묵'은 해당 내용을 통째로 외우고 싶을 정도로 빠져들었던 주제였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사이버 망명... 하셨나요?)에 더욱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대목이기도 하지요.
과거 조지 오웰 시대에 '빅 브라더'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권력이었다면 이 시대는 '소음'이라는 새로운 '빅 브라더'가 등장해 정보를 교란합니다. 언론은 내보내야 할 뉴스와 그렇지 말아야 할 뉴스를 선별하고 이 뉴스만 들으라고 소리칩니다. 사람들은 그 소음에 귀를 맡기고요.

- <'검열과 침묵' 185쪽>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윤리적인 과제 중의 하나는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190쪽)'는 말에 눈이 머물게 됩니다. 치열하게 떠드는 소음 속에서 내면을 응시하기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겠지요(아, 이제 고요함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었군요). 그렇지만 권력이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전시하는 개인들 덕분에 정보를 마음껏 수집하고, 언론은 그런 권력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 의도한대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 결단코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그곳에 균열을 낼 수 있다면, 고요로 돌아가서 성취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위키리크스에 대한 고찰' 역시 흥미롭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위키리크스가 그 내용적인 면에서 분명히 스캔들에 불과했지만, 형식적인 면에서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306쪽)'고 말합니다. 정보는 더 이상 권력의 손아귀에만 있지 않습니다. 위키리크스 덕분에 권력의 비밀에 접근하는 시도가 성공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머지 않은 미래에 작가가 상상한 것처럼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정보 싸움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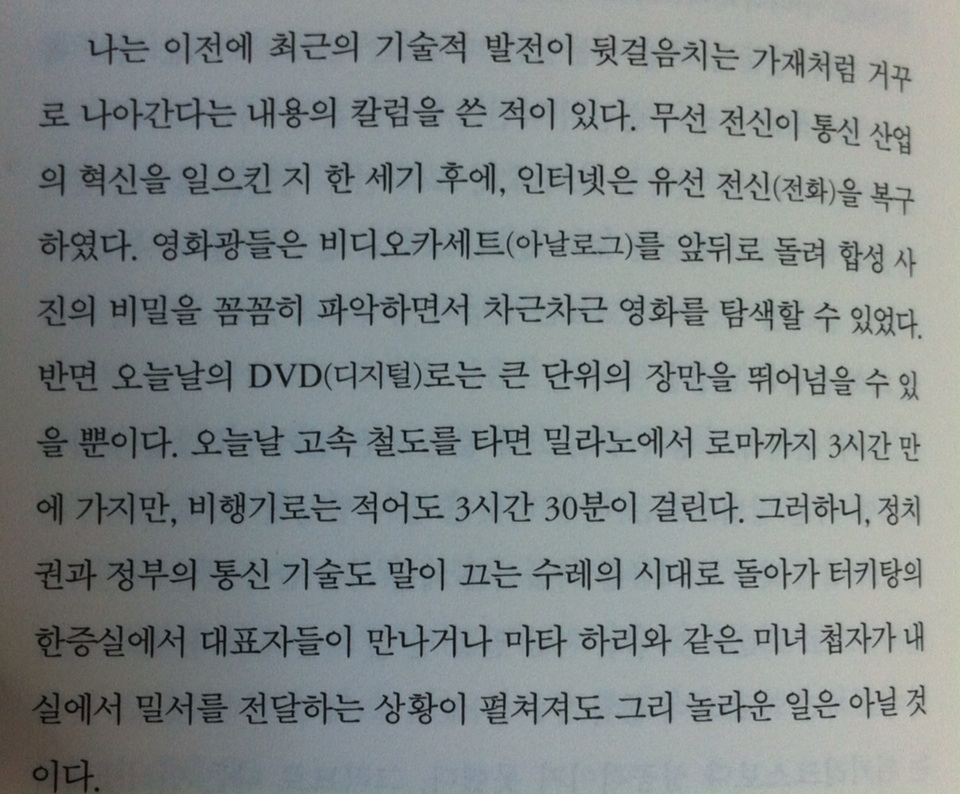
- <'위키리크스에 대한 고찰' 310쪽>
움베르토 에코만큼이나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 흥미로운 주제들에 관해 언젠가 작가를 직접 만나 들을 날을 기대하며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