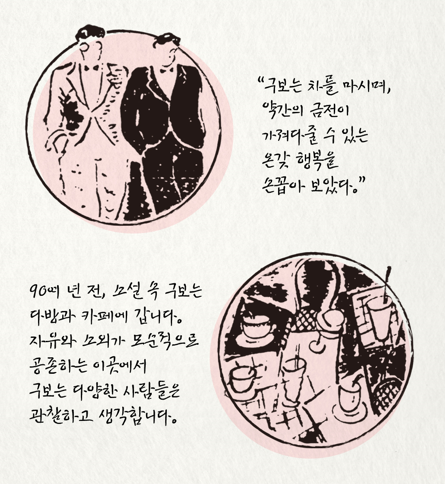아주 오랜만에 쓰는 페이퍼.
함께 리뷰를 쓰고 싶은 책들이 있어 메모
파견자들 VS 세계 끝의 버섯


김초엽의 인터뷰만은 늘 읽고 있다. 쓰기의 성실함, 직업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파견자들>을 6개월 만에 썼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나 말하자면 어떤 프로젝트를 6개월 만에 종료했다는 말이다. 보통의 직장인들에게도 6개월은 짧지 않은 시간이고, 어떤 결과를 낼 수도 있는 시간이다. 그가 어떤 자세로, 얼마나 집중하고 한 권이 늘어지지 않고 끝낼 수 있도록 노력했을까.
하여간, 그의 책에서 균류의 세계가 나온다고 한다. 표지에서도 약간 은유되어 있다. 비인간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계를 그릴 때 인간을 더 잘 그려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세계 끝의 버섯>은 새로운 삶의 자세를 배우고, 나아가 삶의 무진한 영감을 주는 책이다.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안정감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 싶다. 안정감은 물론 훌륭하지. 그러나 다른 면을 볼 기회가 적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다른 면을, 삶을 왜 생각하겠는가. 하지만 삶이 모양이 불안정하다면 안정되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길이 아니고, 안정감이 줄 수 없는 훌륭함을 찾아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송이 버섯은 어떻게 살아갈까? 인간이 이렇게 파괴한 곳에서. 그러나 여기에서조차 인간은 우습게도 과대되어 있다.
덧: 표고버섯을 요리해 먹을 일이 있었는데 버섯을 데치면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마치 고기의 식감이 나는 건지 새삼 감탄했다. 향도 훌륭하고 말이지.
퀴어 시간성에 관하여 VS 헌치백


올해의 문제작을 읽으려면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헌치백>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다면 그 힌트를 <퀴어 시간성에 관하여>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왔다.
우선 <헌치백>을 통해 종이책의 폭력성에 대해 처음 알았다. 종이책을 읽으려면 여러 개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책도 들어야 하고 넘겨야 하고 오랜시간 앉거나 서 있어야 하고... 대부분 비장애인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전자책의 훌륭함은 이렇게 발견된다. 오디오북도 말이다. 비장애인 위주로 생각하면 영영 모를 일이다.
<퀴어 시간성에 관하여>의 내용은, 전자책을 읽는 것이 당연히 더 나은 날이 온다는 것이 이 책의 거친 요약이다. 노령의 나이에 진입하게 된다면, 그때는 누구나 이전과 다른, 퀴어한 시간성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노년의(그리고 나이듦에 따라 수반되는 병듦) 섹슈얼리티를 탐구한다. 그것은 잘 말해지지 않는다. 비장애인과 다르게 잘 이야기 되지 않고, 그래서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느껴지게 만드는 장애인의 섹슈얼리티처럼 말이다.
스타벅스 일기 VS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연재 당시 이상의 삽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흥미로운 만남이다. 이 소설은 줄거리보다, 소설이 되어가는 방식이 흥미롭고, 그 형태를 따라 놓인 삽화가 새롭다. 그동안 글만 읽어왔다니 조금 아쉬운 노릇.
소설의 줄거리와 이야기로 무엇을 얻는다기보다, 당시 생활과 생각의 다름, 혹은 비슷함을 느끼는 것에 재미가 있다. 다른 리듬을 주는 문장을 읽는 재미도 찾을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다방과 카페의 공간은 현재와 반대인 것처럼 나온다. 오늘날 카페는 누구나 일상적으로 가는 공간이지만, 1930년대의 카페는 여급들이 있는 곳으로 나온다. 당시에는 다방이 오늘날 카페에 비슷한 장소였던 것 같다.
"생각이 피로한 그는 마땅히 다방에 들러 한 잔의 홍차를 즐겨야 할 것이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중에서
다방(카페)에 들리는 이유는 그나 우리나 비슷하다.
이들이 역전이 시간이 지나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90년 전 경성에서 구보가 사람들을 관찰하고 친구를 기다리는 이야기를 구성한 장소도 다방으로 나온다. 오늘날 카페에서 수많은 작업과 분투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서로의 자리에서 나만 알게 일어나는지, 하지만 다른이에게 보여지면서 많은 일을 수행한다. 여가를 보내거나, 친목을 도모하거나 고독을 즐기거나 글을 쓰거나. 그리고 카페에서 부러 들으려 하지 않아도 들리는 이야기는 다른 관계와 사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가 이 예전의 소설에 나오기도 하고. 집이 아닌 공간에서 타인과 마주하지 않고 식사가 아닌 차를 마시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탄생하게 하는지.
<스타벅스 일기>는 제목만 들어도 재미있다. 스타벅스에서 다른 사람들은, 작가는, 번역가는 무엇을 쓸까? 무엇을 생각할까? 일종의 관음, 참고, 덧대봄, 나를 돌아봄을 함께할 수 있는 에세이처럼 보인다.
참, 이벤트가 있다.
#소설가구보씨의일일 #프릳츠 #구보씨의커피리뷰
https://www.aladin.co.kr/events/wevent.aspx?EventId=260283&start=p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