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달과 6펜스 ㅣ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38
서머셋 몸 지음, 송무 옮김 / 민음사 / 2000년 6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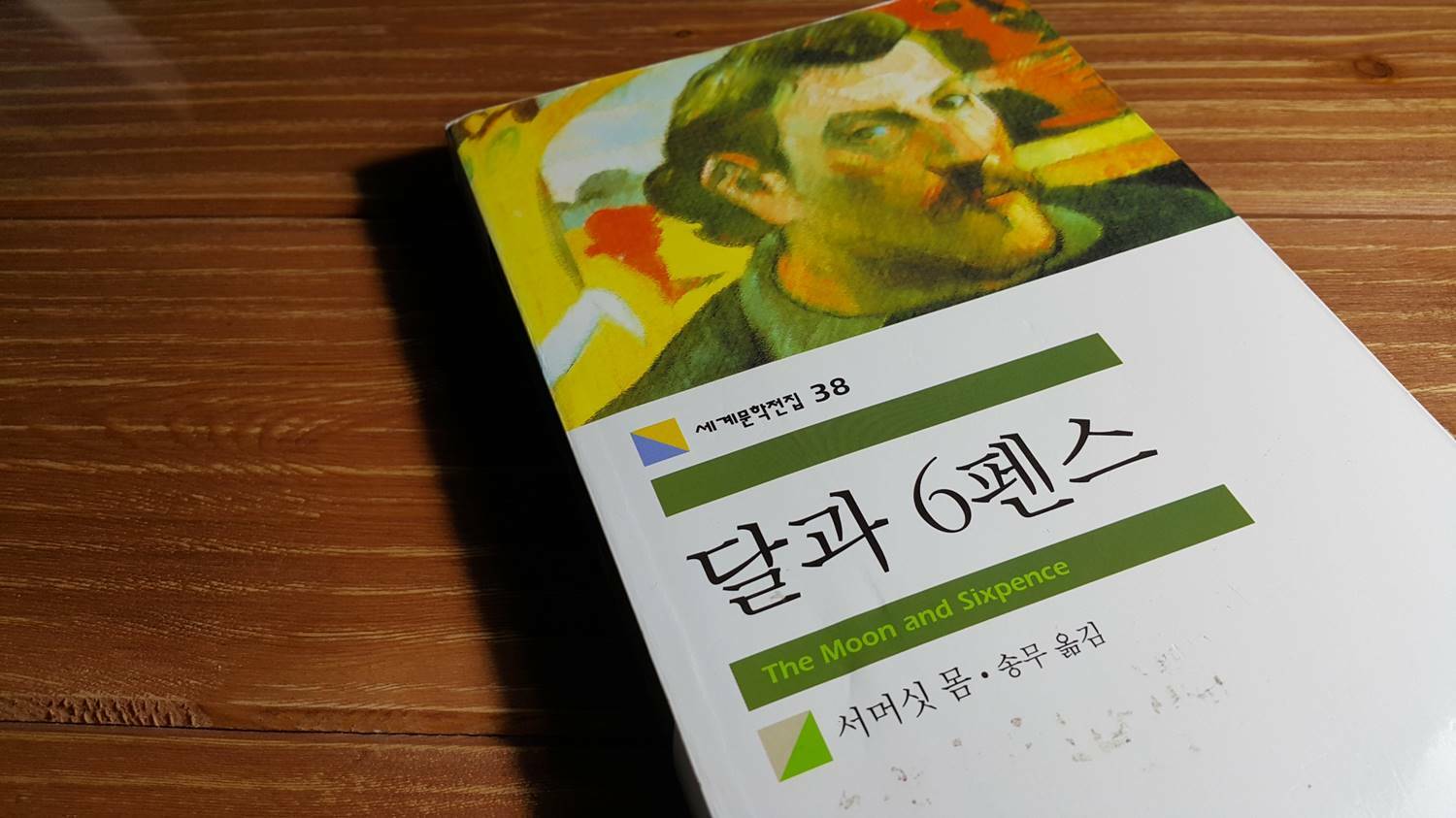
‘달과 6펜스’, 둘 다 둥글며 둘 다 은은한 색으로 빛난다. 난 생각했다. 책 속에는 달과 6펜스에 대한 비교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언급조차 없다. 하지만 왜 이 책의 제목은 ‘달과 6펜스’인지 참으로 궁금했었다. 그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은 책의 뒤에 있는 작품해설에 나온다.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대표하는 6펜스, 속세를 벗어나서 자신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대표하는 달. 둘 다 인간의 삶이라는 젊에서 참으로 닮아있지만, 다를 수밖에 없다. 6펜스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는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이들에게 이 6펜스는 아무런 존재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 그저 눈앞에서 자신을 비춰주고 있는 은은한 달빛 한 줌에 위안을 얻고, 그 동안 살아온 삶을 다시 되새겨볼 뿐이다. 우리 삶의 본질은 과정에 있는 것인가, 영원한 평형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죽음에 있는 것인가? 이것도 우매한 질문일 수도, 과정과 결과는 너무나도 인과적인 관계가 있으니깐. 이렇듯 ‘달과 6펜스’는 닮은 듯 다르고, 다르지만 같을 수밖에 없다.
내가 참으로 좋아하는 고흐와 함께 살았던 고갱. 나는 고흐의 삶은 ‘영혼의 편지’를 통해서 들여다 볼 수 있었지만, 딱히 고갱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었다. 그 찰나 이 책을 접하게 되었고, 주인공 스트릭랜드가 고갱의 재해석 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이 함께 했을 그 순간, Yellow House를 다시 떠올려 볼 수밖에 없다. 미술가들의 협동조합을 꿈꿨던 고흐, 하지만 이 책 속 스트릭랜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예술가들은 그저 자신을 혼자 놔두기만을 바랄 뿐이다.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놔두기만을. 참으로 자유로운 영혼들이기에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짊어져야 할 책임감을 부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고흐는 자신의 귓불을 자르며, 고갱은 Yellow House를 떠나고 만다. 하지만 이 둘이 함께 했던 순간이 둘 다 불멸의 미술가로서 재탄생 하는 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겠다. 고흐는 ‘별 헤는 밤’으로, 고갱은 ‘타히티의 여인들’로. 둘 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았고, 그 삶을 자신의 화풍으로 풀어내었고, 죽은 후 더욱더 위대해졌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느님의 연자매는 느리게 돌지만 가루는 아주 곱지요」새로운 장르의 탄생을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켜냈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누구의 시선에도 개의치 않고 자기의 소신대로, ‘자신의 삶을 예술로 승화’시켜버린 삶을 살다간 사나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빠른 성공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묵묵히 자기 속도로 꾸준히 달려간 사람의 인생은 어느 누구라도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너무나도 곱디고운 가루들의 집합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트릭랜드가 살아가면서 주인공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삶을 남들의 시선에 하나둘씩 맞추기 시작했다면 타히티 섬에서 작업한 작품이 천지창조를 넘어선 그 무언가로 다가올 수 있었을까?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주인공이 스트릭랜드의 삶을 비판하지만, 그저 스트릭랜드는 콧방귀를 뀔 뿐이다.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면서 스트릭랜드를 비판하지만 그것은 그저 사회적 통념이 빚어낸 도덕일 뿐. 스트릭랜드는 도덕 위에 군림해야만 하는 자신만의 윤리를 따라서 살아갔으며, 그 윤리대로 평생 살다죽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후에는 그를 잘 모르던 사람들마저도 그 삶을 존경하기에 이른다. 이 어찌 삶의 모순이자 역설이 아니겠는가? 우린 도덕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고, 사회 규칙과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때로는 무시하고 짓밟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우러르고 칭송하고 있다. 결국 도덕이라는 것은 지배층이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창조해 낸 것일 뿐인 것이다.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을 가진 개인이 탄생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였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은 삶을 살다간 이들은 이렇게 무언가를 창조해냄에 이르게 되며, 사회라는 유기체의 일부로서 그 안에서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흐릿한 그림자가 아닌 그림자를 만들어 내는 찬란한 태양처럼 빛나게 되는 것이다.
왜 우리는 나중을 위해서 지금의 삶을 희생시키는 것일까? 지혜로운 이들은 점잖게 자기들의 길을 간다. 하지만 참으로 점잖게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언제나 딴죽을 걸기 시작하며 자기의 영역 안으로 그들을 끌어들이려고만 한다.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자신의 영역 안에 많은 이들을 끌어 들임으로서 안정감을 꾀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서로의 길이 있을 뿐인데 말이다. 서로가 자기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사회일 것이다. 너무나 평온하고 조용하며 초연한 곳에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다. 안정적인 것은 더 이상 안정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나는 인문고전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창조한 이들을 만날 때 마다 내 가슴 속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는 것을 그저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 나는 내 삶을 창조할 것이며, 사회라는 유기체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않을 것이다. 무엇인가에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자신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한 몸으로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한다.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서로의 삶으로 존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래야 우리라는 개념은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여야만, 우리 아래에서 조금씩 약해진 개인도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고 버티며 버텨주며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예술가의 혼을 나는 끊임없이 갈고 닦아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