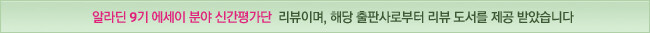[다방기행문]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다방기행문]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다방기행문 - 세상 끝에서 마주친 아주 사적인 기억들
유성용 지음 / 책읽는수요일 / 2011년 6월
평점 :

품절

사라지는 것들이 그리울 때가 있다. 아련히 그리워만 하다가 어느 순간 가슴에 사무칠 때가 있기도 하다.
단지 사라진다는 이유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기에 감정이 증폭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것에는 내가 기억해야 할 추억과 개인의 역사가 함께 담겨 있기에 더 아쉬움이 큰 연유다.
우리 여성들에게 익숙한 음악다방이라는 것이 80년대에는 유행했었다.
주로 대학가 앞에 위치해 있어 미팅장소로도 인기가 높은 곳이었지만, 그 음악다방 DJ를 남몰래 짝사랑하는 여학생 손님도 있 꽤나 매상을 올려주었던 다방. 다방에 들어서면 커피주문과 함께 쪽지에 좋아하는 음악을 빼곡히 적어 서빙하는 점원에게 주곤 이제나 저제나 음악이 들리기만을 기다리던 시간.
DJ는 때때로 적지도 않은 사연을 맘대로 들려주며 음악을 틀어주곤 했다. 프로 DJ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인근 대학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삼아 DJ를 했기 때문에 동시대의 놀이문화와 정서를 교감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 주었다.
여성들이 즐겨 찾던 음악다방, 혹은 커피숍과는 달리 '다방'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다지 고급스럽지 않은 촌스럽고 낡은 그 곳은 주로 남자들이나 시골 어르신들의 귀한 약속장소 쯤으로 활용되었다.
노란 계란이 곁들여진 쌍화차나 흔히 다방커피라고 명명되어진 달고 걸쭉한 커피를 파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여성들에게 이질적으로 다가오는 여자종업원이 있는 곳, 뜨네기들이나 호주머니 가벼운 사람들이 찾는 곳쯤으로 이미지화되어 있는 곳이 내가 알고 있는 다방이라는 곳이다.
내게도 기억나는 몇 몇 다방들이 있다. 아니, 그 다방들과 얽혀진 추억이 몇 개 떠오른다고 해야겠다.
고향터미널 앞 차부다방, 그 곳에서 나는 대학생이던 시절, 일찍 중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돈벌러 간 동창녀석에게서 시원한 오미자차를 얻어 마신 적이 있었다. 우연히 어느 여름날 주말에 터미널에서 마주친 우리는 반가운 마음에 가까이에 있는 다방을 찾았고, 이미 사회인이 되어버린 친구는 그럴싸하게 사내다운 자세로 폼을 재며 내게 오미자차를 권했다. 친구는 여름인데도 긴소매 양복을 갖춰입고 있었는데, 유행이 지난 폭넓은 넥타이가 내 눈에는 짠하게만 보였던 기억이 난다.
선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할 무렵, 먼 친척인 8촌오빠가 좋은 총각이 있다며 익산역 앞 다방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엄마편에 전하셨고,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진행된 그 약속을 어른들 말씀을 거역하지 못한 나는 그 다방을 찾게 되었는데, 2층에 자리한 다방은 입구부터 먼지가 눈에 띄였을 뿐 아니라, 주홍색 공중전화, 흰머리의 노인들 몇 분 만이 앉아 있는 실내 모습이 눈에 들어와 선 상대자에 대한 기대는 애시당초 접어버린 채 어서 시간만이 지나가길 기다렸던 기억도 난다.
당시에도 그다지 즐겁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정답게 추억되는 것은 단지 지난 일이어서일까?
그것보다는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인정어린 동창생의 마음과 8촌오라버니의 마음씀이 이제서야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스스럼없이 나에게 정을 권하는 사람이 이제는 그리 많지 않다는 자각도 함께 하면서 말이다.
저자의 이름 석자, 유성용은 처음에는 낯설었으나, 자꾸 발음해 보니 입이 붙길래, 가만 생각해 보니 서애 류성룡과 비슷한 이름이어서였다.
그러니까, 저자의 책은 이번<다방기행문>이 처음이었던 것이다.
온 몸으로 여행을 체화한 듯한 그의 글을 읽으면서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한 부러움이 살짝 들기도 했다.
잠시 저자에 대해서 알아 보니, 이미 에세이집을 여러 권 출판한, 그리고 나름 그 이름이 알려진 작가였다.
저자는 자신이 만든 '여행생활자'라는 말에 아주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고, 이 책 또한 2007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 28개월간 스쿠터를 타고 다녔던 전국 다방 기행을 담았다.
눈내리던 날의 향록다방, 점 봐주던 딸기다방, 호산의 미인다방, 춘양의 앵두다방, 영양의 향수다방,호수다방, 돌다방, 정다방, 약속다방, 은파다방, 강변다방, 희다방, 영다방,..그리고 전국에 세 곳밖에 없다는 맹물다방.
그가 찾고 들렀던 다방들은 우리가 언제고 한번은 들어봤음직한 익숙하고 친근한 이름들의 다방이다.
다방의 유래에서부터 역사, 간판의 글씨체, 그리고 다방에서 살아가는 이름모를 김양, 박양, 최양, 이양 들의 이야기들을 담담하나 정겹게 풀어놓고 있는 이 책은 다 읽고 나서도 묘한 여운이 있어 기억에 남는다. 허접한 , 그리고 이제는 쓰러져가다 못해 사라져가는 다방풍물기행이라고나 할까.
다방에 얽힌 삶들을 풀어놓은 이 책이 나에게는 그 어떤 예술의 삶을 풀어놓은 것 마냥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가장 짓기 쉬운 이름이라고 생각했던 다방이름들에 그 많은 의미와 뜻이 담긴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었다.
다방 레지들의 삶 또한 우리네와 다를 것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줄 알지 못했다.
나그네인 저자에게 팥죽, 옥수수, 국수를 건네는 손길들. 세상 천지 사람 발길 닿는 곳은 그 어디나 인정이 있다는 것, 다시 깨닫는다.
지금 40~50대 중년들에게는 살아온 삶을 추억하게 하는 <다방기행문>은 요즘 20~30대 청춘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이제는 배달커피를 전문으로 하기에 예전 모습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는 다방은 점차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기에 더 아쉽고 아름답게 기억되는 공간이다.
<다방기행문>이라는 책을 기획하고 써낸 작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