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최고의 화두는 '폭염'이다. 말복을 지나 8월 말이 다가와도 가을이 찾아오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일기예보에서는 연일 '폭염 특보'를 나타내는 빨간색을 보여주고 뉴스 속보에는 고온 현상으로 물고기와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기사들이 보여진다.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단 1분도 견디기 힘든 이 폭염 속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기후 위기'를 체감한다.

'폭염'우려에 그치지 않고 '폭염'으로 인한 죽음이 보편화되어갈 사회에 대한 경고장을 던지는 학자가 잇다. <폭염 살인>의 저자 기후 저널리스트 제프 구델이다. 그는 기후 최전선에서 기후 재난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폭염'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더위는 적극적인 힘, 철로를 휘게 한다거나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아챌 새도 없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힘이다.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도 섬뜩한데 예고 없이 죽일 수도 있다니 소름이 돋는다.
왜 그는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는 힘이라고 했을까?
저자는 폭염의 현장을 찾아 세계 여러곳을 방문한다. 빙하가 녹고 있는 남극은 물론 여러 농장들을 방문하며 농부들의 하소연을 듣는다. 한 때 옥수수를 심었던 곳이 더위로 인해 알로에 농장으로 바뀌고 이제 알로에마저 포기해야 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햇다 . 눙부들은 제프 구델에게 말합니다
"더는 심을 작물이 없다."
매년 최고 온도를 찍고 있는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더위에 강한 품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농부들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가르쳐준다.
"하지만 결국 물리학과 생물학의 법칙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 무엇이든 죽지요. 그게 이 세상의 순리예요."
아무리 인간의 과학 기술이 발달해도 결국 자연을 거슬릴 수 없다는 사실.
무엇이든 죽게 된다는 이 사실이 바로 『폭염 살인』 의 핵심 메세지이다.
『폭염 살인』 은 과학자답게 여러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준다.
그런데 문득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다.
우리가 혹시 이런 비극에 이미 전염된 게 아닐까?
둥둥 떠있는 얼음조각에서 갈 길을 잃은 북극곰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탄식했다. 안타까움과 함께 각성의 목소리가 함께 '북극곰'은 환경보호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어떤가? 위기에 처한 북극곰을 봐도 그다지 슬퍼하지 않지 않는다. 이제 북극곰의 비극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닐까?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단어가 바뀌어도 우리들의 행동은 바뀌지 않는다. 『폭염 살인』과 같은 과학적 진실은 우리에게 현실을 안겨주는 동시에 이미 늦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염세론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나는 대니얼 셰럴의 『뜨거운 미래에 보내는 편지』에 주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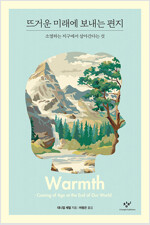
대니얼 셰럴은 1990년생 기후변화 활동가이다. 미국 환경단체 NY 리뉴스 연합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MZ세대 기후활동가인 그는 과연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걸까? .
바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자기 아이에게이다.
그런데 왜 결혼도 하지 않은 대니얼 셰럴은 아이에게 편지를 쓸까?
이 편지의 목적은 '사람들을 실재하는 존재로 만들기' 이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사람들,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앞으로 결코 존재할 일이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우리가 만난 사람들, 만나지 못한 사람들 또는 아마 만날 일이 없을 사람들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다.
기후 위기를 눈감는 사람들, 경제 운운하며 아직 괜찮다고 말하는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행위는 실재하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기후 위기의 주범임을 대니얼 셰럴은 명백히 밝힌다. .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장 큰 주범인 미국이 아프리카의 기후난민의 존재를 부정한다. 허리케인 피해자 숫자를 통계로 두리뭉실 최소화하며 숫자를 지운다.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그들을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이 빈번하게 저지르는 행위이다.
기후위기를 위해 싸우는 저자는 지구의 폭염을 '그 문제'라고 말합니다.
갈수록 커져가는 이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려는 움직임.
그리고 이 문제를 두리뭉실하게 축소화시키려는 정치권에 대해 수시로 좌절합니다. 때로는 주지사 사무실로 가서 언론의 관심을 끌고 행진을 하기도 하며 연방정부 국회의원을 만나 법안에 부쳐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은 온 몸을 다해 '그 문제'와 싸우는데 대다수 시민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현실에 지치기도 합니다.
천천히 기후 변화에 대처해가야 한다고 자꾸만 느슨해지는 정치가들을 향해 대니얼 셰럴은 말합니다.
당신들도 연구 결과를 읽었잖아요.
근데 왜 절박해하지 않아요? 왜 위기감을 못 느껴요?
절벽을 피할 때는 핸들을 40도 각도로 꺾는 걸로는 충분치 않다고요.
180도 꺾어야지.
이 현실들을 보다 보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답이 없는 것일까 깊은 회의감에 잠깁니다. 그렇지만 대니얼 셰럴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린 괜찮아"나 "우린 망했어"는 답이 아니야.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직시하지 않기 위해 세운 벽일 뿐.
언젠가는 '그 문제'와 너 나름의 관계를 정립해야 하고, 결국에는 너도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고스란히 느껴야 될거야.
『뜨거운 미래에 보내는 편지』를 읽으면서 이제 기후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서사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과학적 진실은 우리에게 진실을 들려주지만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한다. 부정적인 감정이 압도적이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와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고 '이젠 끝났다'고 포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대니얼 셰럴처럼 우리가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는 걸 끝까지 해 나가는 것. 폭염의 비극 속에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기보다 진실을 직면하되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새로운 서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그 '새로운 서사'를 최진영 작가의 소설집 <쓰게 될 것>에서 본다.
<썸머의 마술과학>처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하며 나아가는 것.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써야 할 '기후위기'의 서사라고 생각한다.
올해 여름의 '폭염'이 지구 종말의 상징이 아닌 우리가 새롭게 써나가야 할 서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인간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보다 희망일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