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읽다가 책마을 사람들에 김원영 변호사이자 무용수의 인터뷰를 보았다.
김원영 변호사가 누군가?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자 변호사로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및 김초엽 소설가와 함께 <사이보그가 되다>를 쓴 저자가 아니였던가?
그런데 그 때만 해도 변호사가 본업이었는데 신문 지면에는 무용수라고 그를 소개한다.
휠체어로 생활하는 김원영 무용수가 춤을 추기 시작하며 가지는 고민과 경험을 함께 풀어낸 책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 소개가 되어 있다.

마침 서울 국제도서전에서 그의 책을 구매해서 반가운 마음에 기사를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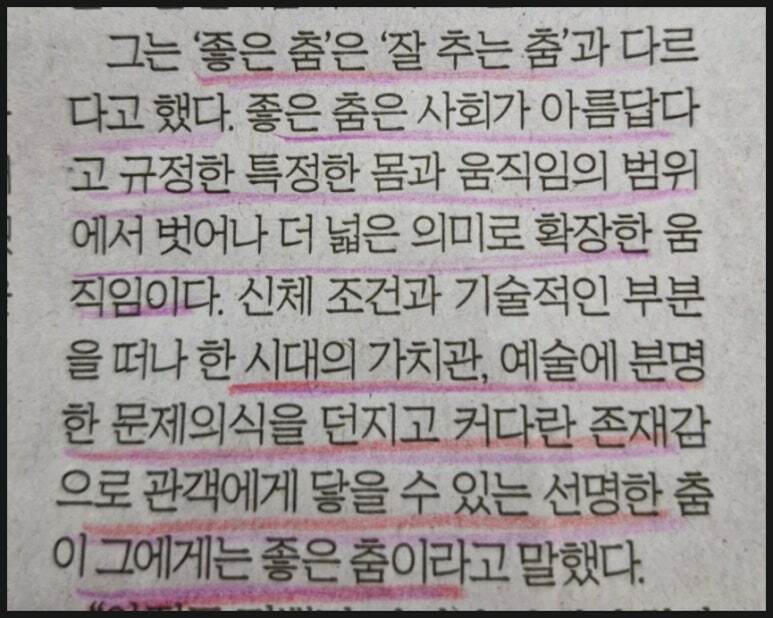
장애인으로서 무용을 시작하면서 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한다.
"좋은 춤"
"잘 추는 춤"
이 두가지가 비슷하지 않을까?
잘 추는 춤이 좋은 춤이 아닐까?
하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한다.
잘 추는 춤은 말 그대로 잘 추는 춤이다. 아름답다고 규정한 특정한 몸, 기술이 들어간 춤이 잘 추는 춤일 것이다.
좋은 춤은 시대의 가치관, 분명한 문제의식을 던지고 관객에게 닿을 수 있는 선명한 춤이라고 말한다.
가치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인터뷰를 보면서 나는 며칠 전에 읽은 황석희 번역가의 책 『번역 : 황석희』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황석희 번역가는 책에서 '좋은 번역' 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의 의미를 털어놓는다.
나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은 번역'이란 어색함이 없는 문장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옮겨 쓴 문장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글.
마치 원작가가 그대로 썼다고 느껴질만큼 번역자느 뒤에서 꽁꽁 숨겨져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황석희 번역가는 의외의 반론을 제기한다.
진정 훌륭한 번역은
번역문에서 인간적인 흠결이 보일 정도로
번역자의 인성이 느껴져야 한다는 뜻이다.
원문을 바꾸라는 게 아니다.
다만 기계적인 번역 떄문에 번역가 자체의 인성과 특성마저 묻혀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다.
오히려 번역가의 '연륜'과 '인성'을 느낄 수 있어야 좋은 번역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잘 번역한 글은 될 수 있지만 좋은 번역은 될 수 없다는 점.
잘 하는 것과 좋은 것.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
잘 하는 춤과 번역만 집중하다보면 좋은 춤과 번역을 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좋은 춤을 추려고 하고 좋은 번역을 하다 보면 잘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 아닐까?
하지만 황석희 번역가와 김원영 무용수가 말하는 글을 읽으며 나는 '잘 쓰는' 글이 아닌 '좋은 글'을 써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
좋은 글이란 김원영 무용수의 말대로 '나의 가치관과 생각과 문제의식으로 읽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글'일 것이다.
좋은 글이란 황석희 번역가의 말대로 '나의 연륜과 인성이 배어 있는 글'일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잘 쓰는 글이 아닌 좋은 글을 쓰는 작가가 되는 걸 목표로 한다.
잘 쓰는 글보다 좋은 글을 많이 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