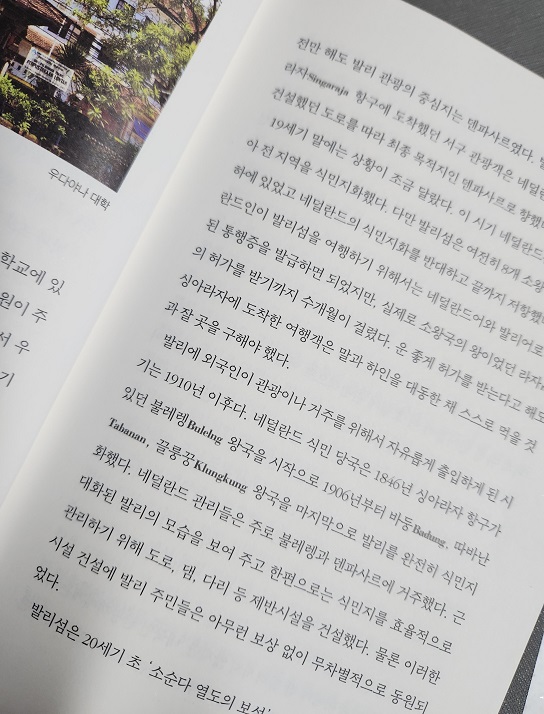인도네시아 사회와 문화 연구자의 “발리” 현지 조사보고서
문화인류학자 정정훈, 그는 문화라는 마법의 단어를 품고 인도네시아의 사회와 문화를 연구한다. 적도의 태양이 길러낸 신비로운 공동체 마을 뉴꾸닝 사람들과 함께 오달란(마을 의례), 섣달 그믐날의 네빠데이, 장례식과 성인식, 관광업과 그들의 일상 속 깊이 들어가 관찰한 기록이 바로 이 책<신들의 섬을 걷는 문화인류학자>이며, 부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답하는 발리에서의 여정이라 붙였다.
관광인류학과 문화정책 탐구를 위한 발리 여정은 관광 환경에서 지역 주민의 문화적 행위는 어떻게 표현되며, 관광객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주민 집단은 관광발전에 어떻게 대처하며 기존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적응시키는가?, 문화의 상품화가 기존 문화적 가치와 전통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등의 과제수행을 위한 것이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 같은 화두는 꽤 의미 있다. 관광자원 상품화, 즉 문화의 상품화가 기존 문화의 가치와 전통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는 주제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책 구성은 19꼭지다. 지은이는 스쿠터(작은 모터사이클)를 타고 발리의 밀림을 누비면서 여는 첫 번째 이야기 ‘완벽한 마을을 찾아 나서다’를 비롯하여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진짜 발리의 탄생을 거쳐 사라지는 것들 사이에서 다시 떠오르는 것, 네삐데이, 오달란, 열아홉 번째 이야기 ‘보름 동안 이어지는 장례식과 성인식’ 등이 담겨있다.
문화인류학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풀기 위한 답을 찾아 용맹정진의 길이다. 동남아시아의 인구 대국, 수만 개 섬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2억 2,400명에 달하는 무슬림은 인구의 87퍼센트 정도다. 이 보고의 무대 발리는 400만의 힌두교 신자가, 인도의 힌두교와는 사뭇 다르다. 조상과 정령 숭배 믿음이 강한 곳, 마을과 일터에 사원 뿌라가 있다. 사원에서 치르는 의식을 통해 사회적 위치와 관계망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