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학의 역사 - 울고 웃고, 상상하고 공감하다
존 서덜랜드 지음, 강경이 옮김 / 소소의책 / 2023년 8월
평점 :




문학의 역사
도입부부터 만만치 않다. 지은이 존 서덜랜드는 칼럼니스트, 작가, 문학자라서 그런지, 꽤 재미있게 “문학”을 설명하는데, 마치 청소년 대상 도서처럼 알기 쉽게 핵심을 짚어가면서 엮은 책이다. <풍성한 삶을 위한 문학의 역사>(에코리브르, 2016)에서 문학을 만드는 이와 문학에 참여하는 이가 함께함으로써 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문학이란 무엇인가?, 어려운 질문이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문학의 작은 역사”지만 문학은 작지 않다. 지은이는 가장 만족스러운 대답은 바로 문학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우리 삶에서 문학은 아주 중요하다고 막연하게 느끼고, 소비한다고 하지만, 왜 중요한지는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우리는 같은 책을 읽어도 읽었던 시기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짐을 느낄 것이다. 나이가 들고 세상 경험과 보는 눈이 달라지기도 하면서 같은 책인데 새로운 뭔가가 샘솟는다. 이게 뭘까, 이전에는 왜 이런 것을 주목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마도 이런 점 때문에 문학이 위대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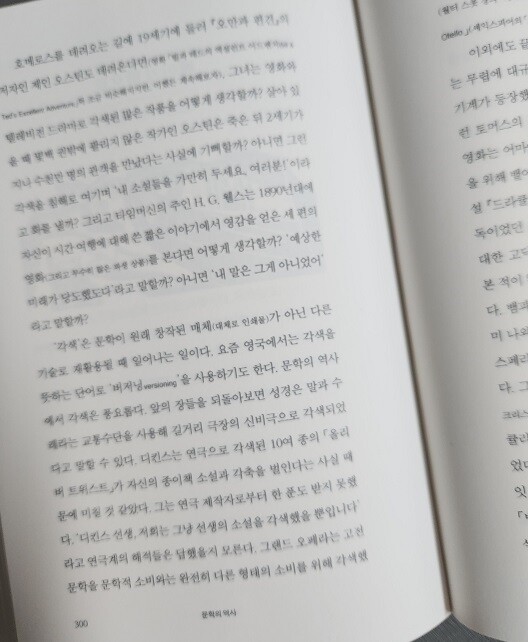
신화, 이른바 구술 문학 혹은 구비문학이다. 신화하면 역사 이전의 것으로 허무맹랑하다는 생각을 한다(이 역시 고정관념). 신화는 문학(문자)을 쓰지 않고 말하는 사회에서 기원한다. 신화에는 어떤 진실을 담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자 그렇다면, 문학은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을까? 이런 의문은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문학의 장르를 따라,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수수께끼”처럼 다가온다.
이 책은 전설적인 시작이라 명명된 “신화”에서 국가를 위한 문학이란 성격을 가진 “서사시” 지은이는 유명한 우루크의 왕 “길가메시”에서 중세 길거리 연극인 신비극을 거쳐 근대소설과 전자책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수용에서 소통까지의 역사를 설명한다.
인간의 조건인 “비극” 서사시라는 정제되지 않은 재료를 형식으로 빚어내는 문학의 진화과정을 통해 “비극”을 만들어 낸다. “오이디푸스 왕” 같은 연극이 비극효과를 내는지, 이미 예견된 일처럼 청중은 느끼게 된다. 필연적이고 개연적으로. 인간이 쌓은 지식이 엄청나게 팽창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인간의 삶과 조건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것이기에,
서덜랜드는 문학이란 무엇인가?, 소설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나?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셰익스피어를 대시인으로, 책 중의 책으로 킹 제임스 성경을 들기도 한다. 찰스디킨스와 브론테 자매의 문학 속의 삶을, 이불 속에서, 아이와 문학, 머리맡에서 들려주던 옛날이야기와 동화에 아이는 뭘 생각하는가, 나니아 연대기처럼 상상을, 시대별 중요 작품을 소개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나름의 해석이 곁들어져 흥미를 더해준다. 곳곳에 장치된 덫, 문학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문학을 읽는가?, 소설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라는 문제 제기에 맞닥뜨리면, 순간 고민을 해보게 된다. 진짜, 왜 독서중독증처럼 책을 읽는지, 소설의 사회적 효과는 있는 것인지, 있다. 황석영의 베트남 전쟁을 다룬 <무기의 그늘>(창비, 2006)은 분명, 베트남전의 성격과 파월한국군의 모습이, 그리고 그들의 고뇌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었기에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문학을 읽는가? 라는 물음에는 여전히 답이 떠오르지 않지만, 그래서 문학작품을 읽고 또 읽는 게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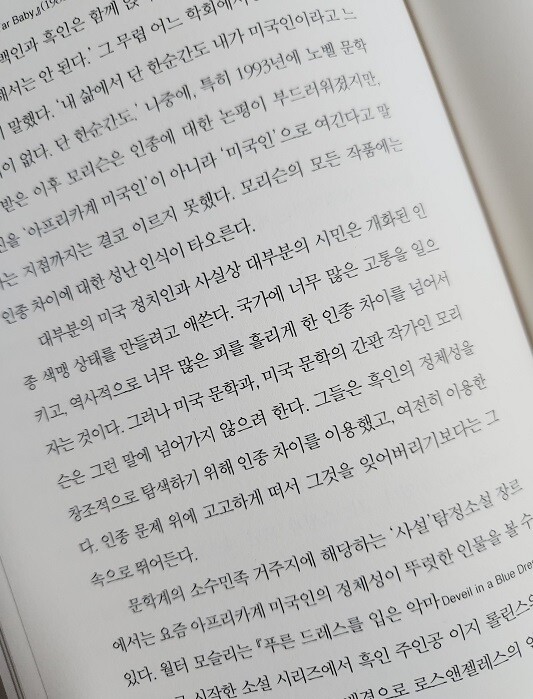
서덜랜드는 대부분의 미국 정치인과 사실상 대부분의 시민은 개화된 인종 색맹상태를 만들려고 애쓴다(336쪽). 국가에 너무 많은 고통을 일으키고 역사적으로 너무 많은 피를 흘리게 한 인종 차이를 넘어서자는 것인데, 이런 술수가 넘어가지 않았던 미국 문학과 미국 문학의 간판 작가 모리슨은 흑인의 정체성을 창조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인종차이(차별)을 이용했고, 여전히 이용한다. 문학은 정치적이고, 선동적이다. 이 또한 문학의 또 다른 힘이다.
이 책은 진지한 책 읽기를 해보고 싶은 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희극과 비극의 탄생 배경, 문학은 인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등등, 그저 그러리라 생각했던 것들이 새삼스레, 오래된 새로운 물음인 듯 그렇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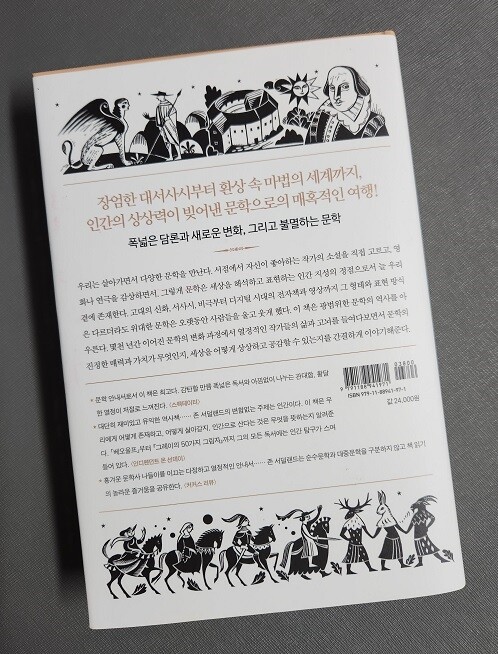
오노레 드 발자크 등이 쓴 “인간 생리학” 시리즈가 떠오른다. 19세기 초 당대 유행이었던 “~생리학”이라는 장르, 풍자인데, 꽤 흥미롭다. 발자크의 <공무원 생리학>(페이퍼로드,2020), <기자생리학>(페이퍼로드,2021) 등은 마치 지금 현재 사회의 실상을 말하듯, 아마도 이것이 문학의 힘이 아닐까 싶다.
서덜랜드의 이 책<문학의 역사>을 통해서 그리스에서 현대까지 문학작품,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무엇인가, 작품이 쓰인 시대의 사회와 경제, 그리고 역사, 철학, 패러다임까지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 문학의 역사는 꽤 도움이 된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