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교육과 좋은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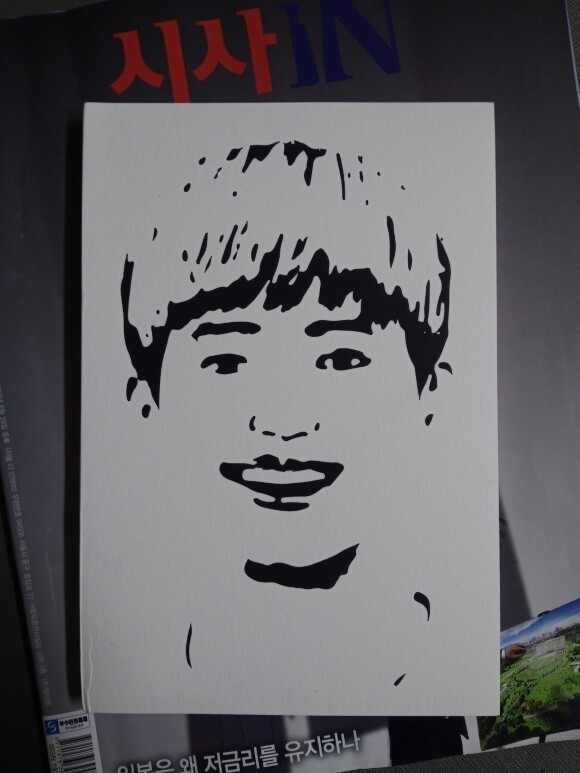
지은이 김응수는 영화감독이다. 이 글은 영화제작을 위한 한 청년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픽션이다. 물론 논픽션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무섭도록 제대로 짚어내고 있다.
이 글 속 주인공 현규는 외국 근무가 많은 상사맨이거나 공사의 외국거점 등 이른바 자녀에게 귀국자 특례가 있는 아버지의 직업환경으로 초, 중, 고를 어느 한 곳에서 졸업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기에 오랫동안 함께할 친구도 없을 듯, 일본에서 생활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길었던 듯, 수학 과목은 수준 차이가 확연하다. 재학 학년보다 1~2년 차이가…. 같은 입시지옥으로 유명한 일본보다 한 단계 위 정도이니, 우리 사회의 대학을 향한 열기는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아무튼, 한국 대학입시의 벽을 귀국 자녀 특례(부모 기회)기회를 쓰지 않고는 넘을 수 없으므로 설사 이 카드를 썼다손 치더라도 입학에 자신이 없어, 재수…. 결국 일본의 지방대학을 나와 군대를 가야 할 처지였기에 한국대학의 대학원에 진학…. 군대를 다녀오고, 취직도 해야 하는 처지의 청년 이른바 “순진무구” 한국사회의 이중적 언어생활에 곤란을 겪는데….
나쁜 교육과 좋은 교육은 한 끗 차이?
교육내용이 좋고 나쁨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누군가에 의해 그것이 좋은 것으로 보증받으면 좋은 교육이고 그렇지 못하면 나쁜 교육이다. 이른바 생활의 교과서, 그 생활은 사회에서 적당히 눈치도 보고, 누군가의 입맛에 맞추고, 상대의 간접화법을 충분히 이해(눈치채고)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사회 생활하는데 피곤함이 따르는 나쁜 교육이 되는 것인데, 글 제목처럼 나쁜 교육은 그저 누군가가 나쁜 교육이라고 한 것들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순진무구한 청년을 약삭빠르고 내심을 알 수 없는 이른바 애늙은이로 만든 교육
씁쓸하지만 이를 뭐라 해야 할까, 이리 착해빠져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까, 눈감으면 코도 베가는 세상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 그렇다. 몇 세대에 걸쳐….~라떼 버전에 등장하는 단골 문구다.
애늙은이란 눈치코치가 백 단이 되어야 한국 사회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데 씁쓸하다. 현규의 변화, 이제 거절하는 법도 어색하지만 제법이다. 인사치레로 건네는 말, 늦게 배운 도둑이 밤샐 줄 모른다는 말처럼….
순진무구하기에 마치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극단적 변화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칼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모두 뛰어난 숙수(조리사)가 되는 게 아니듯, 이제부터 칼 다루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할 과제가 남았는데….
학습중심 사회에서 인성이니 품성이니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 남겨진 유산으로 사회를 향한 자성과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메시지가 담긴 이글은 어쩌면 김응수 감독이 한 청년과 했던 인터뷰가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한다. "한국인으로 진짜 한국인으로 만들어 다오" 라는 친구의 부탁으로 시작했던 현규와의 만남, 과연 현규를 한국인 다운 한국인으로 만들기나 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괴물을 만들어버린 것인가, 그냥 그대로 순진무구 자체로 남겨두는 것을 어땠을까, 씁쓸한 여운...
김 감독은 소설처럼, 르포르타주처럼, 사회비평처럼 쓰기보다는 누구나 편하게 술술 읽을 수 있는 글을 썼다고 적고 있지만, 실은 이렇게 사실적으로 써야만 하는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일상언어로, 우리는 무엇에 속고 있는지를….
정체성은 없다.
나는 이미 나로서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가 정해놓은 질서 안에서 잘 적응하면 좋은 교육이요, 그렇지 못하면 나쁜 교육이란 말, 꽤 의미심장하다.
이글에서 눈에 띄는 <정체성은 없다>라는 대목은 새로운 실재론을 주창한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마르쿠스 가브리엘 vs>(사유와 공감, 2022)에서 말하는 타자성과 통하는 바가 있다. 인간은 다른 인간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가야 하나라는 담론, 인간은 타자와 함께 또 타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종인지도 모른다. 타자성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공유하는 하나의 특징이다. 타자성은 우리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드는 동시에 같은 인간으로 한데 묶어 준다는 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즉, 나는 이전 시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을 때의 ‘나’와는 다른 인간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정체성이란 전통적 사고방식은 여전하다. 그 사고방식에 따르는 사람들은 인간들 사이에서 여성, 남성, 트랜스젠더, 아시아인, 유럽인의 정체성의 패턴을 찾아내려 한다. 그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성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 정체성은 인간의 출발점이 아니다. 인간은 인간들 사이에 특정한 정체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서 다른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아무런 인식 없이 그저 다른 인간끼리 관계를 시작할 뿐이다.
인간 전체에 공통되는 형상-어떤 사물을 사물로 만드는 성질-은 존재하고 그 형상이란 차이를 말한다. 전통철학은 이런 사고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가브리엘의 주장이다. 정체성을 강조하게 되면, 개인이건 사회이건 인종, 피부, 문화 배경에 따라서 무의식적인 편견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어, 차이를 강조하고 분열을….
<나쁜 교육>을 읽는 동안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던 정체성이라는 허상, 타자성이란 생소한 개념을…. 곱씹어본다..
<출판사에서 보내 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