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백년 동안의 고독 - 1982년 노벨문학상 수상작 ㅣ 문학사상 세계문학 6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지음, 안정효 옮김, 김욱동 해설 / 문학사상사 / 2005년 7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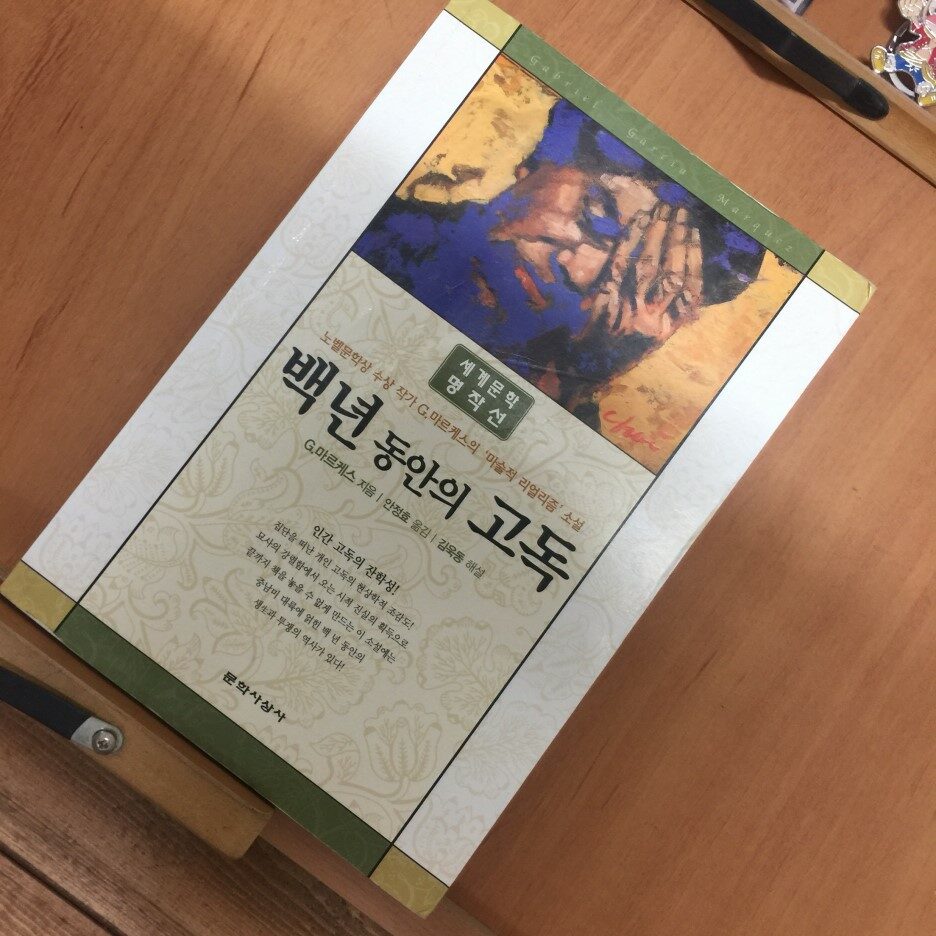
부끄러운 이야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나 악행을 저지른 건 아닙니다.
다만 '읽는 자'가 되어서 여전히 '읽는 데' 의미를 두고 덮고만 책을 한 권 더 늘리고 말았다는 게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가 그랬고, 모옌 <열세 걸음>도 그랬습니다. 더 열심히 읽고, 깨우쳐 가는 걸 반성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런 다짐은 앞으로의 일이기에, 지금부터 적는 건 그저 <백 년 동안의 고독>을 '읽어는 봤다'하는 기록에 불과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록일 뿐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신화, 고대로부터 인간은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 도전을 괘씸하게 여긴 신이 저주를 내리거나, 파멸시킨 이야기가 세계 곳곳에 남아있죠.
한두 가지만 떠올려 보면, 신의 영역에 도달하고자 쌓아나간 바벨탑이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고, 이후 언어가 달라져 인간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반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먼저 떠오릅니다.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는 아폴론의 구애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예언 능력을 요구하고는 예언 능력만 받고 구애를 거절해 그 누구도 카산드라의 예언을 믿지 않는 저주를 받게 되죠.
이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다가, 누군가에 의해 양피지 등에 기록되어 현재까지 남아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록, 문학이 그렇지만 현재에 의미가 없다면,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해도 오래 전해지고 남겨질 수 없습니다. 그 기록이 오래된 문자로 되어 있다거나 난해하다면 더욱더 간단히 명맥이 끊어져 버리겠죠.
옛날이야기를 하고, 그게 전해지느니 끊어지느니 하는 이야기를 보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 년 동안의 고독>이 그 옛날이야기들처럼, 오래되었고 난해하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오랫동안 전해지며 읽힐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요.
<백 년 동안의 고독>은 부엔디아 가문의 6대, 100년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부인 우르슬라 이구아란이 '마콘도'라는 지역에 정착하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책 표지에는 '마술적 리얼리즘' 소설이라는 문구가 박혀있는데, 리얼리즘은 잘 모르겠지만 '마술적'이라는 데는 확실히 공감합니다. 하늘을 나는 양탄자가 등장하고, 죽었던 자가 살아 돌아오며, 죽은 후에 환영으로 남아 특정한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하고, 오이디푸스의 신탁처럼 결코 빗나가지 않을 '돼지꼬리 달린 아이가 태어난다'는 예언이 멜키아데스의 양피지에 적혀 있기도 합니다.
부엔디아 가문이 처음부터 위태로웠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번영하고 번성하기를 계속하면서 예언을 잊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부엔디아 가문에 종종 태어나는 '고독한 존재'들의 기구한 운명은 이야기가 결코 좋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예감을 하게 합니다.
줄거리를 더 적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엔디아 가문 100년의 이야기이고,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죽음을 맞으며, 부엔디아 가문이 일으킨 도시 마콘도는 처음에는 집시가, 다음에는 군인이, 나중에는 미국인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저마다 마콘도와 부엔디아 가문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발달한 문명과, 전쟁을 몰고 오는 게 그들이었으니까요. 부엔디아 가문은 외부인들과 새로운 문명, 전쟁과 재해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저항합니다. 이 저항이 끝나는 날, 부엔디아 가문의 이야기도 끝이 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명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어서 더 잘 설명드릴 수가 없군요.
멕시코나 콜롬비아, 남미 지역의 역사에 밝은 분들이라면 <백 년 동안의 고독>을 조금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 다툼과 부정부패, 전쟁과 학살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 분명 모티브가 되는 사건이 있을 테고, 아는 만큼 더 잘 읽힐 테니 말입니다.
<백 년 동안의 고독> 책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잠깐 한탄을 늘어놓아야겠습니다.
지난 설 연휴 때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차례를 지내고, 조카들과 놀고 하느라 거의 읽지 못하고 들고 왔다 갔다만 했죠. 이후로도 거의 매일 가방에 가지고 다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주욱 읽히지 않더군요. 일주일이 가고, 이주일이 지났습니다. 삼 주째가 되자 책 모서리가 조금씩 해지더군요. 맙소사!
문학사상사, <백 년 동안의 고독> 표지에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묘사의 강렬함에서 오는 시적 진실의 획득으로 끝까지 책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이 소설에는"
'묘사의 강렬함'에는 얼마간 동의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여러 번 책을 놓아버린 저로서는 왜 '책을 놓을 수 없게'된다고 적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백 년 동안의 고독>에서 그나마 느낀 건 한 가지입니다.
"'고독'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멸시키는가!"하는 걸 실감했던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 역시 '고독'이라고 할 수 있겠더군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오래전에는 일본인을 '왜놈'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속설인지 정설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왜놈'이 된 이유가 그들이 작고, 왜소해서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작고 왜소한 이유는 근친상간에 있다는 이야기도요.
<백 년 동안의 고독>에서 '돼지꼬리 달린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이유는 '근친상간'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거의 모든 동물이 근친상간을 피하는 이유는 열성 인자의 발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근친상간이 부엔디아 가문 멸망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근친상간이나 다름없는 일이 벌어졌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케스가 포착하고 말하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보는 거죠.
이전에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이나, <콜레라 시대의 사랑>을 읽어봤기에, 소재와 묘사가 파격적이다 못해 과격하게 느껴질 정도라고는 생각했지만, <백 년 동안의 고독>은 차원이 다른 '벽'처럼 느껴졌기에 더 당황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 더 읽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인연이 닿으면 기회가 오겠지요.
역사는 돌고 돌지만, 동일하게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 치명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역사는 반복이 아니라 파멸 혹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택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잊지 맙시다. 함께 할 때 우리는 고독하지도 무력하지도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