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눈팔기 ㅣ 현암사 나쓰메 소세키 소설 전집 13
나쓰메 소세키 지음, 송태욱 옮김 / 현암사 / 2016년 6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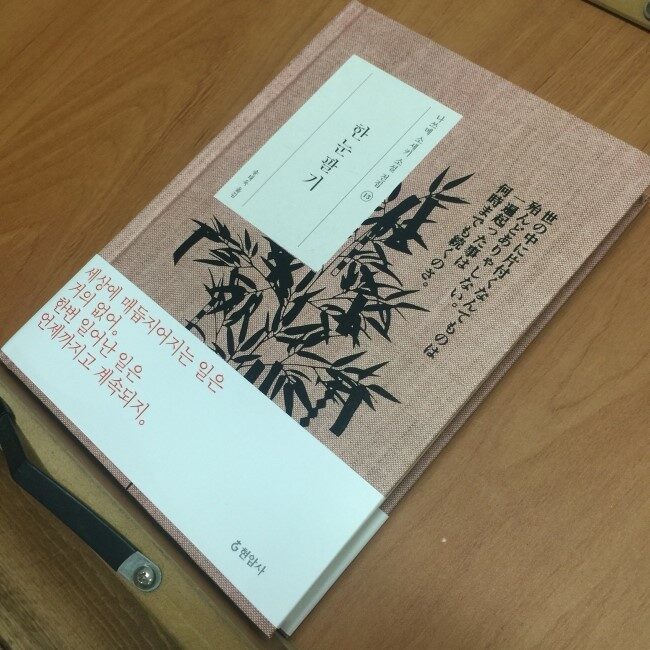
정이현 작가님이 해설을 썼다는 걸 알았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읽기 전이었다.
읽고 난 후에 뒤 표지에 있는 정이현 작가님의 해설 일부를 발췌한 글을 봤다. 작가님은 이 작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다.(물론 해설 전문을 읽는 일은 이번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만한 자부심으로 뭉친 사내가 자신이 기실 길가에 핀 풀과 '다르지 않음'을 인정해가는 과정이다.
멋진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기에 설득력도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나쓰메 소세키는 정말 좋아하는 작가다. 그래서 그의 작품도 거의 다 읽어봤다.
『한눈팔기』가 나쓰메 소세키의 자전적 소설이라는 건 알기 싫어도 알 수밖에 없었다. 거듭되는 주에서 그것은 저렇고, 저것은 이렇고 미주알고주알 설명을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솔직히 조금 걱정되기도 했다. 나쓰메 소세키의 생각을 너무 많이 알게 되어버려서 그에게 실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게 걱정의 정체였다.
정이현 작가님과 다르게 생각한 부분을 먼저 말하자면, 나쓰메 소세키는 결코 다른 사람들과 '같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다. 다른 사람과 같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쓰메 소세키다.
『한눈팔기』에서 보여주는 겐조의 내면은 분명 보통 사람처럼 흔들리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협한다거나 자기 생각을 고쳐먹지는 않는다. 같은 것을 말하면서도 다르게 표현하고, 다른 것 안에 같은 것이 있음을 알면서도, 분명히 다르다고 말하는 모순되지만 사실인 이야기를 거듭 말하고 보여주는 이유도 자신은 마지막까지 오만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아니었을까.
간파당한 오만이라고 해도, 허울뿐인 자부심이라고 해도 굽히지 않으면 자기 자신만은 지켜낼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억지지만 사실이니까 말이다.
나쓰메 소세키의 작품 속 주인공들은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않는다. 그것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어리석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나라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런 인물을 만든 소세키가 자신을 '길가에 핀 풀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할 리 없다. 설사 다르지 않다고 느끼더라도 그 다르지 않음 안에서 다름을 발견해 낼 사람이 소세키라고 생각한다.
앞에 말이 너무 길어져 버렸다.
『한눈팔기』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본제는 『道草』인데 도무지 어떤 의미인지 오리무중이다. 자유롭게 해석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자유롭게 해석하기로 했다. 대략 제목 그대로다. 풀이 잔뜩 깔린 길이 있다고 하자, 그 풀들이 함께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풀은 아닐 거다. 거기에는 화려한 꽃도 있을 것이고, 잔디처럼 표시 나지 않게 뻗어가는 것도 있을 거다.
길 위의 풀들도 모두 다르다. 저마다의 생각이 있고 삶이 있다. 그 다름을 자기 자신조차 모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른 것이다.
『한눈팔기』는 나쓰메 소세키의 삶을 담은 자전적인 소설이다. 입양되었다가 본가로 돌아온 과정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과 그 시간이 빌미가 되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의 마찰이 주로 담겨 있다. 독특한 것은 이 작품이 특별히 어떤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 적은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다. 그야말로 '나쓰메 소세키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려고 적은 작품 같다고 하면 적절할까?
가장 가까워야 할 형제와 부부조차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괴롭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단지 사람은 저마다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면서도 묵묵히 그 괴로움을 끌어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야기 속 겐조이고, 나쓰메 소세키였다.
시기 상으로 보면 『한눈팔기』는 거의 말년에 쓴 작품이다. 어쩌면 멀지 않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다음 세상에 남기는 유언처럼 혹은 자서전처럼 자기 삶을 돌아보려는 시도를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쓰메 소세키는 자신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에 골몰한다. 이 작품에서도 이해에 대해 거듭 이야기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서로의 주의와 주장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체념이나 포기와는 다른, 수용이라고 할까.
100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소세키의 작품에서는 언제나 현재를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다.
어느 날 그는 그 청년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은 행복하네. 졸업하면 뭐가 되겠다든가 뭘 하겠다든가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청년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그건 선생님 세대 일이지요. 요즘 청년들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가 되겠다든가 뭘 하겠다든가 하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세상이 그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과연 그가 졸업했던 시대에 비하면 지금 세상은 열 배나 살아가기 힘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의식주에 관한 물질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청년의 답에는 그의 의도와 다소 어긋난 점이 있었다.
어른들이 하는 말과 그 말에 청년들이 답하는 말과 닮아 보이지 않는지.
역시 이 작품에서 가장 멋진 문장은 이 부분인 것 같다.
"세상에 매듭지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 한번 일어난 일은 언제까지고 계속되지. 다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니까 남들도 자신도 알 수 없을 뿐이야."
매듭을 짓는다는 건 싹둑 끊어낸다는 것과는 다르다. 매듭을 어디에 짓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매듭을 지었는가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 거기다 그 매듭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에 점점 알기 어려워지는 거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소세키는 쓸쓸했을까?
분명 쓸쓸했을 거다. 하지만 그 쓸쓸함이 더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들지는 못했을 거다. 어쩔 수 없이, 어쩌면 떠밀리듯 선택한 쓸쓸함이지만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쓰메 소세키의 태도는 고집과도 다르다. 가장 가까운 말을 찾자면 '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는 그렇게 되기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닌 자의에 의한 것, 스스로 자처한 것이기에 그는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조롱하면서, 때로는 비웃고 비난하면서, 그것이 자신임을 점점 더 밝히 알아갔을 거다.
모두에게 이해받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마음은 내게도 있다. 어쩐지 그런 마음이 소세키의 작품에서 엿보이는 것 같아 위로가 된다.
새삼 모든 독서가 자기 마음에 글을 비춰보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는다. 그 해석이 어떻든 옳거나 그름이 있기 어려운 이유도 그런 것일 테지. 오랜만에 옛날 생각을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거의 기억나지 않는 오래된 기억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나와 세상이 바라는 나를 돌아보고 온 기분이랄까.
『한눈팔기』는 그런 의미였는지도 모르겠다. 지금의 삶에서 잠시 눈을 돌려 과거로, 내일로 마음을 옮겨 보는 그런 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