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자의 노래
모차르트를 높여놓고 설거지를 한다
세제 향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른다
설거지에는 설거지의 도가 있어
먼저 더운물에 그릇을 불리고
거품을 일으켜 애벌 씻은 다음
부드럽게 헹구고 물을 찌워
마른 행주로 닦아 말리면 뽀송해진 그릇들이 좋아한다
어느 과정 하나 소홀하면 안 되고
깊고 얕고 넓고 좁고 그릇에겐 그릇의 품성이 있어
마땅히 예로써 존중해야 한다
아내는 내가 설거지를 해놓으면 좋아한다
어떤 때는 그릇에 얼룩이 그냥 있다거나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고 해도
그러한 지적으로 나의 공부는 나날이 깊어간다
애들이 식기세척기를 사준다 해도
기계는 일은 알지만 살림의 도리를 모르고
마지막으로 행주를 짜 널고
바라보는 재계(齋戒)의 기쁨을 모른다
어떤 날은 이 일 말고 하는 일이 없기도 하지만
그릇을 닦는 일은 세상을 닦는 일이고
나의 경계는 나날이 높아간다 (P.104)
숲속의 의자
누가 숲속에 의자를 가져다 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쉬었다 가기도 했지만
어떤 날은 산이 쉬었다 가고
어떤 날은 바람과 나무가
어떤 날은 고요가 앉아 있기도 했는데
많은 날들을 저 자신이 앉아 있었다 (P.78)
/ 이상국 시집 <나는 용서도 없이 살았다>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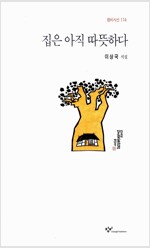
山으로 가는 어느 길목, 이층에 카페가 있었다. 테이블 다섯에(그중 하나는 주인장의 투명독서대가 놓여 있는 자리이고) 피아노와 악기와 책들과 사진과 그림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는.
성악을 전공하고 이러저러한 음악과 공연을 하고, 서울 알만한 교회 성가대 지휘자도 하였는데 어느 날 부조리한 이유로 해임이 되고 그래서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지만 교회를 떠났고, 어느날 2층에 1인 카페를 내고, 하루종일 재즈가 흐르는 그 작은 숲속의 옹달샘 같은 카페에 앉아 음악을 듣고 혼자 冊을 읽다가 밤 11시에야 문을 닫고 끝나는 그런 조용한 카페. 지인들과 아주 맛있게 내려 주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갈 때마다, "사장님!" 부르면 정색을 하며 "난 사장 아니다. 그냥 '설거지 하는 놈'이다." 하곤 했는데 우리는 그럼 '설거지 하는 님'으로 "설님!"이라 낄낄대며 호칭을 하곤 했는데, 구석구석 아름다운 풍경과 한밤의 낮고 반짝이는 조명 빛 아래서 바흐도, 모차르트도, 재즈도, '술과 장미의 나날'도 혹은 '시가 될 이야기'도, 노랑 수선화가 피어 있는 실내에서 가곡 '수선화'도 여러 성악가들의 목소리로 고요함 속에 숨죽여 들었던 마치 애니메이션 속 같은 그런 운 좋은 사람들만 누렸던, 탐미주의 에겐남이 언제나 자신을 '설거지 하는 놈'이라고 지칭했던 공간과 시간과 사람. 詩人의 이 詩를 읽다가 문득 주인장 생각이 떠올라 미소 짓는 '수행자의 노래'.
왜 맨날 한사코 자신을 '설거지 하는 놈'이라 자칭했는지 왠지 알 것도 같은 '설님'에게 이 시를 들려 주면 좋아할 것 같았네.
이제는 '그대의 창에 등불 꺼지고'로 종료하였지만, 같은 아티스트인 그대의 눈 밝고 어여쁜 따님이 오늘도 '새 발자국(Turning Page)'으로 많이 운 날은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오늘도 열심히 '중꺽마'의 정신으로 걸어가고 있으니 잘 지내시길.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