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옹
말은 제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지 않는다
세렝게티 초원에서나 한라산 기슭에서나
서로의 뒤를 봐주느라 그 일생이 다 간다. (13)
그리움의 방식
꿀벌의 침은 내장과 연결되어 있다
목숨을 거는 일이라 함부로 쓰지 않는다
당신을 지켜야 할 때
딱 한 번 쓸 뿐이다. (50)
/ 김영순 시집 <밥 먹고 더 울기로 했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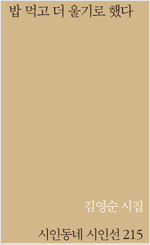

살다 보면 '밥 먹고 더 울기로 했다.'라는 일이, 어느 정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는 말이라 생각 든다. 가령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에도 우리는 눈물을 삼키며, 어떡하든 한 끼를 먹는 일이 언덕 하나를 넘는 일이 돼 듯, 그게 인생이라 여겨지는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는 찰나에도/ 두부는 아주 평화롭게 구워진다"라는 어느 시집의 구절과, 그 '순한' 두부를 시 제목으로 지은 詩가 너무 멋지고 광활하게 씌어 나의 빈곤한 문해력에 난감하다가, 마지막 연의 "모든 것이 끝나도/ 어떤 마음은 계속 깊어진다.(100쪽)"'라는 뭔가 알 듯 말 듯 해, 서둘러 다행히 냉장고에 잠자고 있던 두부로 '두부김치'를 만들어 소주나 마시고, 또 밤새 밥벌이를 해야겠다.
두부는 어느 계절에나, 어느 시간에나 구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밤. 결코 어느 시집을 부정하는 마음은 아니다. 세상은 시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각자의 소회이고 느낌인, 백인백색의 세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