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퍼스트 셀 - 죽음을 이기는 첫 이름
아즈라 라자 지음, 진영인 옮김, 남궁인 감수 / 윌북 / 2020년 11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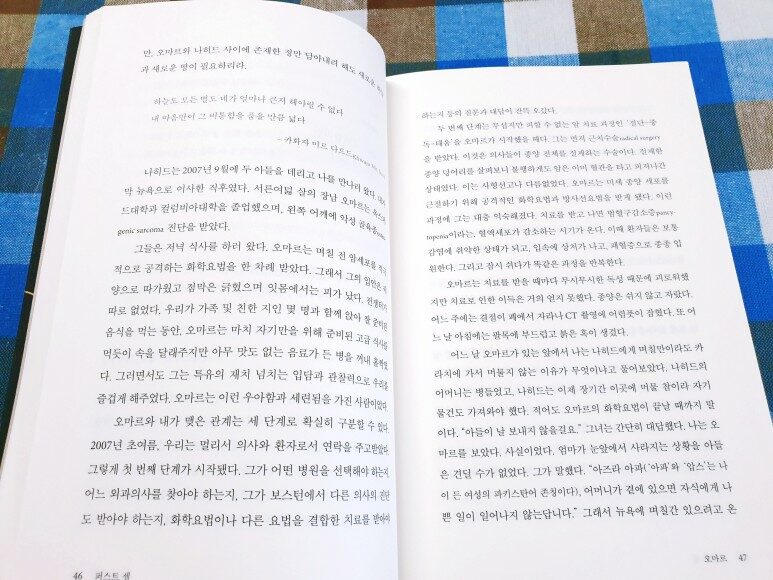


암은 내밀한 개인적 차원에서 심각한 비극이고 환자의 가족들을 비탄에 빠뜨리며,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격을 주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선택 가능한 최고의 방법으로 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가? 현재 쓰고 있는 가혹한 조치 가운데 일부는 다시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환자를 죽이는 것이 암인지 아니면 치료법인지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쓰는 해결책이 좋기는 한 것일까? 둘 중 어느 쪽이 더 나쁠까? 누군가 적절히 지적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 화학요법, 면역요법, 줄기세포 이식을 사용하는 일은, 개의 벼룩을 제거하겠다며 개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일과 같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최선의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p.32)
암으로 죽는 환자 가운데 약 90퍼센트는 암이 진행되어, 즉 전이되어 목숨을 잃는다. 이런 상황은 지난 5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새로운 전략이 더 나왔으나 암이 전이된 환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새로운 치료법은 플레이트나 동물 모델에서 세포주로 자라난, 생물학적으로 다 똑같은 세포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 종종 대단한 반응을 이끌어낸다. 반면 환자에게 쓰면 대단한 실패를 거둔다. 암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불균일하고, 무한히 진화하며, 인간의 몸 안에서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p.83)
그녀는 삶과 죽음 사이의 기묘한 상태에 발이 묶인 채 머릿속으로 장례식과 싸웠다. 대뇌의 움푹 팬 곳, 튀어나온 곳, 접힌 곳마다 반란이 일어났다. 피부의 모든 모낭이 장기 기관의 모든 세포가 싸웠다. 그녀는 죽음을 거부했다. 몸과 마음의 놀라운 여력에 의지하여 죽음을 밀어냈다. 의학적 상상과 예법의 한계에 도전하는, 다층적이고 빼어난 저항이었다. 그녀는 치명적인 질병이 가한 심한 손상을 버티기의 방법론으로 뒤집으려 했다. 고집스럽고 기이하며, 충격적일 만큼 저항적인 태도로 죽음을 거부하고 있었다. (p.166)
암에 걸린 환자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사망한다. 획기적이라는 신약도 엄청난 신체적 · 재정적 비용을 치르게 하면서 생존 기간을 고작 몇 개월 더 늘릴 뿐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질병으로 죽겠는가? 아니면 치료 때문에 죽겠는가? 당신이라면 무엇을 고르겠는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망률이 높은 질병인 암. 매년 신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암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실험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암 환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에 세계적인 종양 전문의이자, 과학자인 저자는 말한다. “암 연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으로.” 현재 우리 의료계에서는 마지막 암세포를 찾아 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암을 치료한다. 하지만 이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환자의 몸 전체가 고통을 받는, 이른바, 치료가 환자를 죽이는 상황. 그렇기에 환자는 마지막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끝까지 고통 속에서 투병하게 된다. 이에 저자는 악성의 세포로 자라나기 전에 첫 번째 암세포, 즉 퍼스트 셀을 찾아내 박멸하는 방식으로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주장한다. 첫 번째 암세포의 생성을 찾는 방향으로 모든 암 연구, 암치료, 암 예방의 포커스를 돌려놓자는 것이다.
오마르, 퍼, 레이디 N, 키티 C, JC, 앤드루, 하비까지 특이해 보이는 각 장의 제목은 그녀가 지금껏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보내야 했던 환자들의 이름이다. 생사의 기로에서 신약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며 흔들리다가, 마지막까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떠난 환자들에 대한 회고록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암의 괴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비밀처럼 숨기는 암의 내밀한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투병의 시간들을 거침없이 써내려간다. 환자를 치료하는 종양 전문의이자, 암으로 남편을 잃은 아내이자 보호자로서 암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치료를 위한 그녀의 진솔한 고백. 남편을 비롯하여 그녀가 떠나보낸 수많은 암 환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금방 눈시울이 붉어진다. 소리소문없이 다가오는 어둠의 그림자.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도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도 힘겨운 시간의 기록. 암은 한번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환경과 개인에 따라 속도를 예측하기 어렵다. 인간의 DNA가 모두 다르듯 암의 변이도 모두 다르기 때문. 누군들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직접 겪어 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금 더 살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착잡하다. 모두의 바람대로 어서 빨리 암이 정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