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생이 적성에 안 맞는걸요 - 마음 아픈 사람들을 찾아 나선 ‘행키’의 마음 일기
임재영 지음 / arte(아르테) / 2018년 11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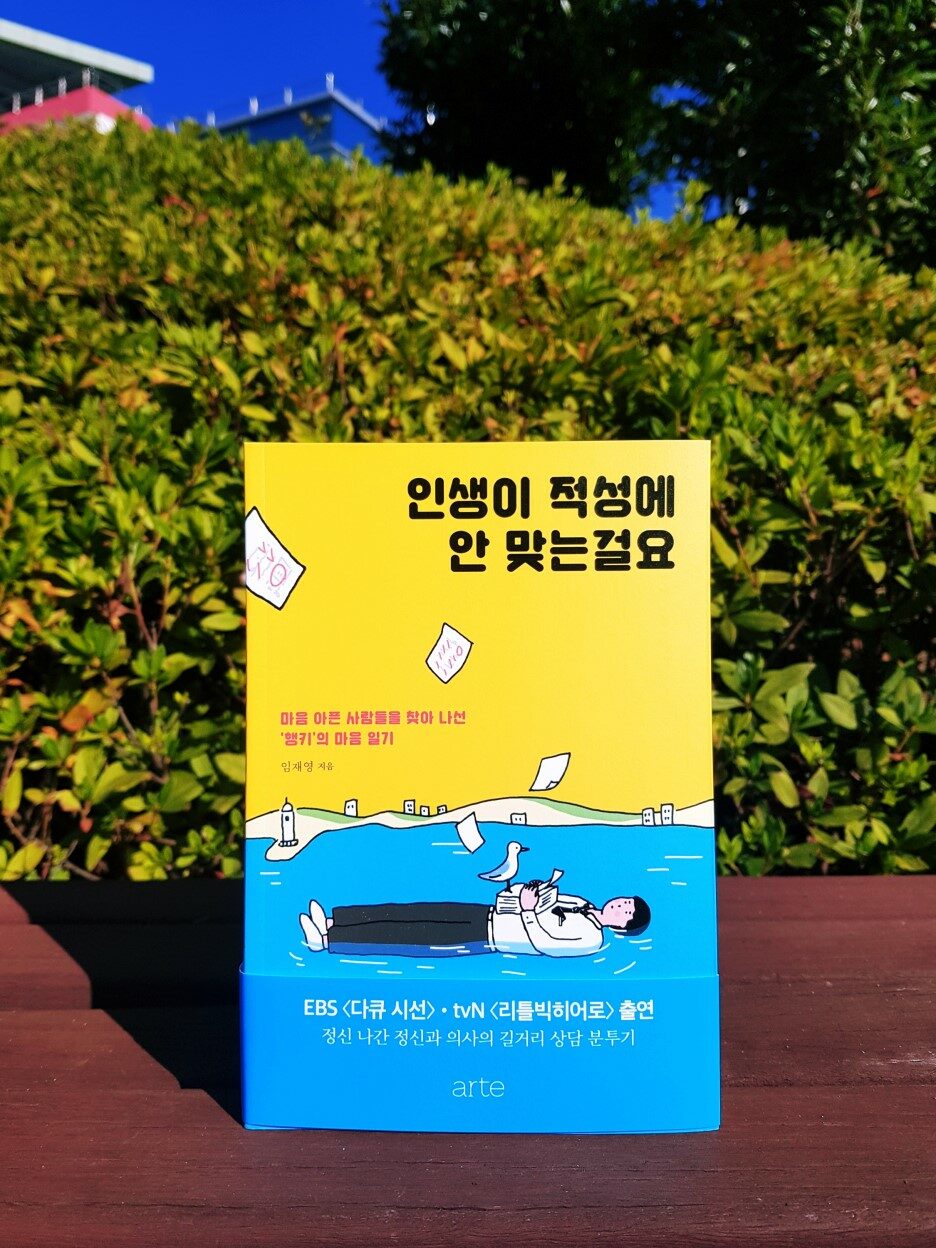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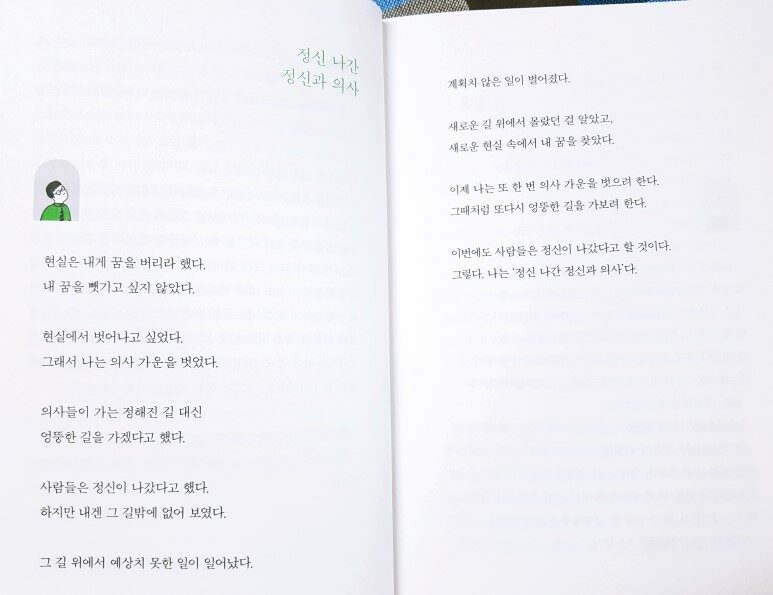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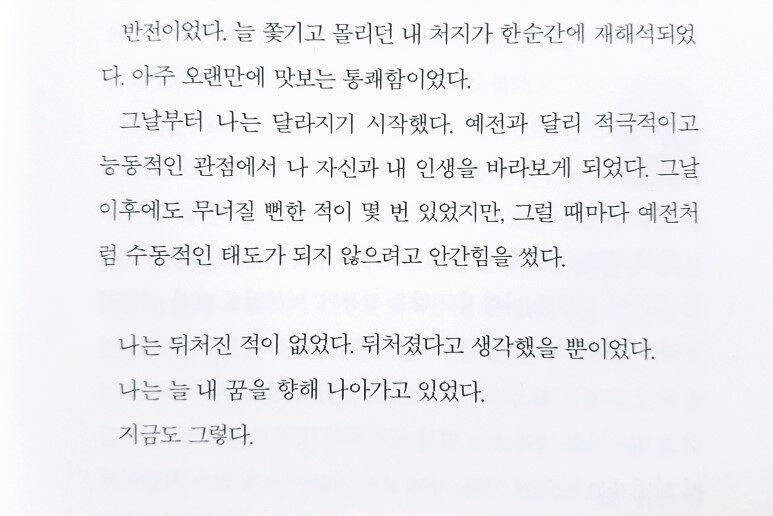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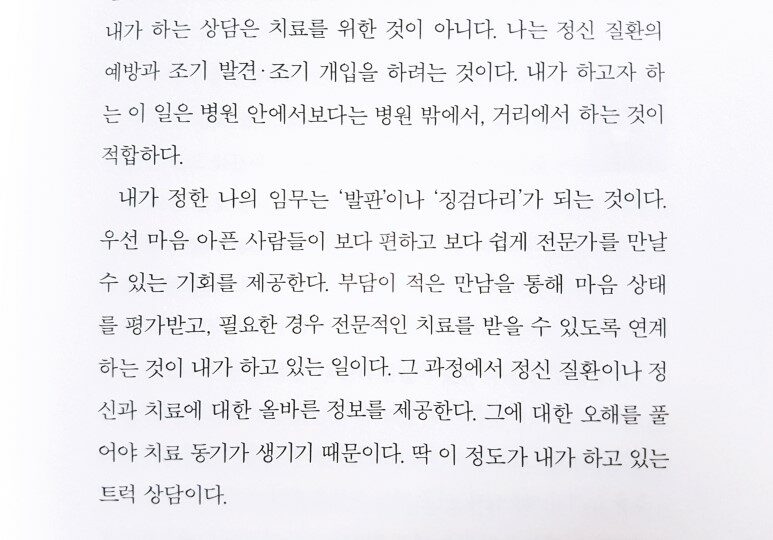
여기 두 가지 질문이 있다.
“당신은 몸이 아픈 사람인가, 아니면 마음이 아픈 사람인가?”
“그래도 살고 싶으신가? 아니면 그래서 죽고 싶으신가?”
위 질문들에 어떤 대답을 해도 괜찮다. 괜찮다는 말이 상관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럴 만하다.’, ‘그럴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따라 아프게 된다. 그리고 몸이든 마음이든 더 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프면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 살고 싶은 마음이 아직 남아 있으면, 마음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사라지고, 살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된다. 죽고 싶은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만해서 그런 것이다. 하지만 죽고 싶을 수 있다는 것이 죽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p.15)
나는 늘 내 감정에 나를 고스란히 맡겼었다. 그것이 문제였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깨닫자, 그것만으로 나는 달라졌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나 자신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었다. 언제나 나로부터 불거진 문제, 내 안에서 벌어진 문제였다. 문제를 알고 나니 답을 찾을 길이 보였다. 애타게 기다리던 터닝 포인트였다. 문제를 풀려면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야 했다. 동시에 한참 동안 잊고 있었던 누군가가 떠올랐다.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던, 과거의 나 자신이었다. 반가웠다.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 같았다. 그가 왜 이제서야 연락했냐고 따져 물었다. 그때부터였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은. 내 문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내 모습 속에 내가 찾던 답이 있었다. (p.22)
나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말을 들을 때 종종 눈을 감는다. 상상을 하기 위해서다. 그가 되어보려고, 그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눈을 감는다. 잠깐 동안 내가 아닌 그가 된다. 눈을 감았는데도 눈이 시려온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눈꺼풀이 무겁게 느껴진다. 지금은 아침이고, 이곳은 그의 방이다. 이불을 덮고 누운 채 꼼짝도 하기 싫다. 몸과 마음이 땅으로 꺼지는 것 같다. 내겐 낯설지 않은 느낌이다. 다시 나로 돌아가기 위해 눈을 뜬다. 그리고 그를 다시 바라본다. 그도 내 얼굴을 바라본다. 그가 내 얼굴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공감에 성공한 것이다. 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었다면 된 것이다. (p.62)
우리의 생각은 말랑해지기도 하고 딱딱해지기도 한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생각의 상태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상담 사례처럼 인생 최악의 상황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 생각은 딱딱하게 굳어진다. 하지만 아무리 최악의 조건이더라도 해결책을 혼자 찾느냐 함께 찾느냐에 따라 결론을 달라질 수 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살아야 할 이유 또한 있다. 동전에는 분명 양면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혼자 깜빡 잊어버린 사실을 상기시켜줄 사람이 필요하다. 혼자 내려버린 결론을 점검해줄 사람이. (p.122)
병원에서 벗어나 거리로 나온 그를 세상은 ‘정신 나간 정신과 의사’, ‘거리의 정신과 의사’라 부른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넘어 행복을 키우는 사람이고 싶어 ‘행키’라는 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2016년 3월부터 자비로 구입한 상담 트럭을 몰고 다니며, 거리에서 아픈 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행복을 키우고 있다. 마음 아픈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아프기 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 그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이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 바람 하나만으로 트럭 상담을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가 의사라고 결코 자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될까 싶어 늘 경계하며 마음 아픈 사람들을 맞이 한다.
책은 멀쩡히 잘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달랑 중고 차를 하나 구입해 <찾아가는 고민 상담소>를 만들고 운영하며 겪은 좌충우돌 사건들과 이전에 병원을 찾지 못하고 홀로 힘겹게 버티다 그곳을 찾은 사람들의 사연을 담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신과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누구에게 말도 못 하고 홀로 힘겹게 버티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마음의 병을 얻기 전에 도움을 주고 싶어 직접 길거리로 나선 정신과 의사 임재영. 어찌보면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무모하다.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곳을 놔두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고생길을 자처해서 가다니 이게 말이나 되나.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어느 길보다 꼭 가야하는 길이었다. 정신병원에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8개월. 병원 안에서 남들처럼 의사 가운을 입은 채로 문턱이 낮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병원을 떠났다. 같은 말이라도 병원 밖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 전달력도 파급력도 클 것이라 판단했다. 마음 아픈 사람들이 정신병원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 싶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년 만에 병원으로 돌아와 만나는 분들은 2년 전에 뵈었던 분들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예전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더 많아졌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정신병원의 문턱은 높은 걸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나를 향해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 수근거림, 내 태도에, 당신의 태도에 자꾸만 발걸음이 뒤로 달아난다는 것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결국 참다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서야 발걸음을 옮긴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말이다. 책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상담 사례가 등장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마음의 병. 몸에 상처가 나면 알아보고 약이라도 발라줄텐데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서 본인이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치기 일쑤다. 요즘은 누구나 저마다 가슴속에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다. 감기처럼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는데도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한껏 날이 서 있다. 그러면 어느 누가 편히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 책을 읽으면서 한껏 많은 양의 위로를 받아간다. 아마 저자 자신도 마음의 병을 충분히 앓아 봤기에 상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누구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가슴 한켠에 담아 두었던 상처에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인 것만 같다. 나도 당신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내 조그마한 관심이 세상을 바꾼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내 작은 관심이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