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야생 붓꽃
루이즈 글릭 지음, 정은귀 옮김 / 시공사 / 2022년 11월
평점 :




"시는 어렵다"라는 독자의 개인적 생각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시집 『야생 붓꽃』을 읽으려는 이유는 순전히 시인의 노벨상 수상 이력 때문이다. 어려워서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란 두려움보다 노벨문학상이란 상의 권위가 주는 매력에 더 끌렸기 때문이라고 독자는 솔직히 고백한다. 평소에 시집을 잘 읽지 않는 것을 '시는 어렵다'는 인식에 편승해 변명하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 작가라는 무게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무감을 줄 정도로 압박감이 있다. 책 좋아한다는 사람이 노벨상 수상 작가의 책을 읽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책을 좋아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 시집은 노벨상 수상 작가(2020)이자 여류 시인의 초기 시집(1992)이다. 시인이나 작가에게 '여류'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로서 여성은 흔한 일이 아니어서 독자가 임의로 붙였음을 양해해 주시길 빈다. 이 시집의 루이즈 글린은 1996년 비스와바 쉼보르스카(폴란드 시인) 이후 두 번째 여류 시인이자 21세기 첫 여성 시인이다.
1992년 출판된 시인의 여섯 번째 시집 『야생 붓꽃』은 시인에게 퓰리처상과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 시 협회상을 안겨준 대표작이다. 미국시사에서 식물에게 이렇게나 다양하고 생생한 그들만의 목소리를 부여한 시인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다고 한다. 정원 가꾸기가 취미였던 에밀리 디킨슨(Emily Dickinson, 1830~86)이 자연에 대한 시, 특히 꽃을 매우 섬세하게 관찰하고 묘사하는 시를 많이 썼지만, 글릭처럼 이토록 온전히 꽃의 목소리를 직접 구사하지는 않았다고 출판사 측은 밝히고 있다. 동시대 시인 메리 올리버(Mary Oliver, 1935~2019)도 자연을 가까이 하며 다른 존재들에 대한 시를 많이 썼지만 인간의 시선으로 대상을 면밀히 보는 시들이 많았다. 글릭에게 이르러 꽃은 비로소 꽃 자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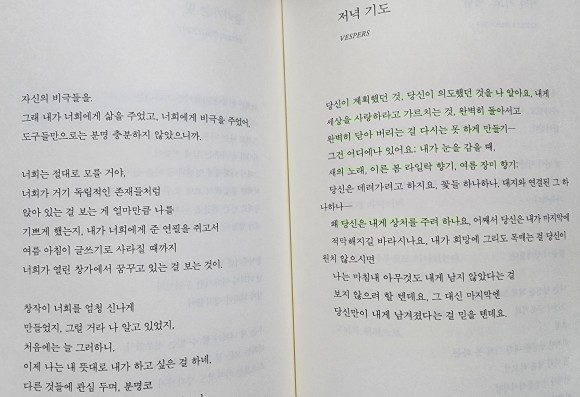
이 시집은 식물의 목소리를 구사한 글릭의 시적 실험이 돋보인다. 식물을 관찰하다가 자신의 경험으로 넘어가는 화법은 의인화가 가진 울림을 더 크게 보여준다고 예스24 MD 이나영의 평이다. 글릭과 오랫동안 소통한 정은귀 번역가와 신형철 평론가의 해설이 별도의 책으로 함께 실렸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독자는 시를 직접 읽기보다 해설과 번역가의 말을 주의 깊게 살폈다. 시를 읽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먼저 읽었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작품 해설' 「세 개의 모놀로그 혹은 한 개의 트라이얼로그」에서 "2020년 노벨문학상을 루이즈 글릭에게 수여하면서 한림원이 특별히 언급한 것은 그의 열 번째 시집 『아베르노』(2006)였지만, 그것이 『야생 붓꽃』(1992)이었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에게 퓰리처상을 안긴 『야생 붓꽃』은 『아베르노』와 함께 손꼽히는 대표작이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글릭만의 '시적 목소리((poetic voice)'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지만, 특히 이 시집은 '목소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하나의 답이 된 사례라고 할 만하다. 『야생 붓꽃』에는 여러 목소리가 있다. 식물의, 인간의, 그리고 신의 목소리. 대체로 식물은 인간을 향해 말하고, 인간은 신을 향해 말하며, 신은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 이 세 종류의 화자-발화로 쓰인 시가 시집을 삼등분한다. 이 글의 목표는 일차적이고 기초적이다. 세 목소리를 정확히 구별하고, 각각의 목소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축어적으로 따라가 보는 일이 그것이다."고 전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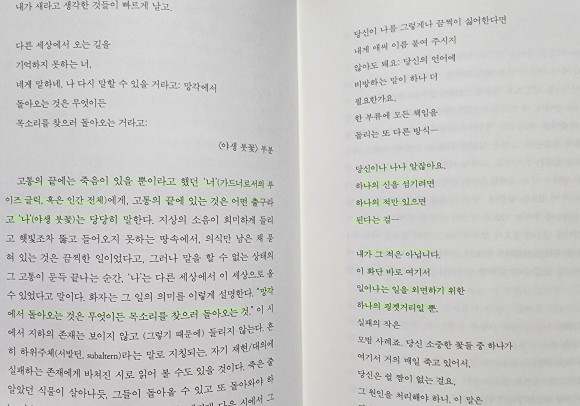
끔찍해, 어두운 대지에 파묻힌
의식으로
살아남는다는 건.
그러고는 끝이 났지: 네가 두려워하는 것, 영혼으로
있으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갑자기 끝나고, 딱딱한 대지가
살짝 휘어졌어. 키 작은 나무들 사이로
내자 새라고 생각한 것들이 빠르게 날고.
다른 세상에서 오는 길을
기억하지 못하는 너,
네게 말하네, 나 다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망각에서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든
목소리를 찾으러 돌아오는 거라고:
- 「야생 붓꽃」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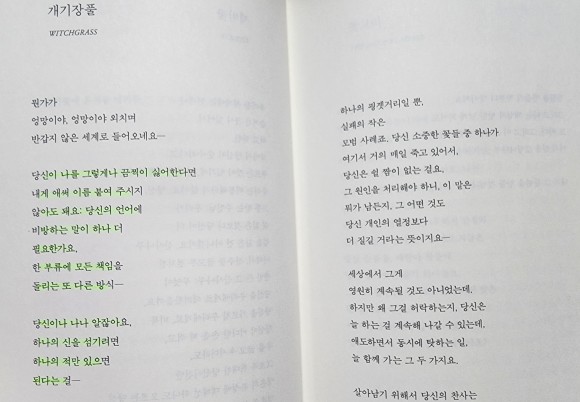
당신이 나를 그렇게나 끔찍이 싫어한다면
내게 애써 이름 붙여 주시지
않아도 돼요: 당신의 언어에
비방하는 말이 하나 더
필요한가요.
한 부류에 모든 책임을
들리는 또 다른 방식ㅡ
당신이나 나나 알잖아요.
하나의 신을 섬기려면
하나의 적만 있으면
된다는 걸ㅡ
내가 그 적은 아닙니다.
이 화단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외면하기 위한
하나의 핑곗거리일 뿐,
- 「개기장풀」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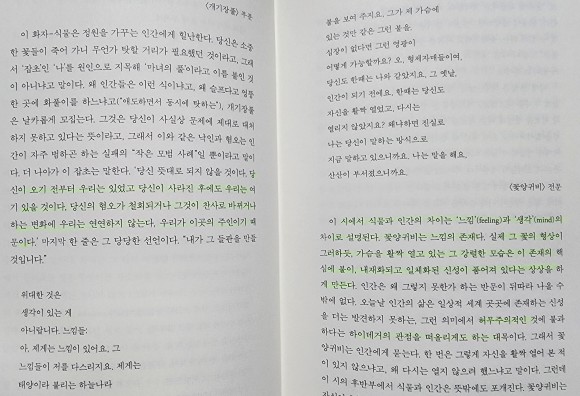
화자-식물은 정원을 가꾸는 인간에게 힐난한다. 당신은 소중한 꽃들이 죽어 가니 무언가 탓할 거리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그래서 '잡초'인 '나'를 원인으로 지목해 '마녀의 풀'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아니냐고 말이다. 왜 인간들은 이런 식이냐고, 왜 슬프다고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느냐고("애도하면서 동시에 탓하는"), 개기장풀은 날카롭게 꼬집는다. 그것은 당신이 사실상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이와 같은 낙인과 혐오는 인간이 자주 범하곤 하는 실패의 '작은 모범 사례'일 뿐이라고 말이다. 더 나아가 이 잡초는 말한다. '당신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오기 전부터 우리는 있었고 당신이 사라진 후에도 우리는 여기 있을 것이다. 당신의 혐오가 철회되거나 그것이 찬사로 바뀌거나 하는 변화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곳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한 줄은 그 당당한 선언이다.
신형철은 또 「꽃양귀비」의 해석으로 이어진다. 이 시에서 식물과 인간의 차이는 '느낌(feelig)'과 '생각(mind)'의 차이로 설명된다. 꽃양귀비는 느낌의 존재다. 실제 그 꽃의 형상이 그러하듯, 가슴을 활짝 열고 있는 그 강렬한 모습은 이 존재의 핵심에 불이, 내재화되고 일체화된 신성이 품어져 있다는 상상을 하게 만든다. 인간은 왜 그렇지 못한가 하는 반문이 뒤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 오늘날 인간의 삶은 일상적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신성을 더는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 허무주의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하이데거의 관점을 떠올리게도 하는 대목이다. 그래서 꽃양귀비는 인간에게 묻는다. 한 번은 그렇게 자신을 활짝 열어 본 적이 있지 않으냐고, 왜 다시는 열지 않으려 했느냐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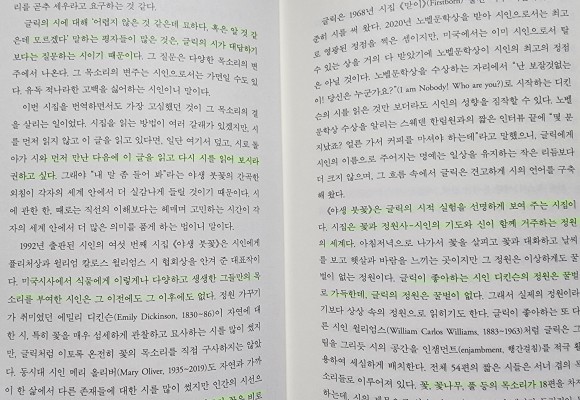
역시 문학평론가의 작품 해설은 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혼잣말 하듯이 쓰인 이 시에서 나(인간), 꽃, 신의 목소리를 내는 화자는 시인 한 사람이다. 세 물체의 소통을 인간이 중간에서 한다. 그가 화자이고 그는 시인이다. 물론 꽃은 꽃으로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신은 신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말하고 항변하고 변명하고 자기의 목소리로 주장한다. 그렇게 알고 시를 읽어나가다가도 일부는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은 이 시의 목소리들이 각 객체이지만 대답하고 질문하고를 반복하는 '대화'가 아니라 혼잣말처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이 시가 독자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이라고 시의 번역자 정은귀는 말한다.
그는 '옮긴이의 말' 「꿀벌이 없는 시인의 정원에서」 차근차근 답변해준다. "미국은 정원을 가꾸는 일이 특별한 취미가 아니고 일상인 나라다. 미국의 일상에서 이 시집에 등장하는 꽃과 풀은 그다지 낯설지 않다"고 말한다. 미국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 늘 만나는 사람들이 이 시의 대상이라는 주장처럼 들린다. 정은귀는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온전히 이해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시집 전체가 54편의 비교적 짧은 시들로 이루어져 있다. 비교적 간명한 단어들이라 굳이 사전을 찾아볼 필요도 없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금방 뜻이 들어오지 않고 아리송할 때가 많다. "내 말 좀 들어봐" 해 놓고선 호락호락 넘어오지 않겠다는 듯, 시는 여러 겹의 목소리로 독자들을 혼란에 빠트린다. 이 시집을 독자들은 여러 번 되풀이해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아니, 어쩌면 꽃을 들여다볼 때처럼 세심하게 보면 그걸로 충분한 지도 모르겠다. 어떻든, 이 시집은 사람이건 꽃이건, 풀이건, 저녁나절 햇살이건, 여름 오후 바람이건, 대상을 세심하게 보지 않고 멀리서 예쁘다, 별로다, 심드렁하게 쉽게 결론을 내리는 우리의 습관을 다시 보라고, 단호하게 허리를 곧추세우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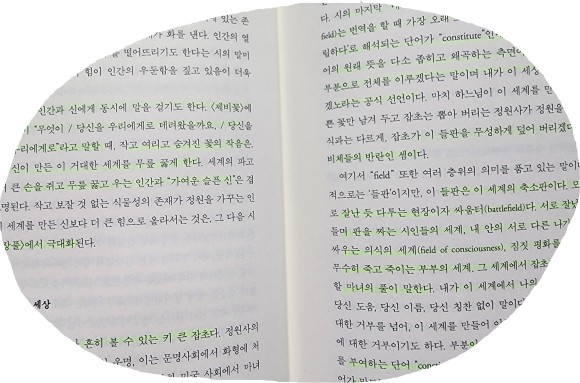
저자 : 루이즈 글릭(Louise Gluck)
미국의 시인이자 수필가이다. 1943년에 태어났다. 1968년 시집 《맏이》로 등단했고, 1993년 시집 《야생 붓꽃》으로 퓰리처상과 전미도서상을 받았다. 2003년부터 다음 해까지 미국 계관 시인이었다. 그동안 시집 열네 권을 발표했고 에세이와 시론을 담은 책 두 권을 지었다. 2020년 노벨문학상, 2015년 국가인문학메달, 1993년 《야생 붓꽃》으로 퓰리처상, 2014년 《신실하고 고결한 밤》으로 전미도서상, 1985년 《아킬레우스의 승리》로 전미비평가상 등을 받았다. 2001년 볼링겐상, 2012년 로스앤젤레스타임스도서상, 그리고 2008년 미국 시인 아카데미의 월리스 스티븐스상을 받기도 했다. 예일대학교와 스탠퍼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역자 : 정은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이자, 우리 시를 영어로 알리는 일과 영미 시를 우리말로 옮겨 알리는 일에 정성을 쏟고 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며 시가 그 말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믿음의 실천을 궁구하는 공부 길을 걷는 중이다.
지은 책으로 《딸기 따러 가자》와 《바람이 부는 시간: 시와 함께》이 있다. 앤 섹스턴의 《밤엔 더 용감하지》,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의 《패터슨》을 한국어로 번역했다. 심보선의 《슬픔이 없는 십오 초(Fifteen Seconds Without Sorrow)》, 이성복의 《아 입이 없는 것들(Ah, Mouthless Things)》, 강은교의 《바리연가집(Bari’s Love Song)》, 한국 현대 시인 44명을 모은 《The Colors of Dawn: Twentieth-Century Korean Poetry》를 영어로 번역했다. 시를 통과한 느낌과 사유를 나누기 위해 매일 쓰고 매일 걷고 또 매일 번역한다. 때로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과 시가 그 말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며 공부 길을 걷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시를 통과한 느낌과 사유를 주고받는 나눔을 위해 매일 쓰고 매일 걷는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과 시가 그 말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믿음의 실천을 궁구하는 공부 길을 걷는 중이다. 번역에도 관심이 많아 심보선 시집 『슬픔이 없는 십오 초』와 이성복 시집 『아 입이 없는 것들』 영역시집 Fifteen Seconds Without Sorrow (2016) 그리고 Ah, Mouthless Things (2017)를 출간하였고 한국 현대시인 44명을 모은 The Colors of Dawn: Twentieth-Century Korean Poetry (2016)를 번역, 편집하였고 영미시를 한국에 소개하는 일도 기쁘게 하는 중. 시를 통해 우리 삶과 세계를 읽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