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름들 - Names
정다정 지음 / 별빛들 / 2021년 9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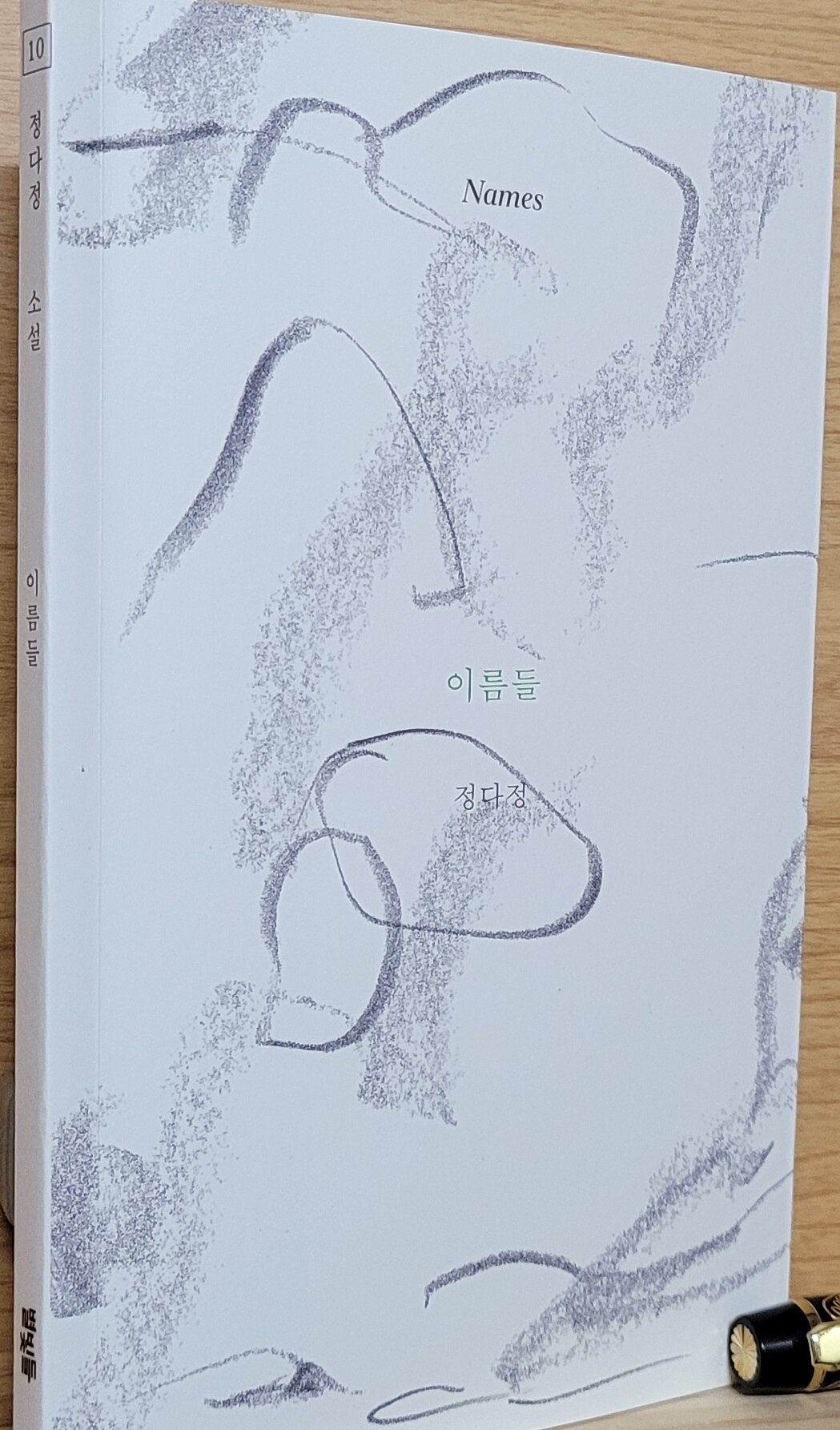
소설 『이름들』은 사라진 이름들을 찾고자 하는 진수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장소로 가고자 하는 민수의 이야기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는 두 사람과 함께 걸어 나가다 보면 익숙한 이름들의 감각이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글 소개는 참일까? 그리고 이야기 끝에선 정말 한편의 긴 시(詩)를 가질 수 있을까. 소설을 읽고도 읽었는지 그냥 지나왔는지, 끝날 때까지 안갯속을 걸은 느낌이다. 길지 않은 단편소설 정도의 길이에 시집처럼 작고 얇은 책이다. 책 표지마저 낙서인지 그림인지 애매한 모습의 선들이 추상적 형태로 그려져 있다.
'이름들'이란 제목 아래 '수요일' '이름들' '선생님' '문' '둥지' '미래' '모양' 등 7개의 소제목으로 이루어진 소설이다. 1장이라 할 수 있는 '수요일'엔 수요일밖에 없는 나날이 785년 동안 지속된다. 78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수요일밖에 없는 세상이니 7로 나누면 112년쯤 되나? 쓸데없는 생각이고 필요없는 계산이다, 꿈속이니까. 진수는 꿈에서 깨어난 뒤 점점 이름들이 사라졌다. 처음 이름이 사라졌다는 걸 알아차린 순간은 바로 수요일이었다. '수요일'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안 순간은 '수요일'이 사라진 지 열흘이 지난 후였다. 아무튼 주인공 진수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된다. 또 한 주인공 민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원하지만 둘은 가깝다. 수요일만 존재하는 꿈속의 세상에서 나온 진수는 어제가, 785년 동안 계속된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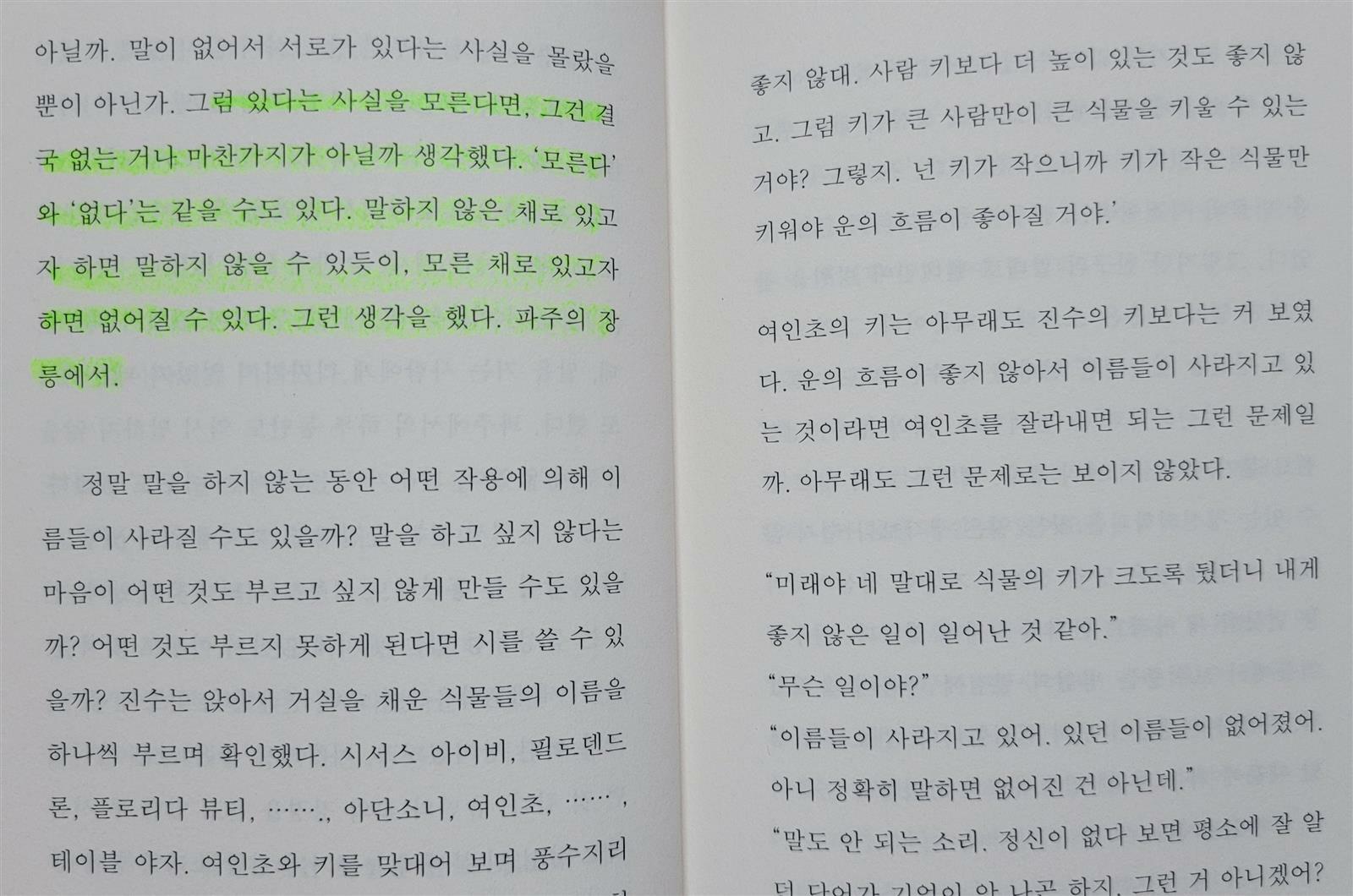
'이름들'에서는 유명하지만 독자는 잘 모르는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온다. '잉마르 베리만' '시서스 아이비' '필로덴드론' '플로리다 뷰티' '아단소니'······ 잉마르 베리만(영화감독)을 제외하고 모두 풀이름이라고 한다. 진수와 민수 두 사람과 함께 걸어 나가다 보면 익숙한 감각이 새롭게 느껴질 것이라는데 오리무중이란 말이 더 어울리게 어떤 세상인지 어떤 느낌인지조차 쉽게 인지되지 않는다. 꿈에서 깨어나 병원에도 가고 산책도 하지만 독자의 의식은 말끔하지 못한 채 소설에 끌려다니고 있는 느낌이다. 일제강점기의 시인 이상(李想)의 '오감도'를 봤을 때 독자들의 기분이 이랬을까.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미의 세계가 이런가 싶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는다. 오후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름이 사라지고 있다고 믿는다. 아무도 없는 세계가 있다고 믿는다. 정말로 믿고 있나." 언어 유희 같기도 하고, 뭔가 진리를 찾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두 번 읽어서는 독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높은 추상성을 지닌 것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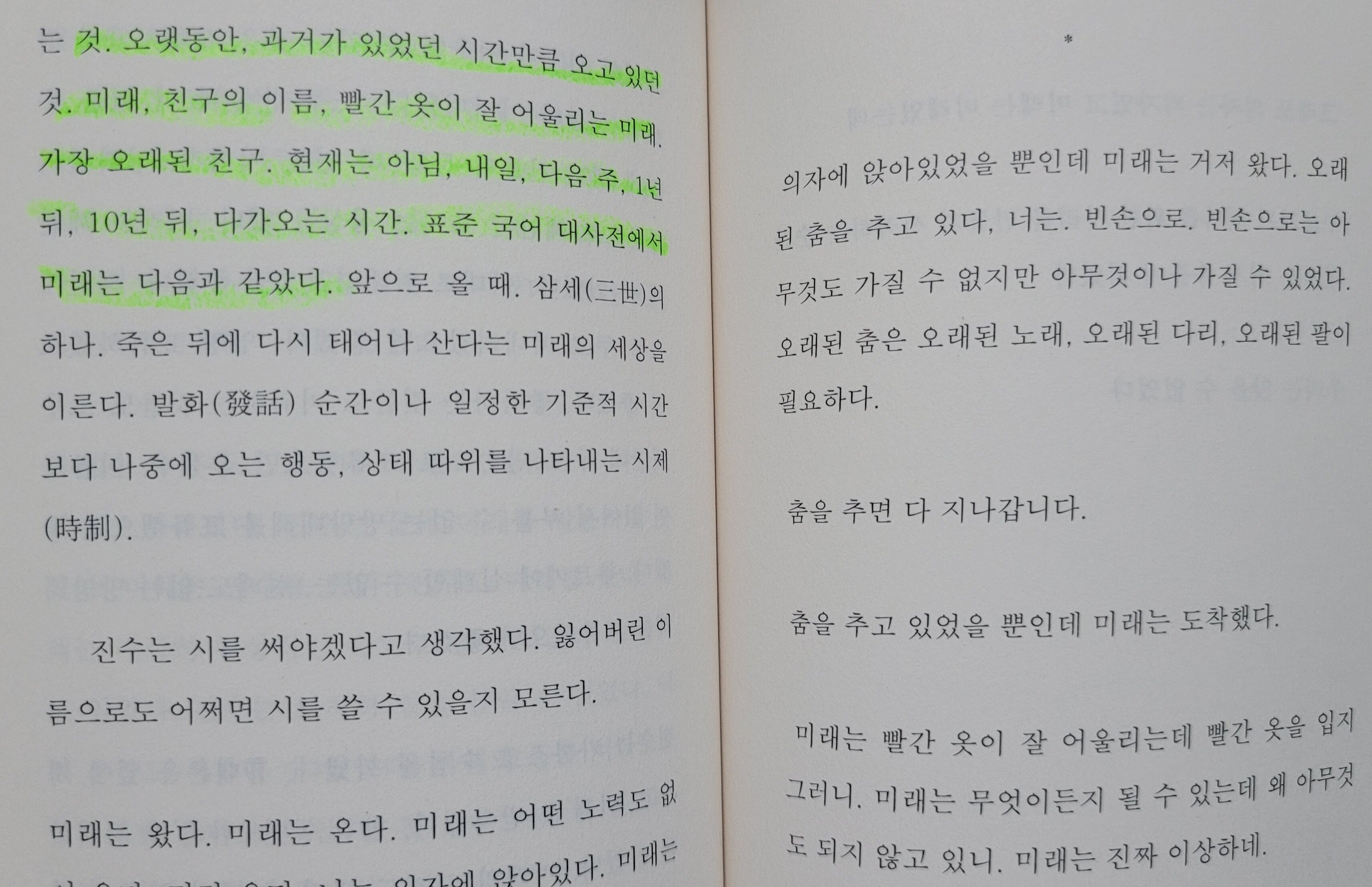
그러나 추상의 연속만은 아니다. 현실적이고 형상적 사실로 이야기는 계속된다. 진수는 어느 날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민수 선생님'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한다. 이름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민수는 진수에게 자신은 아무도 없는 세계로 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한다. 그 세계로 가려면 수상하고 이상한 문을 찾아야 한다.
민수는 아무도 없는 세계로 가고 싶어했고, 진수는 사라진 이름들을 찾고 싶어했다. 그래서 둘은 서로를 돕기로 한다. 민수는 진수의 사라진 이름들을 함께 찾아주고, 진수는 민수가 찾는 수상한 문을 함께 찾아주는 것. 민수는 결국 아무도 없는 세계를 다녀오게 된다. 그곳에는 우리가 사는 곳과 똑같지만 정말 아무도 없다. 그래서 누군가를 부를 일이 없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진수에게 편지를 쓴다. 함께 오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도 없는 세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오게 되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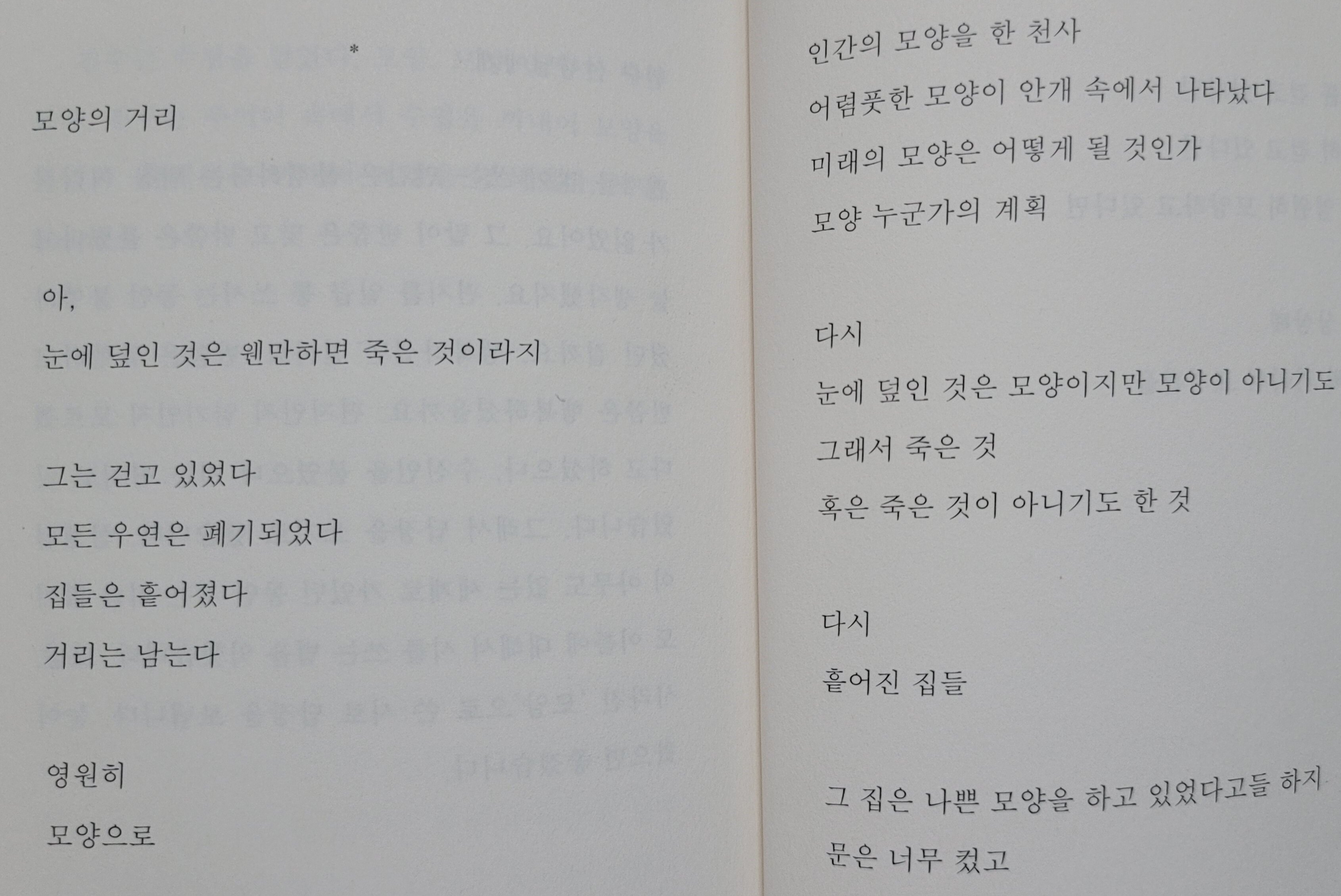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소설은 마지막에 한 편의 시로 남는다.
모양의 거리
아,
눈에 덮인 것은 웬만하면 죽은 것이라지
그는 걷고 있었다
모든 우연은 폐지되었다
집들은 흩어졌다
거리는 남는다
(중략)
실은
그는 당신이고
거리를 걷고 있다면
영원히 걷고 있다면
혹은 영원히 모양하고 있다면
나는 상상해
모양의 거리의 표지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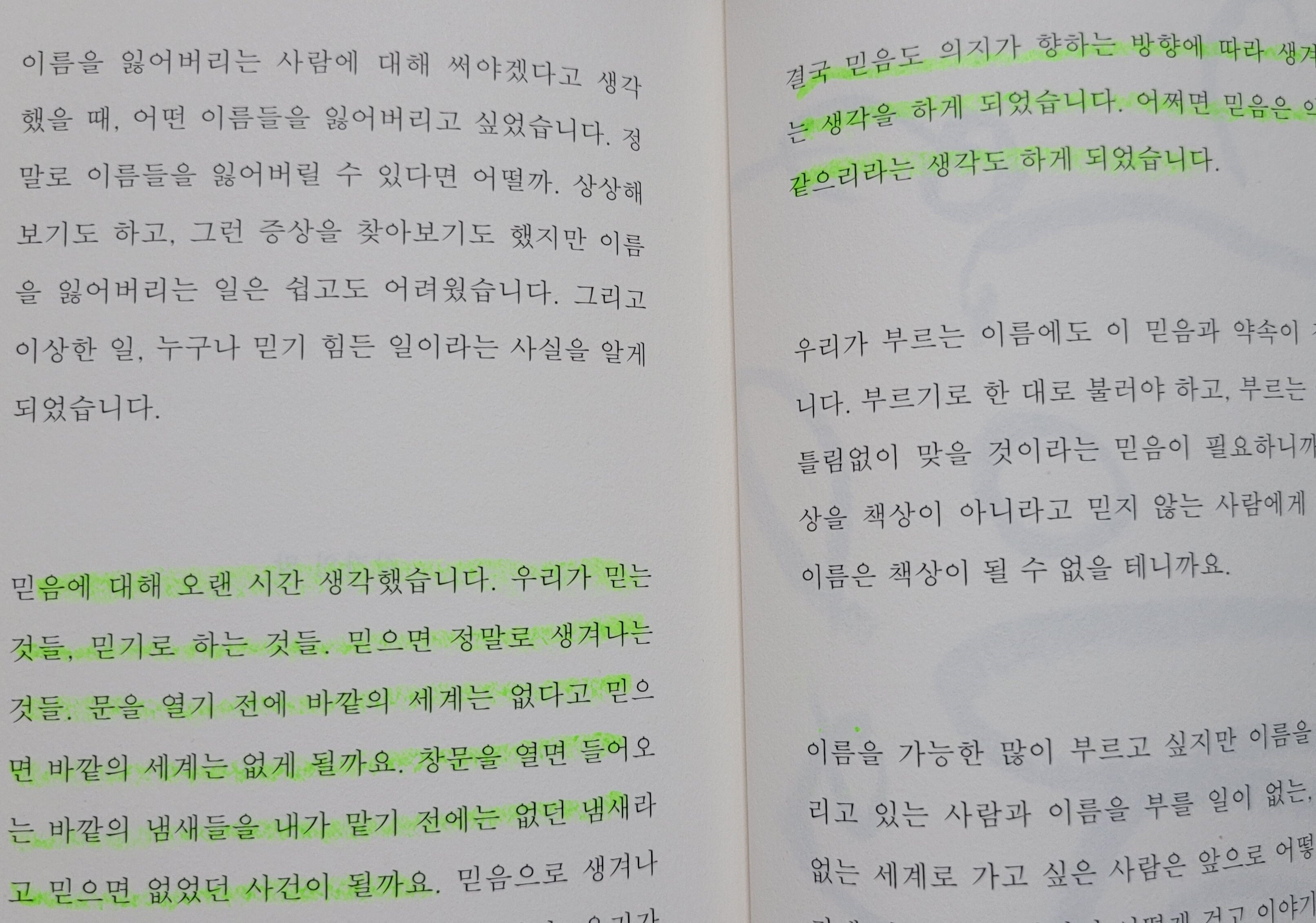
저자는 「작가의 말」을 통해 소설 이해의 단초를 제공하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이름을 잃어버리는 사람에 대해 써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이름들을 잃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이름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기도 하고, 그런 증상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이름을 잃어버리는 일은 쉽고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 누구나 믿기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자는 이어 "믿음에 대해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 믿기로 하는 것들. 믿으면 정말로 생겨나는 것들. 문을 열기 전에 바깥의 세계는 없다고 믿으면 바깥의 세계는 없게 될까요.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바깥의 냄세들을 내가 맡기 전에는 없던 냄새라고 믿으면 없었던 사건이 될까요. 믿음으로 생겨나는 세계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대부분 믿을 법한 것인가요. 혹은 우리가 이미 믿기로 했기 땜누에 믿을 법한 것이 된 걸까요."
결국 저자는 믿음도 의지가 향하는 방향에 따라 생겨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어쩌면 믿음은 약속과 같으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자 : 정다정
세 권의 책을 썼습니다. 모래알이 모이면 사막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모래알의 몫을 잘 해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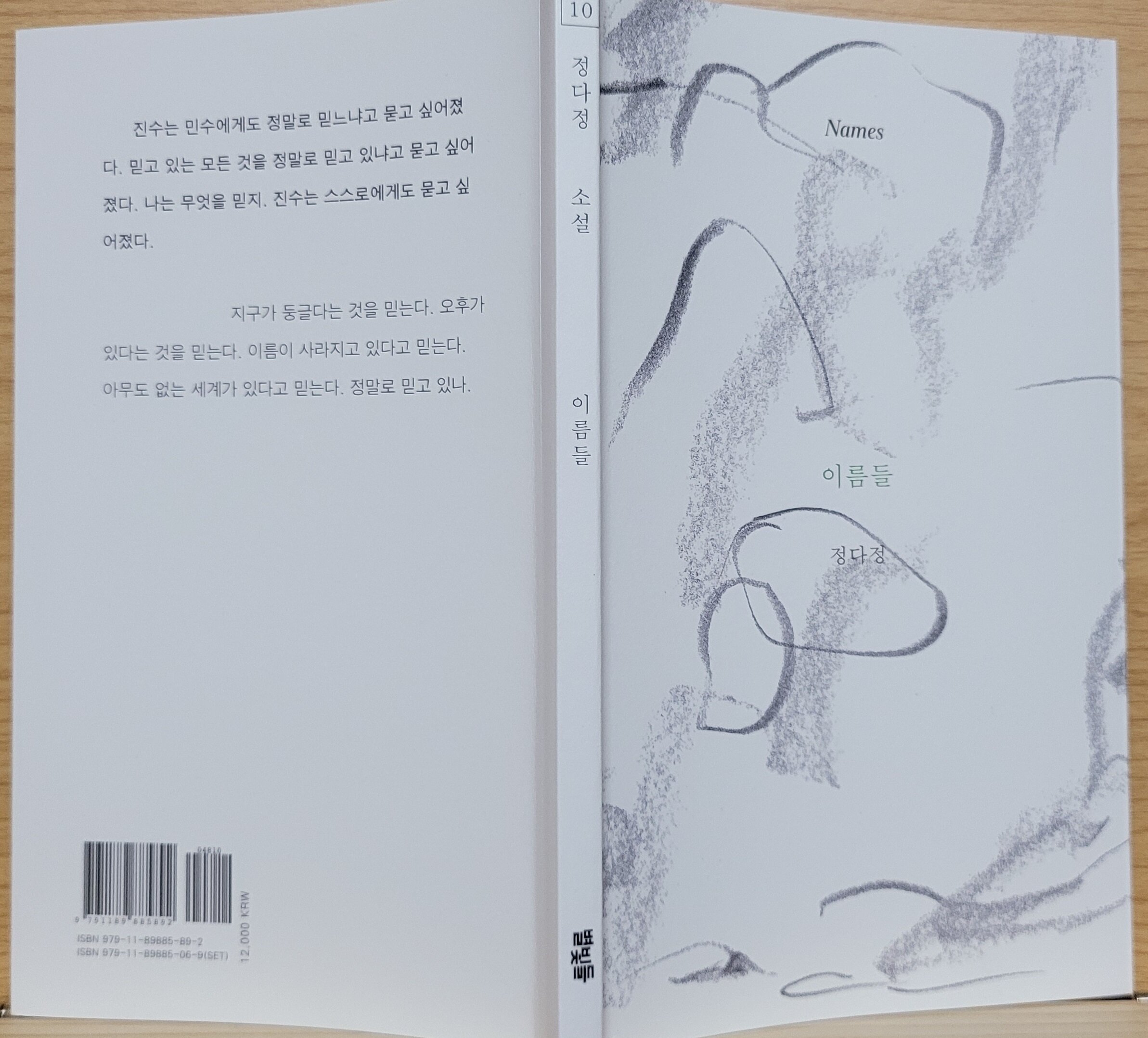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