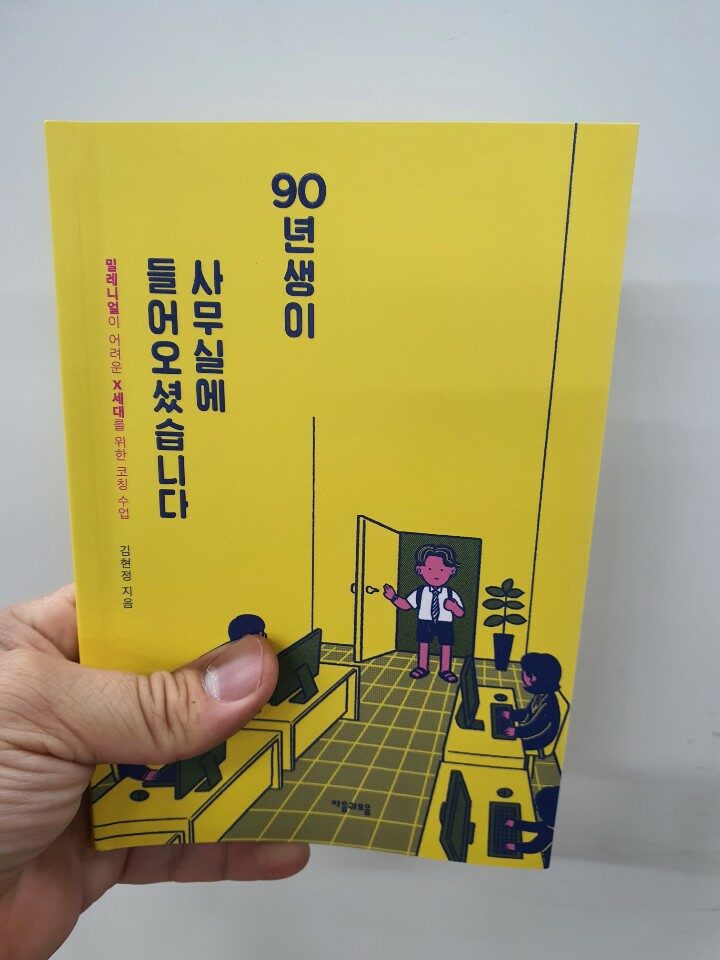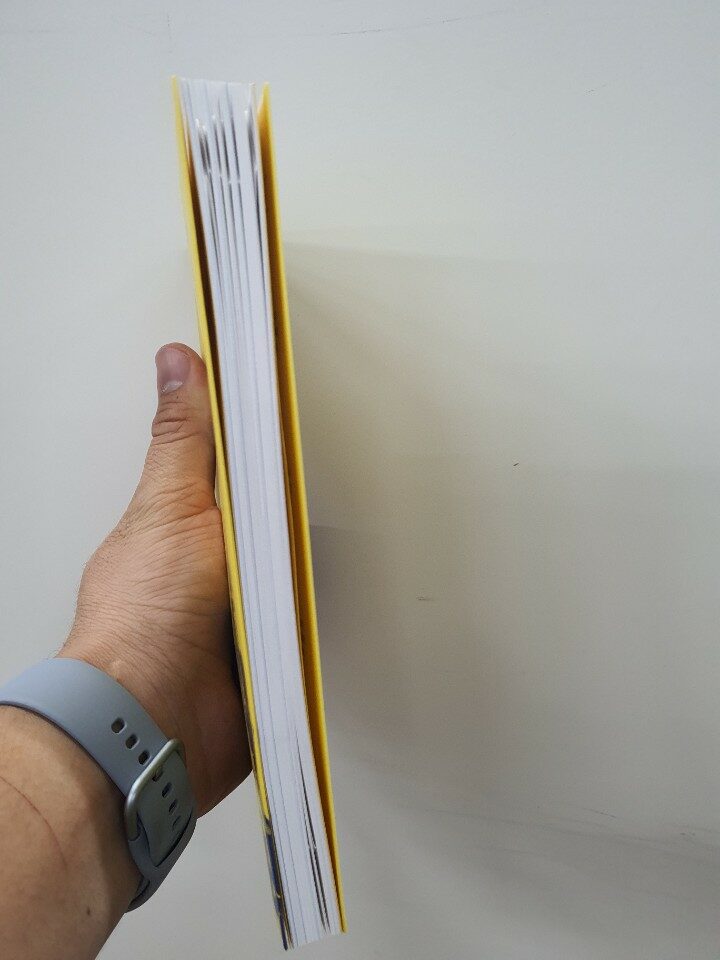책 제목이 낯익다. 어쩐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드는 제목이다. 나와 같은 생각을 했다면, 아마 책을 좋아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책은 김현정 작가 님의 글이다. 가볍고 앏다. 160쪽 정도 되는 콤팩트한 사이즈이 책이다. 이 책을 읽는데는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이 책이 그토록 낯익은 이유는 임홍택 작가 님의 책인 "90년생이 온다"와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언급이 없지만, 책 내용도 비슷하다. 아마 일정 부분을 오마주하지 않았을까 싶다. 임홍택 작가 님의 글이 나온지 2년 가까이 되어간다. 그의 글은 초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다. 작년 8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그 만큼 세대에 대한 이해가 절실한 사회가 도래했다. 아마도 그런 초베스트셀러를 오마주 한 이 책은, 앞 책의 요약과도 같다.
회사에서 부장급 이상 직책을 갖고 있다면, 본인의 개인 업무보다는 '사람 관리 능력'이 더 중요해 지기 마련이다. 그런 이들은 부하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본인의 능력을 극대화 시키는 일인지도 모른다. 농업회사던 제조업이던, 제약회사던, 무역회사던, 햄버거를 만들어 파는 회사건, 모든 회사는 일정 규모가 지나면 모두 '사람 관리'와 '돈 관리' 두 가지만 남는다. 나머지는 회사 내부의 말단 직원들의 실무 능력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
때문에 농업을 잘한다고 농업회사의 최고자리에 오른다거나 제품 조립을 잘한다고 제조회사의 최고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그 분야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저 일 잘하는 직원으로 남는다. 하지만 그 이상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관리'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이유로 애플의 창업가 스티브 잡스의 전공은 IT가 아니라 철학이었고, 페이스북의 창설자 마크 저커버그의 전공은 심리학과였다. 또한 디즈니 전 CEO인 마이클 아이스너는 희곡을 전공 했으며, 알리바바의 마윈 전 회장은 사람을 가르키는 사범대 출신이다. 스타벅스 회장인 하워드 슐츠 또한 커뮤니케이션고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은 철학과 법학을 전공했다.
우리는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이 자동차 업계 최고가 되고, 햄버거를 잘 아는 사람은 햄버거 업계 최고가 되고, IT를 잘 아는 사람이 IT업계 최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정 규모와 직급으로 올라가면 그 것들은 더 이상 메리트 있는 능력이 아니다. 모든 조직의 꼭대기에는 사람을 이해하려는 '이타능력'이 '능력'이 된다.
실제로 스티브 이스터브룩은 맥도날드 CEO였지만 요리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다. 그는 크리켓 선수로 활약하며 조직관리와 운영을 배웠을 것이다. 세상은 하워드 슐츠가 운영하는 회사의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신다. 하지만 그는 커피에 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는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다.
간단하게 따져보자면 스타벅스는 커피집이고 맥도날드는 햄버거 파는 집이고 월마트는 1000원 샵일 뿐이다. 모든 조직은 말단에서 그 회사의 가치관이 정해지지만, 피라미드 정점에서 사람관리만 남는다. 덕분에 스티브잡스는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를 창업하고도 픽사 최고 경영자(CEO) 자리도 올랐다. 이렇듯 그 회사가 제조사던 제약회사던 상관없이 CEO들은 자유롭게 경영권을 가지고 사람을 운영한다. 우리나라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도 '제약'과는 전혀 무관하지 않은가.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는 일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능력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능력에만 집착하느라, 내 밑에 사람에게 온갖 궂인 일을 시키고, 그들을 이해하려하지 않거나, 혼자만 빛이 나겠다는 생각은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공감' 능력은 몹시 중요하다. 그런 이유로 세계의 리더들은 모두 공감 능력을 갖기 위해 전공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90년 생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에 90년생이 섞여 있다면, 그리고 임홍택 작가 님의 '90년 생이 온다' 혹은 이 책인 '90년생이 사무실에 들어오셨습니다'를 읽었다면, 어쩌면 당신의 전공 분야에서 최고직원이 되는 일보다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데 더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전세계가 문을 닫고 있던 시기에는 국가마다 차이가 극명했다. 가령, 80년 대나 90년 대 처럼 외국 기업을 벤치 마킹해야 하거나 각 거래 업체가 해외인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은~' 혹은 '일본 사람들은~' 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았다. 내가 어린 시절만해도 "일본 사람들은 XX라는 문화가 있어" 혹은 "미국 사람들은 XX한 성향이 있어"의 말을 자주 듣곤 했다. 자주 부딪치게 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존의 필수 전략이던 시대에서,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물건을 사달라고 굽신 거릴 필요도 없어졌고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고개 숙일 필요도 없어졌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외에 맞춰가던 시기는 어느새 지나가고, 그들이 한국의 문화를 궁금해 하기 시작한 시대가 왔다. 그런 위치에서 공감해야할 대상은 외부가 아닌 내부로 바뀐 것이다. 어쩌면 세대의 위와 아래의 격차가 국가 간의 양 옆의 격차보다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다. 한국이라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문화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윗 세대와 아랫세대는 전혀 다른 문화권을 갖고 있다.
부장님의 어린 시절은 음악을 테이프로 들었다. 그 밑에 과장은 MP3로 들었고 신입사원들은 스트리밍을 통해 듣는다. 같은 나이에 전혀 다른 공감대를 갖고 살았다. 같은 90년생들은 미국인이건, 일본인이건, 영국인이건을 막론하고 BTS에 열광하고 언어는 다르지만 서로 같은 정서를 나누며 교감한다. 하지만 같은 문화권이라는 착각에 빠진 윗세대들은 전혀 전세계와 통하는 90년대의 문화에 공감하지 못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정답으로 규정하고 하위세대들이 어긋나가고 있다라고만 판단한다. 전세계 90년생이라는 커다란 시장을 뒤로하고, 자신이 살아온 '예전 한국인들은...'에 빠져 있다.
지금은 공감 능력만 있다면, 음악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 같은 문화권'의 세대의 시장을 얻어갈 수 있다. 굳이 5000만 좁은 땅덩이에서 윗 세대의 정서만 받아들이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할 필요는 없다. 그것을 강요한다면 우리 90년생들은 전세계가 BTS에 열광하고 그 시장이 열렸을 때, 세계에서 고립된 세대가 될 수도 있다. 고립된 자들이 넓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세대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좁아터진 세계로 들어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쩌면 '선임자의 충고'라기보다 민폐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