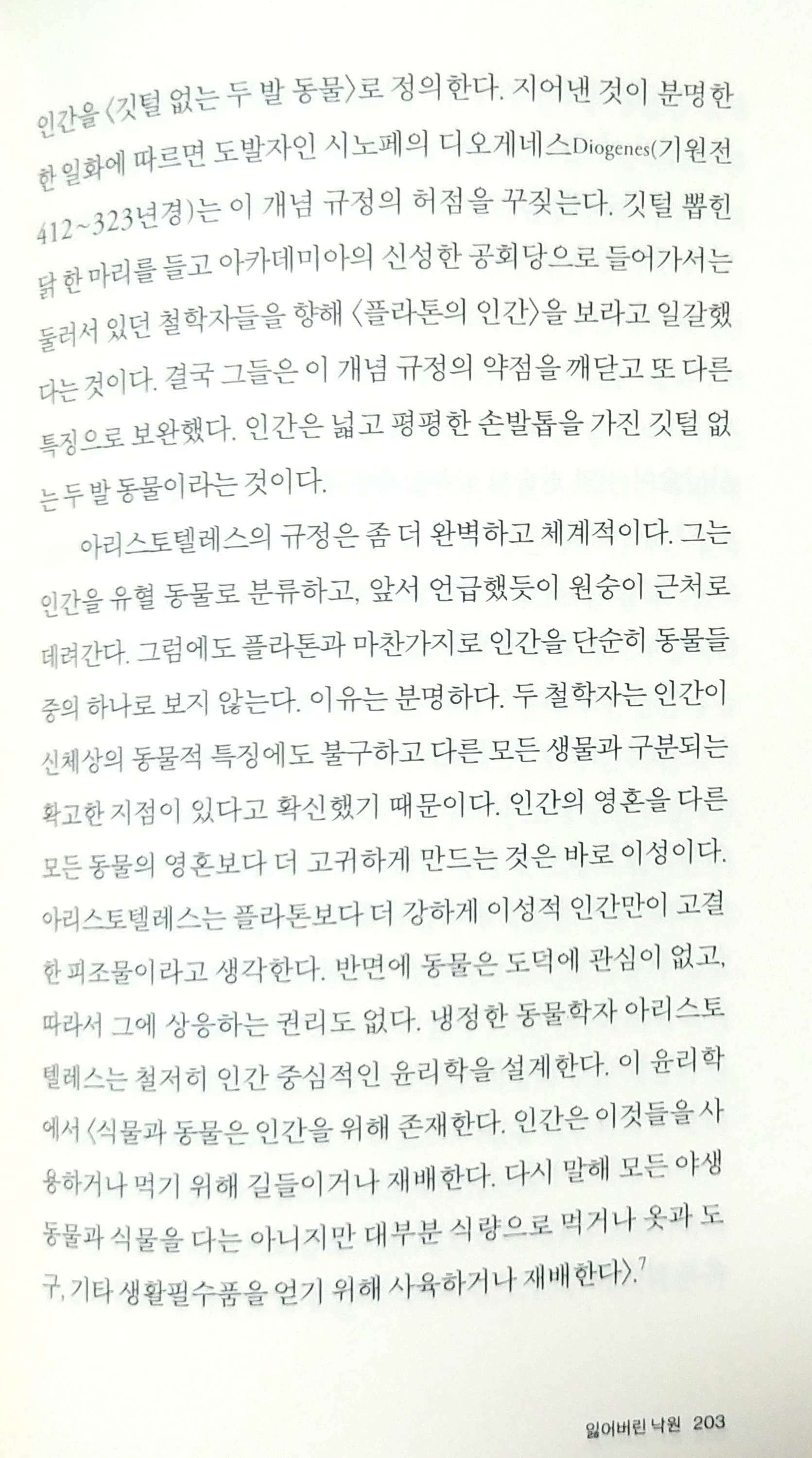-

-
동물은 생각한다 - 인간은 동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지음, 박종대 옮김 / 열린책들 / 2025년 12월
평점 :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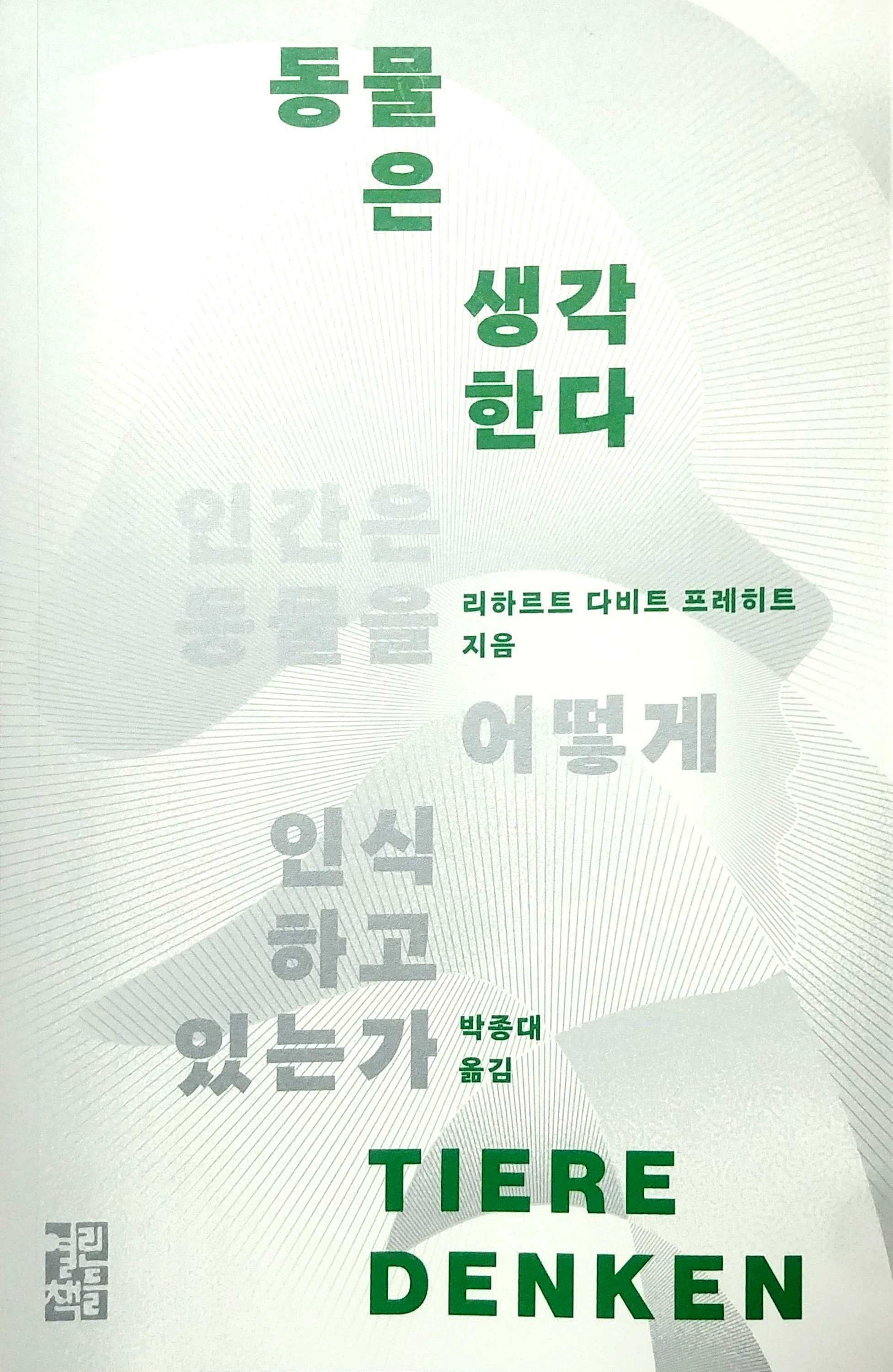
동물을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이 커졌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육과 도축을 묵인한다. 동물의 내면이나 고통보다는 고기를 먹음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이나 만족이 더 크므로, 인간은 여전히 고기를 소비한다.
동물들은 인간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생각한 적이 있을까?
우리는 흔히 인간이 이성적이고 똑똑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 그건 다 착각이지 싶었다. 사실 인간을 움직이는 건 차가운 머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을 봤을 때 울컥하는 뜨거운 마음이라 생각한다. 동물이 인간을 어떻게 볼까 생각해보면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동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가족처럼 아끼다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먹어치우는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공포, 그 자체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개고기를 먹는 사람의 수요가 줄었다지만, 과거 10년 전까지만 해도 보양식이라 해서 많이 소비되었었다.
특히 책에서는 마취된 채 다리 하나가 잘린 노루의 고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노루를 죽이지 않고 마취해서 다리 하나만 잘라 먹으라면 먹겠냐? 다들 징그럽다며 거부한다. 정작 도축장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에는 눈을 감으면서도, 결국 동물 윤리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묻는 문제 같다. 보이지 않는 곳의 잔인함에는 무감각하면서 눈앞의 고통에는 몸서리치는 우리의 이중적인 자태를 꼬집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저자는 동물의 내면을 다 안다는 오만을 버리자는 <무지의 윤리학>을 통해, 그들이 인간처럼 생각하느냐보다 <느끼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이 책의 일부는 그런 심리적 부분과 철학적인 사유를 더하고 있다.
한 편으로는 "반드시 죽여야할 이유가 없다면 비폭력으로 대한다"는 최소한의 규칙부터 지킬 것을 제안한다.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미로 낚시를 하거나 사냥을 하는 것
모피 옷을 입기 위해 동물을 희생시키는 것
단순히 징그럽다는 이유로 벌레를 밟아 죽이는 것
이런 행동들은 정말 반드시 죽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다. 저자의 제안은 인간이 대단한 성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아무 이유 없이, 혹은 사소한 욕심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하지는 말자는 상식적인 선을 긋고 있다.
그래서 이 규칙이 죄책감보다는 책임감을 갖게 만드는 영리한 접근이라는 느낌이 든다. 인간은 완벽할 수는 없더라도, 불필요한 폭력만큼은 걷어낼 수 있다.
인간은 개나 고양이는 가족처럼 아끼면서, 지능이 더 높은 돼지나 문어가 잔인하게 죽어가는 건 못 본 척한다. 프레히트는 <우리가 직접 죽이는 장면을 눈으로 보고도 먹을 수 있는 동물만 먹자>라고 말한다. 그 직관만 따라도 세상은 이미 변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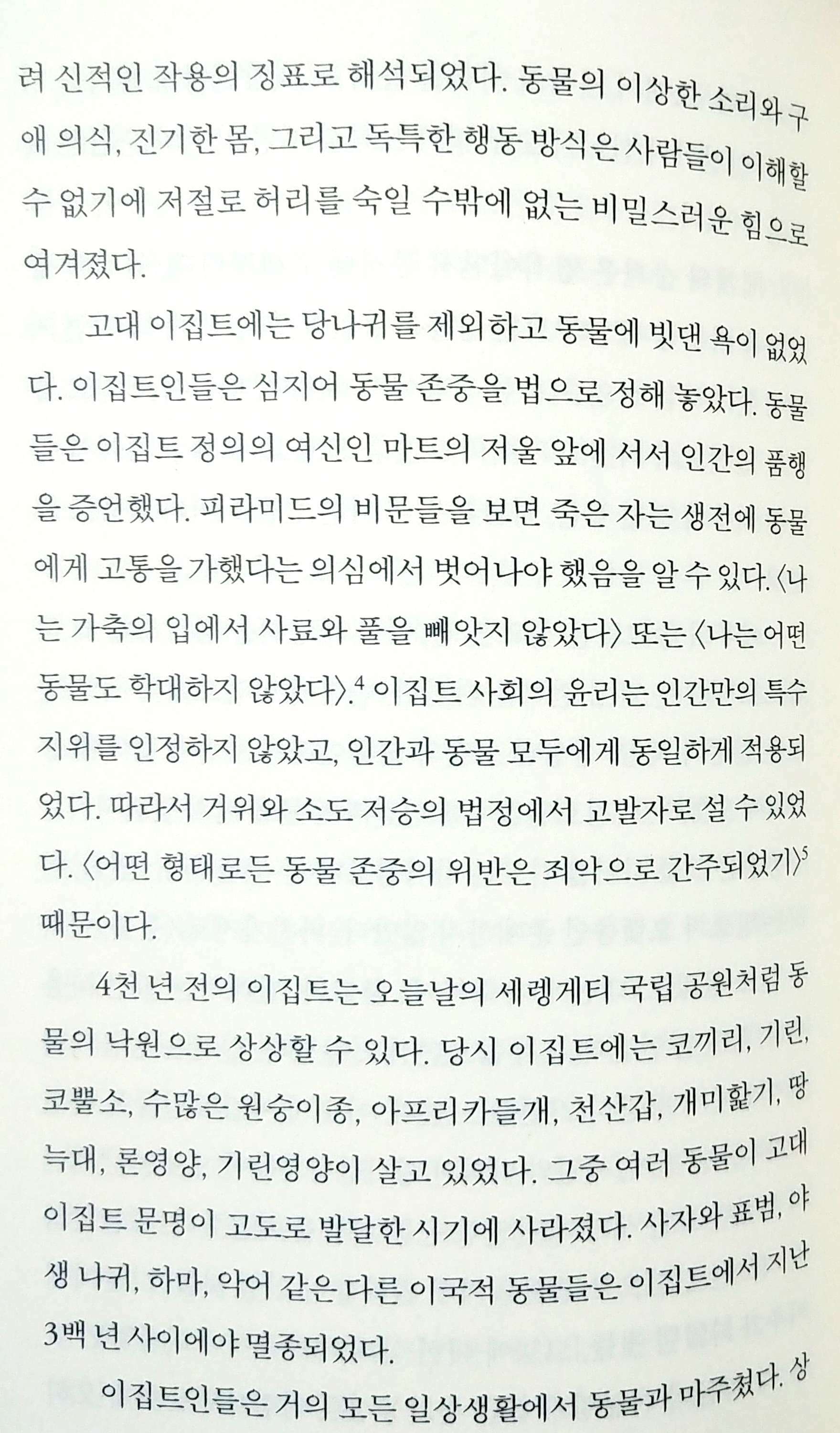
많은 철학자는 인간이 완벽한 이성을 발휘해서, 논리적인 설명만 들으면 당장 행동을 바꿀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평소처럼 <남들이 하는 대로> 흘러가듯 살아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동물을 존중하는 일은 (오히려 동물의 살생을 막을 방법으로) 결국 인간에게 손해가 그대로 돌아온다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부 알 수는 없어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해하려 했을때, 나에게 돌아오는 금전, 인적 손해를 본다면, 생각자체는 물론 행동자체도 바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서, 동물의 눈에 비친 인간은 어쩌면 신처럼 전능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을 가장 공포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포식자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 도축 당하기 위해 길러지는 동물들, 그 시선을 상상하는 순간,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또 느끼게 된다. 동물도 나와 똑같이 누군가를 지켜보고 느끼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작가는 완벽한 성자가 되기보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행동을 실천하자는 볼프의 <개선주의>적 시선을 말하기도 한다. 비건이 아니라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억지로 고기 먹는 것을 합리화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한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아주 작은 행동부터 하나씩 바꿔가며 내 마음과 행동의 박자를 맞춰보는 것이 중요하다. (작가는 철학자의 내면에서 동물을 바라보기 때문일까. 철학적 사유가 책에 많이 보인다.) 그래서 채식과 동물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현실적인 실천으로 바꾸어 놓는다. [동물은 생각한다. 인간은 동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동물을 보호하자는 주장을 넘어, 보이지 않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인간다운 존엄성의 시작임을 말해준다.
작가 히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가 철학적으로 말하는 동물이야기는 엄청 방대해서 한번에 읽기 쉽지 않다. 철학에 맞춘 그의 말은 학술 용어가 많기 때문인데, "분석철학", "심리논리적" 같은 단어 때문에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다.하지만 딱딱한 학술적 단어 속에 담긴 메시지는 의외로 선명하다. 그것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의식을 가진 주체로 인정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완성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