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열 높은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여 제 몫을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오래전에는 자기 색깔이 없는 그저 그런 일을 할 수 없이 해낼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그런 일자리도 많지 않은 시절이니 어느 것이 더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자기색을 분명히 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는 11명의 여자들 이야기는
전투신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생동감이 느껴진다.
일단 표지부터가 눈물겹다. 흔히 먼길을
나서기 위해 신발끈을 다져 묶는 장명이 등장하는데
여자들은 브래지어 끈부터 질끈 매고 본다. 저 브래지어는 몸의
자유를 구속하는 억압처럼
느껴지지만 덜렁덜렁 맨 가슴으로 일터로 나서지 못하는 여성들의 신발끈처럼 비장하게
다가온다.
그래서일까 많은 여자들이 집안에서는 노브라로 자유를 만끽한다. 나부터
말이다.
건강상으로 좋지 않다고 하기도 하고 얼마전 방영된 드라마에서는 불편한 브래지어때문에
노브라를 선호하는 여성이 남성동료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장면이 등장했다.
아니 브래지어를
하지 않으면 일에 지장을 주나? 하긴 응큼한 남자들이라면 흘끔거리느라
그러기도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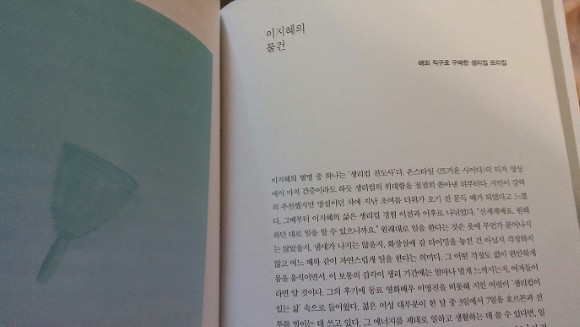
브래지어의 자유와 더불어 생리대의 자유를 외치는 이지혜의 목소리도 귀 기울였으면
한다.
너무 오랫동안 한 달에 일주일 이상 호르몬의 채찍에 시달렸던 여성이라면 그녀의
전도에
넘어가도 좋지 않을까.
문학계의 거장인 여성작가는 자신의 첫걸음이 눈밭에 찍힌 발걸음처럼 조심스러웠다고
고백했다.
누군가 자신의 발자욱을 따라 올 것이므로 발을 떼어 놓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백은하 기자의 고백은 울림처럼 다가온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독고다이로 가야했던 시간들. 영화기자라는 여자로서는 많지 않은 직업을
선택한 순간 그녀의 고독한 발자국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