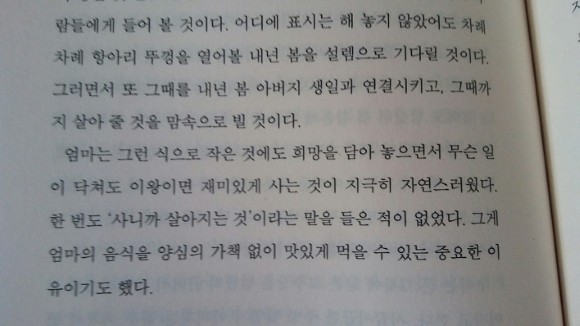환갑의 나이에 노모가 차려주는 밥상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첫번 째 일
것이고
더구나 오랜 내공이 깃든 범상치 않은 맛으로 차려진 밥상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고장날대로 고장나버린 몸뚱아리를 힘들게 일으켜세워 죽어가는 남편에게 생명의
줄을
더 붙잡게 하고 입맛 까다로운 자식이며 친척, 지인들까지 챙기는 주인공
어머니는
프랑스의 여전사 '잔다르크'를 떠올리게 한다.
오랜 숙적이었던 이웃나라를 향해
어린 몸을 이끌고 전장으로 향했던 잔다르크처럼
죽어가는 남편을 등뒤에 세우고 사신(死神)과 맞서고 흐려지는 정신을
똑바로 일으켜세우면서
여전히 손주들 생일까지 기억해내는 전투력에 텃밭을 진두지휘하며 밥상이라는
전선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모습이 바로 여전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