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23살 이었을때 난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바로 그 때일 거란걸 알았다.
그보다 더 젊을수도 더 아름다울수도 더 날씬할수도 더 자신감이 충만할 수도 없으리란 것을 말이다.
아마도 그 짧은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읽었던 수많은 책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다소 시크하면서도 시니컬한 자신감 같은 것들은 책을 많이 읽어 허접한 정보까지도 너무 많이
집어 넣은 결과였던 것 같다.
암튼 그 시절 최루탄이 남발하던 교정을 지나오는 시간을 건너 오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책이었다.
특별히 시보다는 소설쪽이나 인문학쪽을 선호했는데 시는 학생시절 교과서에 실린 정도의 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권의 긴 소설보다도 몇 줄의 싯귀가 주는 어마어마한 충격과 감동의 맛을 알고야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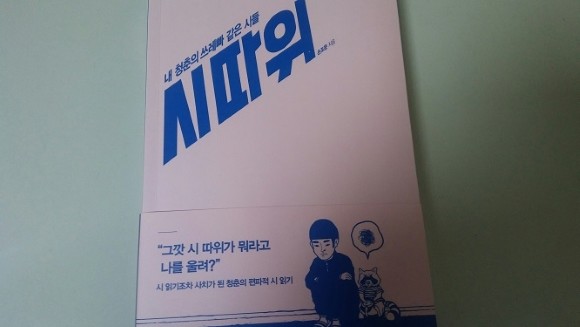
호흡이 긴 소설이야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그저 몇줄에 불과한 싯귀마저도 나같은 평범이하인 사람에게는 수학공식처럼 어려웠다. 아 이정도는
나도 쓸 수 있는데...하고 보면 이미 누군가 지어놓은 귀절들이었고 '시따위야..'하는 자만을 품곤 했다.
세월을 고단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흔히 내 인생을 책을 쓰면 몇권은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시집이라면 몇권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인생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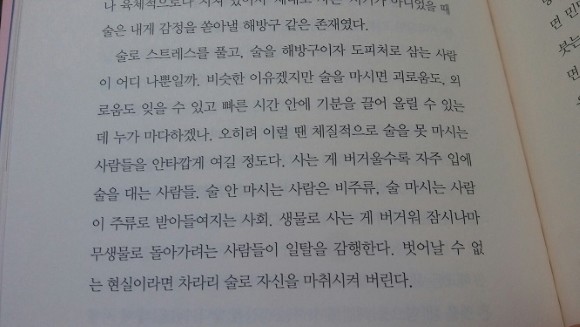
베이비붐세대의 일원으로 배고프고 지단한 세월을 지나온 나로서는 풍요롭다는 이 시대에 배고픈 청춘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영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
허리띠 졸라매고 기껏 키워놨더니 백수라니...일자리가 없는 건지 의지가 없는건지 이 현실이
통탄스러운데.
그들이 바라보는 시는 어떤 느낌일까. 어린 시절 읽었던 책중에 '술 권하는 사회'라고 있었는데 당시 암울했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한 작품이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넘친다고 믿어지는 시대에도 '술 권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놀랍다.

서른 전이면 의례 결혼은 당연지사였던 내또래들에게 지금의 서른들은 참으로 비려보인다.
결혼을 한다면 아직 어린 것 아냐? 싶을 정도로 우리와는 다른 서른을 보내는 것 처럼 보인다.
그들이 어린시절 그렸던 서른은 어린애의 티를 벗고 제법 어른 흉내는 내는 시간이 될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대의 서른은 여전히 들어갈 자리조차 없는 미숙한 시간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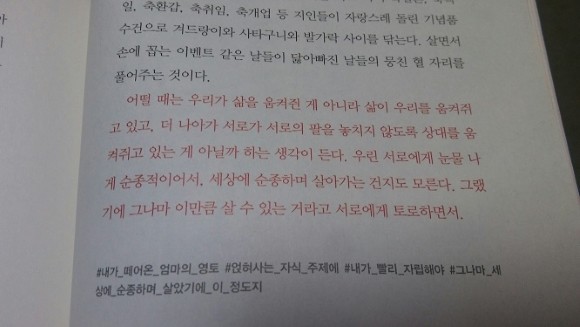
그런 그들에게 손위에 얹혀진 스마트폰 말고 시란게 들어오기는 할까 싶어지는데 이 책의 저자는 그래도 어린시절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인지 인용한 시들이 제법 비장하다.
젊음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거나 사랑찬가가 아닌 삶의 지긋지긋한 일상이나 암담한 미래같은 것들이 느껴진다.
그래서 시란게 그냥 눈으로만 읽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루 밥을 벌기 위해 시장통에서 소리지르는 장사치의 노래처럼 비장하고 파도를 넘어 고기를 잡으로 떠나는 어부들처럼 서글픈 것이 바로
'詩"임을 청춘들은 벌써 알아버렸다.
그래서 지켜보는 중년들은 가슴아프다. 시를 보고 울먹거리는 젊은이들을 보면 같이 울고 싶어진다.
차라리 '시란게 뭔데'하면서 생뚱맞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철없는 젊음이 낫지 않을까.
그마저도 사치인지라 조심스럽다는 청춘들에게 위로의 글을 보낸다.
'그래도 견뎌라 영원한 파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