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 요코가 살다간 시간들은 그녀의 조국 일본이 고단했던 것처럼 온 국민들이 힘들었던
시대였던 것같다. 물론 일본인 특유의 기질을 살려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그 시간들이
짧아지긴 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결코 그 시간을 지우지 못했다.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을 받았든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물론이고 당사국인 일본사람들도 결코 행복하지 않은 시간들이었다. 글쎄 패배하지 않고 승승장구 했더라면 행복했으려나.
사노 요코는 그런 조국을 그런 시간을 살아온 것은 결코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항변한다.
누구든 선택해서 태어나는 이는 없으니까. 더불어 그녀가 그토록 원망했던 부모마저도.
어려서 죽은 아버지에 대한 느낌은 그리움보다는 아쉬움이었고 아흔 넘어 치매를 앓는 엄마와는 내내 원망과 슬픔같은 것들이었다. 치매를 앓아 어린애가 되어버린 후에야 겨우 화해 비슷한 걸 해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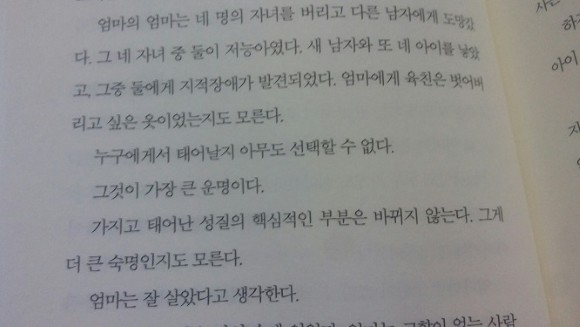
'누구에게서 태어날지 아무도 선택할 수 없다. 그것이 가장 큰 운명이다.'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엄마를 미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했던 사노 역시 평탄한 삶을 살진 못했다.
두번의 결혼과 두번의 이혼, 이건 선택이었을까 운명이었을까.
다행이랄까. 그녀에게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재능이 있어 그나마 고단한 시간을 견뎌냈는지 모른다.
책을 읽는 내내, 활자중독이다 시피 했던 시간들이 너무 무의미 했다고 탄식하는 장면이 마음에 걸렸다.
나역시 어린시절부터 독서에 바친 시간이 너무도 컸기에 그녀의 허무하다는 탄식이 가슴 아프다.
특히 그녀가 작가이기에 그런 탄식은 너무도 뼈아프다. 자신이 읽어낸 책에서 건져낸 것이라곤 없는 것같은 삶을 살았다는 자괴감같은 것이 아닐까.
흔히 우리는 책을 많은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기대가 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는 그런 것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보니 알량한 삶이 부끄러워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른다.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얼핏 개구쟁이처럼 보이는 그녀의 맑은 얼굴에 이런 어둠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솔직한 일상과 마음의 이야기들을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것이 너무 아쉽다. 100세 시대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것 같아.
다소 차가운 듯한 그리고 어리숙하게도 보였던 삶들을 끝내고 떠난 그곳에서 그녀는 또 어떤 삶과 만나게 될까. 전쟁도 없고 패전한 조국도 없고 지리멸멸한 결혼도 없는 시간에서 부디 행복해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