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이해하는데 책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결국 누군가의 기록으로 우리는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느껴야하기 때문이다. 아예 역사책이란 이름으로 기록된 책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시대를 대변하는 책들에게 더 리얼한 시대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인간들은 아주 묘한 동물인지라 '하라'는 말보다 '하지말라'는 말에 더 호기심을 느끼고 달려들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역시 그런점에서 '읽어보라'는 책보다는 '절대 읽지 마라'는 책에 더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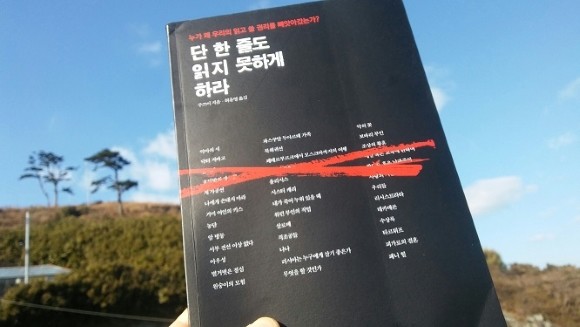
유독 그 당시에 '금서'라고 지정되었던 책들에는 오히려 시대상이 더 많이 반영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서'라는 주홍글씨를 붙힌 책들은 당시에 권력을 휘두르던 계급들의 두려움과 시기심들이 녹아있기 마련이다.
중세에는 종교가들이 그러했고 뒤를 이어 계급의 꼭대기층에 있는 권력자들이 그러했다.
자신들의 치부를 마구 써내려갔던 작가들을 죽이거나 탄압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물론 그들의 책들은 '금서'라는 멍에를 안고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역설적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겅우가 더 많았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바로 '금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떼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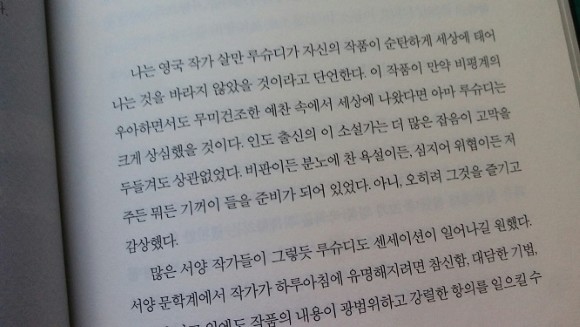
'악마의 시'를 써서 이슬람의 원흉이라 낙인찍혔던 루슈디 역시 도망자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이란은 그에게 현상금을 붙여 수배를 내렸고 루슈디는 숨어살면서 두번이나 이혼을 당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악마의 시'를 쓴 것에 대해 후회는 없었을까.
대부분의 '금서'를 지은 작가들은 자신들이 이런 운명에 처해질 것을 알았던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운명같은 열정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이런 용기와 열정 덕분에 우리는 '금서'의 비밀을 열고 그 시대의 실랄한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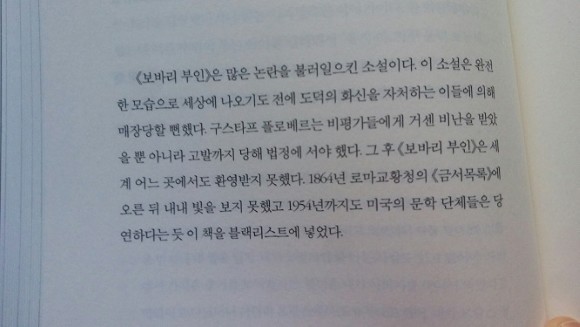
물론 흥행을 위해 세상밖으로 끄집어내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러운 권력자들에 의해 단죄를 당했던 '금서'들은 지하에서 혹은 세월이
흘러 더 빛나는 평가를 받았다.
'금서'들 중 유독 셩(性)에 관한 책들이 많았던 이유는 인간의 본성에 근접한 표현들이 외설스럽다는 이유말고도 당시 은밀하지만 은밀할 수
없었던 타락한 사회상을 기록한다는 것이 너무도 부끄러웠던 이유가 더했을 것이다.
'금서'로 낙인 찍은 인물들이 그 책의 주인공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바리 부인','체털리 부인의 연인', '위런 부인의 직업', '악의 꽃' 같은 작품들은 당시의 사회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신사복으로 위장된 타락한 모습속에 리얼한 도덕성을 후대에 남긴다는 것은 치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주홍글씨'를 새겨
매장시키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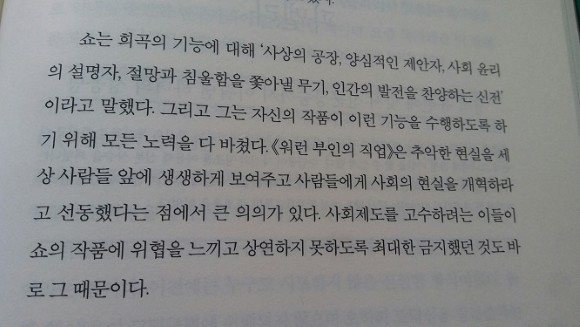
자신의 독특한 비문으로 더 유명한 버나드 쇼 역시 '워런 부인의 직업'을 통해 추악한 현실을 고발했다.
단순히 자극적인 섹스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이미 타락하고 길들여진 관능에 굴복한 인간의 모습에서 개혁의 의지를 일으켜보려는 노력. 바로 그것이 이런 작품을 쓸 수밖에 없었던 작가들의 진심이 아닐까.
그나마 현대에는 이런 억압없이 수많은 작품들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억압당하는 수많은 작가들과 빛을 보지 못하는 작품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무지와 몽매는 색만 달리할 뿐 내림처럼 유전되는 현실이 가슴아플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서'의 봉인을 해제하고 읽어내야 한다. 감추고 싶었던 인간의 역사를 똑바로 쳐다봐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