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바로 여행작가이다. 고급스러운 여행이 아닌 배낭하나
짊어지고 현지인들의 깊숙한 삶을 제대로 느끼고 글로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밥벌이까지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방랑식객이 아닐까.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사회적 압박도 없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억지로 밥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보다 분명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대만사람인 저자는 여자의 몸으로 세계를 누비면서 사람과 음식이야기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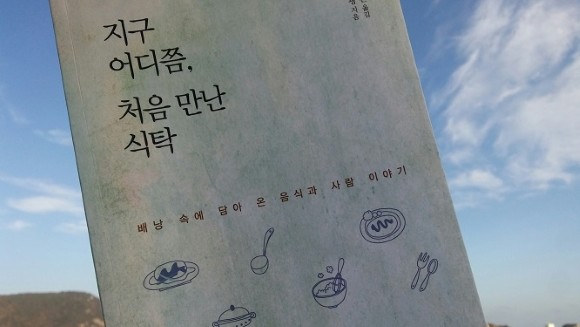
그녀가 만난 세상의 사람들과 음식은 미슐렝의 호화음식도 아니고 멋진 펜션에서 만난 잘 나가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시리아의 국경과 가까운 터키의 작은마을에서 만난 멋진 요리사 자나와 그가 돌보고 있는 라이페이와 아이신은 터키의 무지한 관습에 희생된 피해자들이었다. 이슬람의 가장 큰 축제인 이드 알 아드하를 앞두고 전통주인 리키에 취해가며 들려준 과거 이야기는 믿고 싶지 않을만큼 끔찍했다.
이슬람의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가족간에 명예살인이 일어난다는 뉴스를 접하긴 했지만 온몸을 가리고 어른들이 정해주는 사람과 억지결혼을 해야했던 라이페이는 사촌오빠에게 강간당한 후 임신을 하게되고 정조를 지키지 못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살인을 하는 가족들을 피해 도망을 친다.
자신을 대신하여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될 여동생 아이신과 함께였다.
사촌오빠 무스타파는 이슬람에서 죄악시하는 동성애자로 동성애자인 자나와 행복한 삶을 꿈꾸었지만 친동생에게 살해되었고 살인자는 결국 사형에 처해졌다. 그런 아픔을 지닌 이들에게 리키란 술은 치유제와 같았다.
저자는 묻는다. 과연 종교란 무엇인가, 신이 인간에게 어떤 삶을 원했기에 신의 이름을 빗대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정말로 참혹한 삶들이 세계곳처에 널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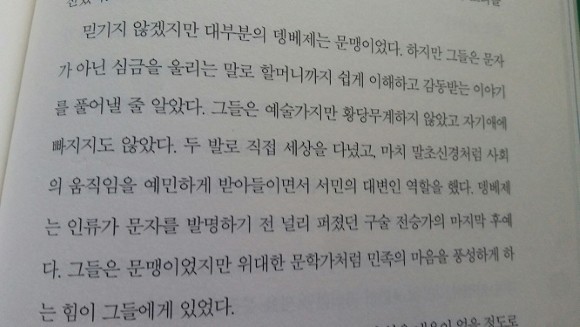
중동과 터키인근 곳곳에 흩어져 사는 쿠르드족은 오래전 유랑을 했던 유대인의 삶을 닮았다.
다만 다르다면 유대인이 향했던 곳은 너무나 분명했지만 지금 쿠르드족은 자신들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점이었다. 고유의 언어도 점점 잊혀지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슬픈 민족이다.
그들에게는 문맹의 구술학자 뎅베제가 있다. 마치 우리나라의 변사나 판소리의 명창들처럼 노래로 역사를 읆는 사람들.
문자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노래로 역사를 기록했던 그들의 삶은 민족의 쇠락과 함께 저물고 있었다.
그들에게 차란 갈증나는 목을 축이고 저물어가는 삶을 채우는 만나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네팔과 티벳의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차는 생명을 이어주는 젖줄과 같다. 채소가 귀하니
비타민은 늘 부족했다.
야크와 양의 젖과 차를 섞은 버터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다.
저자는 짧은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나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아서 그들의 아픔이
더 짙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만난 사람들은 많아 아팠지만 고통속에서 순수하게 빛난다.
그들이 차린 소박한 식탁에는 오래전부터 각인된 자신들의 조상의 추억과 고향의 기억들이 녹아있었다.
때로는 추억으로 때로는 치유처럼 다가온 음식과 사람이야기에 마음이 숙여해졌다.
다양한 레시피를 기대했던 독자라면 잠시 실망스럽기도 하겠지만 더깊은 울림이 마음을 흔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