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결국 모두 누구를 대리하여 살아간다는 저자의 정의에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우리는 막연하게라도 스스로 주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기에 그의 이런 정의는 조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책을 덮고보니 그의 말이 이해가 되었다.

내가 먹을 것을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고 내가 내어놓은 쓰레기들을 스스로 치우지 못한다.
누군가는 나를 대신하여 새벽부터 밭으로 향할 것이고 누군가는 늦은 저녁까지 내가 내어놓은 쓰레기를 치울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그 누군가들을 위해 뭔가를 하면서 살고 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때로 이런 사실을 망각한 '갑'들의 횡포에 '을'들을 상처받고 사회는 공평성을 잃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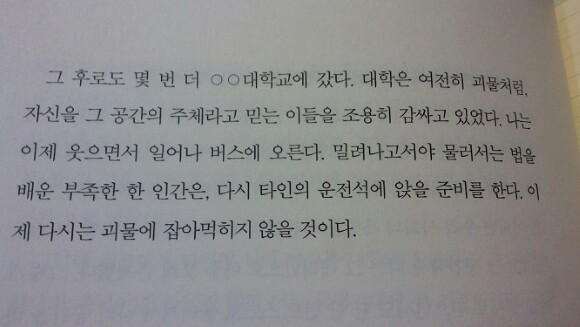
저자는 몇 년 전 '지방시'라는 글을 써서 화제를 일으킨적이 있다고 한다. 나는 읽은 적이 없지만 열악한 지방강사의 어려움을 고발한
책이었던 것 같다. 그의 이력을 찾아보니 '내부고발자'라는 딱지가 떡허니 붙어있다.
1년에 고작 8달을 한 달에 100만원도 못되는 급여를 받으면서 정신노동을 했던 강사가 뛰쳐나와 글을 쓰면 내부고발자가 되는 것일까.
그가 다녔던 학교는 누구나 선망하는 사랑이 주체라는 기독교계열의 학교였다.
과감히 뛰쳐나와 대리운전을 하던 그가 정말 지나치고 싶지 않았던 모교의 학교앞에 서서 느꼈을 자괴감이 그대로 전해진다. 다만 이제 다시는
괴물에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란 다짐에 마구 응원을 보내고 싶어진다.
'밀려나고서야 물러서는 법을 배운....'이라는 저자의 탄식에 거대한 괴물의 실체를 보는 것같아 끔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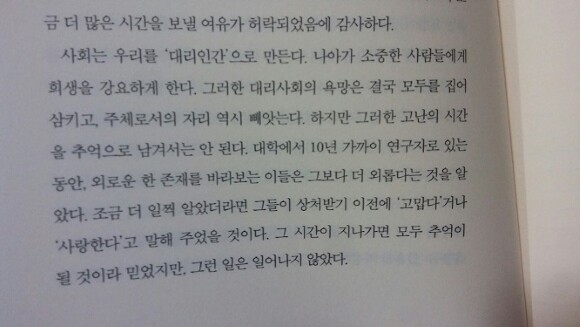
그가 정의한 '대리사회'는 정상적으로만 돌아간다면 거대한 조직의 톱니바퀴처럼 질서정연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한군데가 이가 빠지거나 지체가 되면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거나 주체는 영원히 되찾지 못한 채
'대리인생'으로만 살아가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게 된다.
대학에서 10년 가까이 연구자로 있는 동안 그가 원했던 '교수'자리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지도 모른다. 주체인 '갑'은 수많은
지방강사들을 울타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가 아닌 그들이 지닌 지식만을 알뜰하게 빼먹고 내몰기 위해 수많은 장치들을 해두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어마어마한 등록금을 받은 주체들은 시간강사들의 지식을 아낌없이 갉아내어 제공시키고 4대보험도 재직증명서도 내어주지 않은 채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악덕포주'와 같은 세습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뜨겁고 차가운 길거리로 나선 저자의 대리운전 생활은 고달프기만 하다.
먹물에 익숙했던 그가 핸드폰을 손에 놓치 못한 채 길거리에서 콜을 기다리고 막차마저 끊긴 길거리를 터덜터널 걸어가는 뒷모습이 가슴아프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위해 쓰러져가는 마음을 곧추세우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경멸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고백에 눈시울이 뜨거워온다.
그래도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이를 재우고 남편을 돕기 위해 늦은 밤까지 차를 몰아주는 아내가 있고 그 밤 한푼이라도 벌기 위해 집을 나선 엄마 아빠를 위해 깨지 않고 단잠을 자주는 딸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를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늘 편하게 부르던 대리기사들의 세상에 감탄스런 시선을 보내며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남편이고 아빠이고 아들일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나름의
질서가 있고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톱니바퀴임을 자각한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듯이 우리도 그들을 위해 뭔가를 분명 하고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응원만이라도 보내야 진정한 '콜'이 되지 않을까.
자칫 내려놓은 지방시보다 덜 떳떳할지도 모를 '대리기사'의 일상을 통해 이런 멋진 르포를 탄생시킨 저자의 역량에 박수를 보낸다. 그가
과감하게 뛰쳐나왔던 학교는 정말 대단한 인재 하나를 놓치고 대신 욕만 바가지로 먹은것 같다.
당당한 그에게 희망을 보았고 다음 행보가 기다려진다. 혹시 내가 부른 기사가 그라면 정말 행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