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거대한 음모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단다. 세상의 90%를 이끄는 10%, 또 그 10%의 1%의
세력이 끌고가는 세상! 그런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사이에 섞여 살고 있는
스파이들의 이야기! 쉬운 소재는 아니다. 알파벳으로 표기되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따라 가는
일도 쉽지 않다. 드러나지 않는 인물들의 이야기!
세상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은밀하고 어둡고 축축하고 막연하다.
일란성 쌍동이를 태어났지만 기록에는 없는 D, 그녀의 언니는 어느 날 사라지고 만다.
언니가 환자들과 상담을 했던 진료소역시 음침하다. 정말 D의 언니는 존재하기는 했던 인물일까.

X는 계절이 두 번 바뀌는 시간동안 잠들어 있다가 15년이 기억이 지워진채 의식이 돌아온다.
그리고 자신이 잘나가는 애널리스트이면서 또한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전해듣는다. 그리고 그가 의식이 없는 동안 보호자 역할을 했던 Y란
대학동창은 자신이 X를 감시하는 스파이임을 고백한다.
Y의 상사인 B는 서른 한 살때 스스로 스파이의 길을 선택했고 지금은 중간 보스로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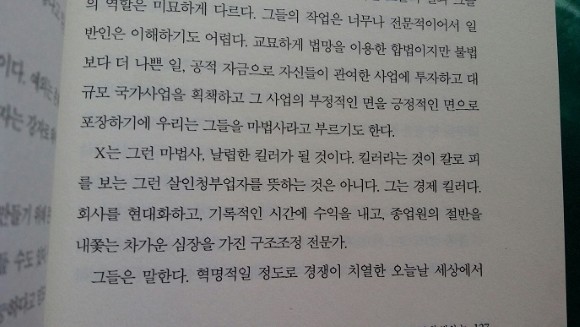
오래전 그의 보스였던 남자는 홀연히 사라졌고 이제는 책방 주인이 되어 은밀하게 살아간다.
때로 스파이들은 스스로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했다. 여기서 말하는 스파이는 적국의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하고는 조금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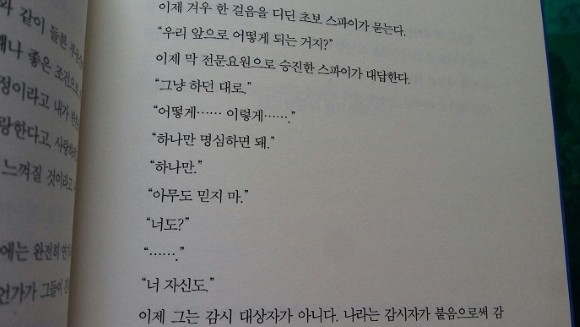
때로는 자신이 스파이임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 윗선에서 위험한 인물로 판단되는 인물을 찍으면 스파이들은 그들을 감시한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교묘하게 바꾸는 역할을 한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가 스파이임을 숨겨서 서로가 스파이임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스파이 엄마를 둔 스파이 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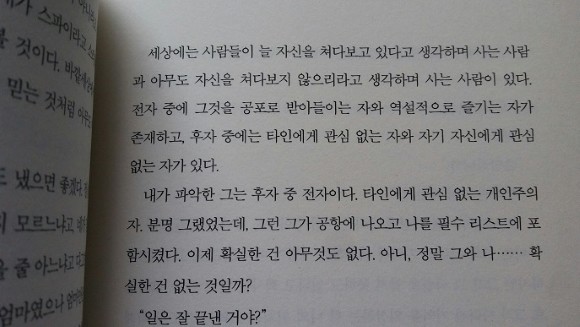
자신의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는 가난한 소설가 Z!
겨우 타낸 창작지원금의 사용처를 치밀하게 추적하는 당국의 처사가 못마땅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런 그에게 은퇴한 스파이가 전한다. 당신의 글이 세상을 바꿀수도 있다고.
정작 작가 자신은 자신의 글의 힘을 모른다. 이 세상의 은밀함들을 글로 남기는 것이 작가들의 운명이라고, 그래서 Z는 글을 멈출 수
없다.
퍼즐을 하나씩 주워모으지만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전혀 감이 안잡히는 다소 난해한 작품같기도 하다.
피카소의 그림을 보듯 뭔가 보일 듯, 느껴질 듯 형이상학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
세상은 정말 이런 스파이들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도 그 스파이들중 하나일지도.
그들을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1%, 혹은 10%의 권력을 위한 도구일지도.
눈이 내리는 밤은 더 고요하다. 아우성까지도 묻어버리는 눈처럼. 눈속에 묻힌 진실을 누군가는 써야한다. 그리고 우리는 읽어야 한다. 이
책을 읽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