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시, 봄 - 장영희의 열두 달 영미시 선물
장영희 지음, 김점선 그림 / 샘터사 / 2014년 4월
평점 :



가끔 왜 사랑받을 자격이 넘치는 사람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것인지 신에게 묻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실력있는 영문과교수이면서 감동적인 글을 써서 우리에게 따뜻함을 나누어주었던 장영희씨가 세상을 떠난지
어언 5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빈 자리는 너무도 컸습니다.
겨울의 그 삭막함속에 죽은 듯 스러져있던 잡초들이 봄이 오면 다시 되살아나듯 이 봄 그녀가 다시 살아온 것만 같은
반가운 책이 나를 찾았습니다.
그녀보다 두어 달 먼저 세상을 떠났던 김점선화백의 그림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생전에 자매처럼 다정했던 두 사람은 그 봄 같이 떠남으로써 친한 티를 내더니만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운 시로,
그림으로 다시 우리에게 그리움을 전해줍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정하게 손 붙잡고 기뻐하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나에게 영미 시는 윌리엄 워즈워드나 로버트 프러스트의 시가 고작이었습니다.
특히 프러스트의 '가지 못한 길'은 평생 내 마음을 흔드는 소중한 시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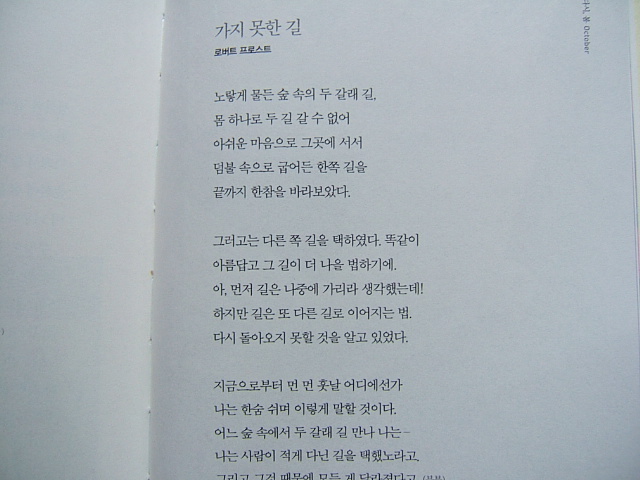
사실 영미 시를 번역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시 자체가 단어의 조그만 변화에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하물며 영어를 작가의 의도가 살아나도록 번역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일 겁니다.
이 '가지 못한 길'도 내가 알던 시와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갈래 있었습니다. 나는 두 갈래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장교수는 이 시를 '몸 하나로 두 길 갈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one traveler 나 I could not travel both..라는 문구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나에게도 원문에 상당히 충실한
번역으로 느껴집니다.
아마 다른 번역가가 다시 쓴다면 또 다른 표현이 나올수도 있는 것이 영미 시의 특징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단지 번역가가 아닌 거의 시인의 감성을 지닌 작가가 번역을 하였다면 원작에 훨씬 가까운 시가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장교수가 만난 시들은 정말 제대로 임자를 만난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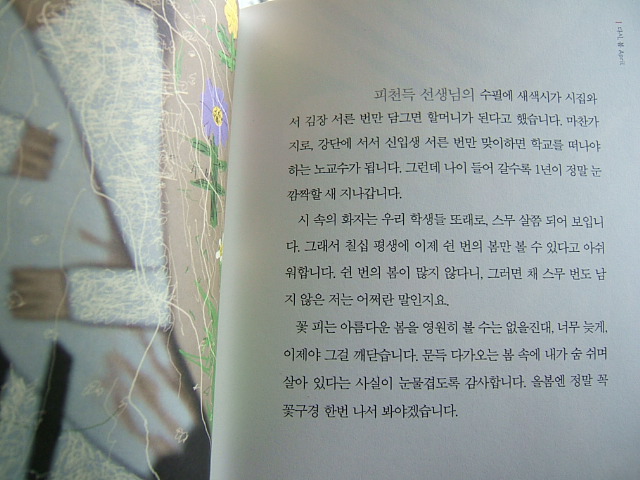
A.E. 하우스먼의 '나무 중 제일 예쁜 나무, 벚나무'에서 '이제 내 칠십 인생에서 스무 해는 다시 오지 않으리. 일흔 봄에서
스물을 빼면 고작 쉰 번이 남는구나'라는 싯귀를 보고 '쉰 번의 봄이 많지 않다니, 그러면 채 스무 번도 남지 않은 저는
어쩌란 말인지요'라고 아쉬워합니다. 언제 이 시를 번역하였는지 모르지만 장교수가 그 뒤 몇 번의 봄을 맞았는지 궁금해집니다.
문득 다가오는 봄 속에 내가 숨쉬며 살아 있다는 사실이 눈물겹도록 감사하다는 그녀의 이 말이 가슴을 칩니다.
이 글에서처럼 제대로 된 꽃구경은 나섰을까요. 다시 몇 번을 맞을 봄이라도 당장 지금의 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는 알았을까요.
미국의 애표 여류시인인 에밀리 디킨스의 3월이란 시에서
'3월님 이시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오셔서 얼마나
기쁜지요!
일전에 한참
찾았거든요.' 하고 긴 겨울을 지나 힘겹게 다시 찾아온 3월을 예찬하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나는 이 시를 이렇게 고쳐쓰고
싶습니다.
'장영희님 이시군요, 어서
오세요!
오셔서 얼마나
기쁜지요!
다시 만나지 못할까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다시, 봄!
그녀가 무척 그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