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바람이 지우고 남은 것들 - 몽골에서 보낸 어제
김형수 지음 / 자음과모음(이룸) / 2013년 9월
평점 :



바람이 분다. 멀리 초원에서 부는 바람이 아닌 태평양 한가운데서 만들어진 큰 바람이 우리땅으로
휘몰아치고 있다. 같은 바람이라도 바다의 것은 습하다. 초원의 바람은 차고 건조하다고 했다.
-대륙을 누비던 살은 흙이 되고 근육은 바람이 됐다-
대륙의 바람에는 그 전 사람들의 살과 근육이 흩어져 있을 것이다. 아마 혼(魂)까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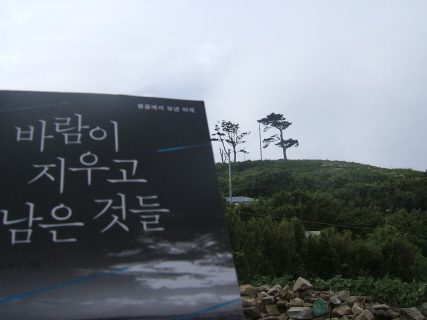
이제는 가는 곳마다 숙소를 얻기 힘들만큼 많은 여행자들이 몽골을 찾는다고 한다.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거리를 오가고 차가운 시멘트로 지은 집들이 하나 둘씩 늘어간다는 그 곳!
지은이는 그 초원의 땅 몽골을 열 한번 다녀왔다고 했다.
그가 몽골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은 고스란히 작품이 되어 우리들에게 전해졌다. 마치 바람처럼.

그의 전작 '조드'는 그가 울란바타르의 학술팀들과 함께 한 여정에서 이미 싹트고 있었다.
징기즈칸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몽골에는 문자가 없을 것이라는 상식은 초원에서 발견된 오래된 암각화에서
발견되곤 했다. 하긴 고려에 종이와 붓, 먹등을 요청했다니 문자가 없는 그들에게 그 물건들이 장식품으로
쓰여지진 않았을 것이다. 넓은 초원에서 만난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
키우던 양을 잡을 때에도 최대한 죽어가는 혼을 위해 기도하고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시를 쓰는 작가에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몽골의 사람들과 자연의 땅들은 수많은 시가 태어나기 좋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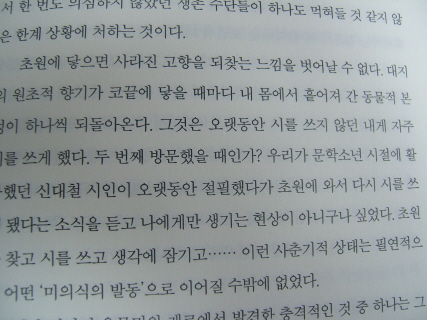
'초원에 닿으면 사라진 고향을 되찾는 느낌을 벗어날 수 없다. 대지의 원초의 향기가 코끝에 닿을 때마다
내 몸에서 흩어져 간 동물적 본성이 하나씩 되돌아온다. 그것은 오랫동안 시를 쓰지 않던 내게 자주 쓰게 했다.' 169p
오랫동안 절필했던 시인에게 다시 시를 쓰게 하는 그 땅에서 나도 글을 쓰고 싶어졌다.
무감했던 신경들이 되돌아오고 굳었던 근육들이 나른하게 기지개를 펴고 일어날 것만 같은 그 땅에 닿고 싶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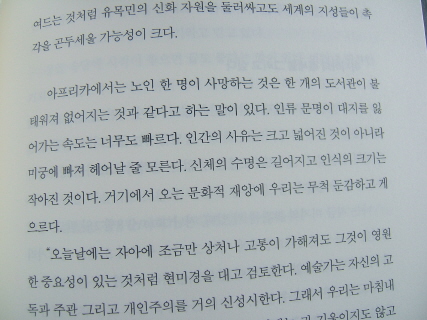
노인 한 명이 사망하는 것은 한 개의 도서관이 불 태워져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하는 말이 아프리카에는 있단다.
그렇다면 초원이 한 뼘씩 사라지고 시멘트 블럭이 채워지는 그 땅에 재앙은 '조드'라고 부르는 겨울 재해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광야에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면 사람과 동물들은 마실물을 확보할 재간이 없어진다.
당장 살자고 미래의 물을 훔치다 보면 점점 초지는 황폐화되고 배는 더욱 고파온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자연의 순리를 거슬러 당겨쓰고 마구 써버린 댓가를 하나씩 되돌려 받고 있으니 '조드'는
이제 당장 우리에게 닥친 재앙인 셈이다.
그래도 여전히 아직은 조금이나마 태고의 모습을 간직한 초원에 서서 작가는 바람을 맞는다.
태고를 씻고 살다 간 사람들의 혼이 담겨진 바람 속에서 그는 그들의 언어를 듣는다.
초원에서 살아가는 순백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시각을 가졌다고 한다.
아마도 순백의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게 초원의 바람은 태고의 언어를 느끼는 능력을 주는 모양이다.
그 초원에서 '바람이 가져다준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으니 말이다.
더럽혀진 영혼들을 씻어주는 것만 같은 바람의 이야기가 순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