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래전 문고판으로 읽었던 한국의 단편문학들을 다시 읽으니 절로 감동이 밀려온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 주옥같은 작품속에는 그 시절의 애환들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은 인력거를 끄는 김첨지가 유독 운수가 좋았던 하루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집에는 병에 걸려 누워있는 아내와 빈젖을 빨고 있는 간난아이가 기다리고 있다.
아침 댓바람부터 손님이 몰려들더니 거금 삼십원을 벌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첨지는 묘한 불안감을
느낀다. 집에 들어서면 기어이 확인할 것 같은 불행의 그림자를 알아차린 것이다.
아내가 먹고 싶어했던 설렁탕을 사들고 들어갔건만 이미 아내의 몸은 뻣뻣해지고 김첨지는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 운수가 좋더니만...'하고 오열한다.
사십에 가까운 노처녀인 b사감은 주근깨투성이 얼굴에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폼이 곰팡 슨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 이 b여사가 질겁을 하고 싫어하는 '러브레터'를 들고 한밤중에 일인 이역을 하면서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를 살려주어요. 나를 구해주어요."하는
장면은 왠지 마음을 짠하게 한다. 노처녀 사감의 꺼지지 못한 사랑의 애?음을 어찌 이리 잘 그려내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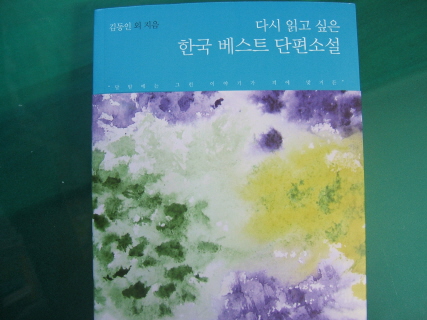
나도향의 '벙어리 삼룡이'는 어려서 영화로도 본 기억이 있다. 새로 시집온 안채의 새댁을 은근히
사모한 벙어리 삼룡이 결국 매를 맞고 쫓겨나 주인집에 불을 지르는 장면에 알수없는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
늑막염으로 고생하다 요절한 김유정의 소설 '봄.봄'은 열살이나 어린 점순에게 장가들기 위해 장인을 조르는
노총각의 안달이 아스라히 피어오르는 봄 아지랑이처럼 사랑스럽다.
"점순이 키좀 키게 해줍소사."
성례를 시켜 줄 마음도 없이 종처럼 부려먹는 장인과 노총각의 치고 받는 대화가 걸작이 아닌가.
이웃에 사는 총각을 좋아하던 점순은 제마음을 몰라주는 총각집 수탉을 괴롭히며 은근 제마음을 전하려 든다.
하지만 둔감하기만 한 이웃총각은 결국 점순네 쌈닭을 죽이고 마는데...눈물까지 흘리며 걱정하는 총각에게
"닭 죽은 건 염려마라. 내 안 이를테니."하며 총각을 부여잡고 노란 동백꽃 속으로 파묻힌다.
살금살금 피어오르는 처녀 총각의 풋사랑이 싱그럽기만 하다.
계용묵의 '백치아다다'역시 영화와 노래로도 만들어진 작품이다.
말을 못하는 아다다의 슬픈 운명이 파도속으로 사라지는 마지막 장면처럼 안타깝다.
이상의 '날개'는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하는 마지막 부분이 인상깊었었다.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이기도 한 이 소설을 쓰고 얼마 후 이상은 진짜 날개를 달고 하늘로 떠났다.
평양이 고향인 김동인의 소설의 무대는 대동강이 흐르는 평양이다.
대동강변에서 들려오는 '배따라기'소리에 홀린듯 찾아낸 사내의 서글픈 노랫가락에는 자신의 의심으로 자살을 한
아내와 아우의 출가로 이십여년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사연이 숨어있다.
무능한 남편 대신 몸을 팔아 생계를 연명하던 복례는 단골인 왕서방이 새장가를 가던 날 기어이 쳐들어가
죽음을 맞이한다. 왕서방과 복례의 신랑, 그리고 한의사는 서로 짜고 뇌일혈로 진단한 후 공동묘지로 가져간다.
'메밀꽃 필 무렵'은 늘 보름달이 연상된다. 보름달 아래 눈을 뿌린 듯 희게 피어난 메밀꽃 사이를 지나는 허생원과
조 선달과 동이. 오래전 홀린듯 찾아간 물방앗간에서 맺은 하룻밤 인연을 잊지 못하는 허생원.
애비없이 홀로 큰 동이가 허생원과 같은 왼손잡이임을 그려 그의 아들임을 은근히 암시하면서 끝나는 장면이 압권이다.
우리의 단편문학은 1900년대 초기 근대화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모습이 잘 녹아져 있다.
여전히 가난한 조국과 신지식인들의 고뇌, 그리고 민중들의 고달픈 삶들이 너무도 진솔하게 그려져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다. 작가 자신들도 가난했고 자신의 작품에 등장하는 고뇌하는 신지식의 모습이 바로 그 자신들이었을
것이다. 때론 해학이 넘치고 때론 아프지만 그 시절의 언어들을 만나고 가난한 작가들을 만났던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다.
대를 이어 아이들에게도 난 이 책을 전수해 줄 것이다. 아이들이 도달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만날 수 있으므로.
아련한 기억속에 명작으로 기억되던 13편의 단편을 다시 보니 얼마나 반갑고 그립던지..읽는 내내 가슴이 뭉클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