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섬, 섬옥수
이나미 지음 / 자음과모음(이룸) / 2013년 8월
평점 :



'그러나 땅끝섬 사람들 마음속에는 고립감이 뿌리 깊어 스스로를 유폐시키며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산다.
섬이라는 단절되고 폐쇄된 공간에서 거친 바다와 싸우고 또 순응하면서 체득된 오랜 정서 탓인지도
모른다.' -263p
그렇다. 섬은 그 자체가 수인을 가두는 천연의 요새인지도 모른다.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애초에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그 곳에 떨구어진 사람들이었다.
빗물로 갈증을 달래고 척박한 땅에 고구마를 심어 먹어도 모든 세상이 다 그러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름의 안분지족을 습득했던 사람들이었다.
섬들 중에서도 쳐질대로 쳐졌던 땅끝섬은 대한민국 최남단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으면서 요란하게
탈바꿈을 시작했다.
섬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척박을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돈맛을 알아갔다.
손바닥만한 섬에 골프차 수십대가 으르렁거리고 뜬금없는 짜장면 열풍으로 몸살을 앓는다.
한집안처럼 화목했던 사람들은 서로를 물어 뜯으면서 뭍의것, 육지것보다 더 그악스러워졌다.

섬을 찾아드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최남단'이라는 푯말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들어오는 관광객이
많아지기 전에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있던 사람들이 많았었다.
한가락 하시던 조폭아저씨도 간암판정을 받고 찾아든 곳이 이 섬이었으며,
분식집으로 모은 돈을 아는 언니한테 사기당하고 죽음으로 몰리던 여인도 있었다.
타고난 역마병을 껴안고 방황하던 사나이는 섬에 있는 절로 들어와 결국 주지가 된다.
떠돌만큼 떠돌다가 들어온 땅끝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10년 넘게 보따리 강사생활을 하던 여인은 알량한 그 자리를 내어놓기 위해 땅끝까지 내려와 결심을
굳힌다. 어디로 여행을 떠났는지 묻지 않았던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면 조금 더 행복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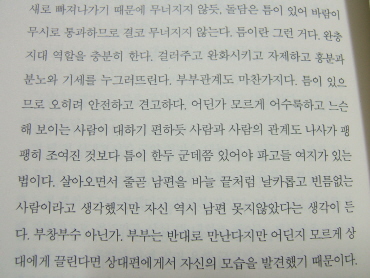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다. 틈이 있으므로 오히려 안전하고 견고하다.'
서로 빈틈이 없었기 때문에 불편했었는지도 모른다. 섬을 다녀간 후 그녀는 조금 느슨해지기로 한다.
섬이란 치밀하지 않아야만 살아가기가 편한 곳이다. 그녀는 섬의 지혜를 나누어 가져간 모양이었다.
대책도 없이 너도 나도 들여놨던 개들이며 골프차들은 인간의 탐욕이 부른 재앙의 상징이었다.
관광객이 던져주는 과자로 연명하는 개들은 눈치만 빤해졌고 개주인들은 사육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가 결국에 잡아먹는 것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지워버렸다.
애기업개당의 슬픈 전설을 지닌 섬은 여전히 할망당의 위력이 존재한다.
거친 바다와 마주한 사람들에게 귀신은 섬겨야 할 조상이고 달래야 할 업인것을.
섬에 들어와 살고 있는 내게 이 소설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막막함과 너무도 닮아있어 놀랍기만 하다.
평생 두통에 시달리는 잠녀들의 늙은 모습과 질긴 생활력,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젊은 잠녀가 없다는 것도.
그렇게 키워낸 자식들은 모두 뭍으로 떠나고 늙은 몸뚱이만 붙들은 잠녀들은 오늘도 힘겨운 발자욱을
떼어 좀 더 자유로운 바다속으로 물질을 간다.
짜장면 한 그릇을 더 팔기위해 반목하고 뒤늦게 들어온 뭍의 것들을 무참하게 공격하는 모습.
10년이 넘게 살아야 겨우 주민으로 인정하겠다는 극렬한 텃세.
나는 이 소설이 허구가 아님을 안다.
도시의 각박함과 처세가 싫어 들어온 섬은 내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고 스스로 수인이 되어 갇혔다는 것을 알았다.
눈빛 하나에도 싸늘함을 걷어내지 못한 원주민들의 텃세보다 이제는 뭍의 것들이 점령해버린 섬사람들의
비겁함과 집요한 욕망을 알기에 상상만으로 이 글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육지와 섬사람들이 어찌어찌 섞여서 살아가는 섬의 모습들은 대체로 비슷한 모양이다.
마치 내가 살고 있는 섬의 모습을 그린 듯 생생하여 내가 소설속에 녹아있는 느낌이다.
뱅어돔을 낚는 낚시꾼들의 모습속에서는 작가의 모습이 보였다. 분명 그녀는 굉장한 낚시꾼일 것이다.
아니면 세상 모든 것에서 글감을 낚아올리는 리얼 낚시꾼이거나.
더구나 그 어렵다는 제주도 방언을 이리도 실감나게 살려내다니. 물론 해석하는데 무척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투박하고 난해스럽게 느껴지던 그 말들은 태초의 숨결이 녹아진 것 같은 신비감이 숨어 있었다.
섬 특유의 방언은 여전히 외지인을 밀어내는 듯한 단담함과 함께.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면 태풍이 올라오고 풍랑주의보가 수시로 내릴 것이다.
방파제에서 건져올린 뱅어돔이라도 썰어놓고 작가와 마주앉아 소주한잔 기울이고 싶어진다.
다음번엔 우리 섬 얘기도 좀 써주실라요. 여그도 심란한 야그가 만당케요.
섬, 섬옥수 2편 쓰고도 남는당께. 우째 생각있음 연락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