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엄마는 어쩌면 그렇게 - 나의 친구, 나의 투정꾼, 한 번도 스스로를 위해 면류관을 쓰지 않은 나의 엄마에게
이충걸 지음 / 예담 / 2013년 4월
평점 :

품절

다큰 남자가, 아니 중년의 남자가 자신의 모친을 '엄마'라고 부르는 장면을
연상하면 왠지 몸이 오글거리는 것도 같고 살짝 징그러운 생각마저 든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나는 '이충걸'이란 남자를 알지 못했다.
단지 이력으로만 보면 건축학과를 나왔으나 GQ의 편집장으로 그 방면에서는 상당히 유능한
사람인 모양이다. 표지에 나온 그의 모습은 도무지 나이를 짐작하기도 어려웠다.
이미 소설부터 에세이집까지 책도 여러권 냈다는데 어쩌다 나에게는 뒤늦게 아는척을 해왔다.
가지고 있는 청바지가 수두룩하고 검색에서 나타난 그의 모습도 역시 패션니스타의 자질이 엿보였다.
그런 그가 오래전부터 함께 살고 있는 엄마에 관하 이야기를 써왔던 모양이다.
엄마를 소재로한 에세이집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같다.
하지만 이 책은 상당히 특별하게 다가온다.

단순히 사랑하는 엄마를 추억하는 글도 아니고 토닥거리는 연인들의 연애이야기같기도 하고
인생의 동반자들끼리의 이인삼각의 운동경기를 보는 것같기도 하다.
위로 형이 둘에다가 누나가 있는 막내아들인 이남자를 키우는게 다른 형제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어렵더라고 했다. 하긴 이렇게 글을 쓸 정도의 감성이라면 꽤나 까탈스럽지 않았을까.
그저 그런 엄마와의 에피소드를 그린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문체가 예사롭지 않다.
어찌보면 너무 묵직해서 어느 문장에서는 두 서너번쯤 읽어야 겨우 줄거리를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쩌면 요렇게 맛깔스럽게 표현했을까 싶은 빛나는 문장들의 연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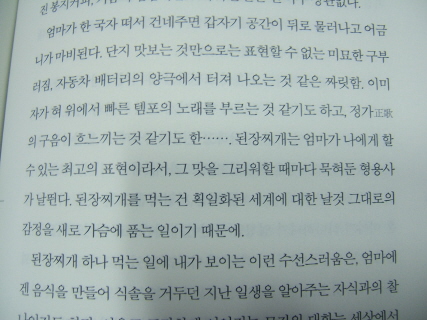
별난 아들을 휘어잡는 모친이라면 역시 예사로운 감성의 소유자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자식들을 위해 아파트 베란다에 메주를 띄우고 된장을 담그는 천상 우리들의
어머니의 모습에서 애틋한 자식사랑이 느껴진다.
희한한 물건이나 시계에 집착하는 묘한 취향을 가진 남자를 지켜보는 엄마는
늘 혀차는 소리가 떠날 날이 없을 것같다.
더구나 여전히 싱글로 개기는 아들이라면 늙은 어미의 마음이 어떠할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여전히 때로는 투정꾼으로 때로는 늙은 모친의 보호자로
꿋꿋하게 엄마곁을 지키고 있다.
독특한 그의 취향을 이해해주는 지인군단의 화려함을 보면 분명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인듯 한데 그래도 그 역시 어쩔수 없는 한국남자다.
손수 담근 된장으로 끓인 엄마표 된장찌개에 환장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다.
언젠가 엄마표 된장찌개를 먹지 못하게 될 어느 날을 예상하면서도 엄마에게 일일이 물어
낱낱이 알고 싶지 않다는 말에 그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 짐작케된다.
엄마표 된장찌개의 오묘한 맛을 터득하게 된 것을 안 엄마가 양육한다는 책임으로부터
편안해질까봐. 그럼 의욕 하나를 덜어내 엄마가 무력해질까봐.
그가 아무리 대한민국에 잘나가는 남자라 해도 늙어가는 엄마가 어느 순간 자신의 곁을
떠나 더 이상 양육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고아가 될까봐 걱정하는 아들인 것이다.
분명 이제 엄마에게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이 책이 늙어가는 아들(?)의 사모곡임을 살아서 보실 수 있으니 어찌 행복한 엄마가
아니라 하겠나. 그의 엄마는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그를 곁에 붙잡아 두고 싶을지 모른다.
여전히 엄마에게 그는 어린 아들일 뿐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