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선 노비들, 천하지만 특별한
김종성 지음 / 역사의아침(위즈덤하우스) / 2013년 3월
평점 :



지나간 시간들을 찾아가는 여행은 언제나 즐겁다.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같이 왕의 일정을 기록하고
일생을 기록한 책은 세계적으로도 귀한 유산이라고 한다.
거의 모든 역사의 기록이 그러하지만 대체적으로 권력을 가진자나 승리를 한자의 기록인 경우가 많다.
이름없이 아니 이름이 있다해도 그 시대에서 낙후된 인생을 살다간 자들의 기록은 많이 없다고 한다.
그렇기에 이렇게 '천하지만 특별한'조선노비들의 기록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선 우리가 노비들에 대한 막연한 지식을 얻게했던 사극에서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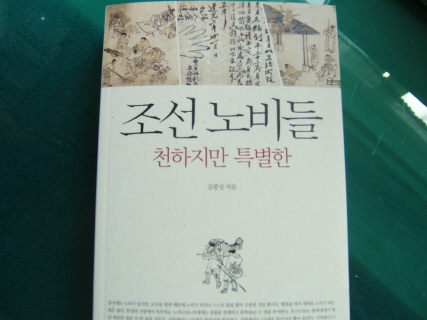
'노비'라는 말자체가 남자종과 여자종을 나누어 이르는 말이라는 것도 그리고 노비주의 집안에서 생활했던
'솔거노비'와 집밖에서 생활했던 '외거노비'가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안 사실이다.
이 정도의 무지라면 위안이 되련만 공부하고 양인을 가르치는 노비까지 있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글 읽는 노비, 박인수'처럼 노비주의 집밖에서 생활하면서 글을 읽고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양인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노비라니, 그동안 내가 알았던 노비에 대한 생각은 여지없이 깨어진다.
노비주에게 갚아야 하는 일정량의 의무만 이행되면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늘 고개만 숙이고 비천하게 살아갔을것 같은 노비들에게도 말하자면 계층이 있고 처우가 달랐다는 뜻이다.
크게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노비가 있었는가 하면 술주정을 하다 주인에게 맞아죽은 노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시대마다 양인과 노비들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양인이 되거나 노비가 되는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은
지배계급이 누리고자 했던 시스템에 의해 흔히 팔자가 달라진 셈이다.
이런 시스템의 부작용으로 급격히 양인이 줄어든 고려시대에는 국가의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유발되었다고
하니 국가의 경영에 있어 신분의 경계를 나누는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을 노비로 만드는 제도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경혜공주와 같이 왕족이었던 사람들일 것이다.
가장 귀한 신분에서 가장 비천한 계급으로 추락하는 상황은 한편의 드라마같은 이야기이다.
반대로 노비의 신분에서 면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였다고 하니 평생 노비로 살다가 자식에게도 신분을
물려줘야 했던 노비들의 신세가 가엽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노비들의 후손이 내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조선시대 인구의 30%가 이런
노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모두 자신의 집안은 양반이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우리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노비들의 후손임을 알게되면
기록되지 못한 조상들의 삶이 묵직하게 다가올 것이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그런 불평등한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다시 감사함이 우러난다.
찾기 힘든 기록을 발굴하고 막연했던 상식을 뒤집어준 저자의 열정에 존경을 보내며 이 책에 소개된 천하지만
특별했던 노비들뿐만 아니라 이름없이 사라져간 노비들에게도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