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침대에 누워 다음날, 혹은 이번주에 해야할 일들을 정리해본다.
기억럭이 자꾸 감퇴되니 책상에 있는 다이어리에는 스케줄이 빡빡하게 적혀있다.
강박증인가? 결벽증인가? 완벽하려고 하는, 혹은 실수하지 않겠다는 몸부림일까?

먹을 걱정거리에 미래가 불투명했던 과거에도 불안은 있었다. 이제는 살만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안은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다. 저자의 말마따나 인류의 진화가 거듭되면서도 불안은 조금도 진화하지 못하고-좋은 의미에서 불안이 사그러지는 진화같은-더 생생하게 전염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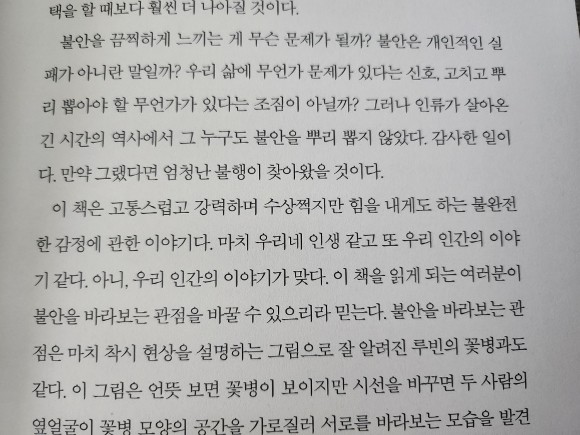
'불안'이라는 단어자체가 부정적이고 두려운 느낌을 준다.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닥뜨릴 현실에 대한,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을 실체가 없는 막연한 어떤 것에 대한것들.
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불안을 느껴야하나.
특히 3년이 넘는 코로나 팬데믹 시간동안 더 심할 수밖에 없었다. 전염병은 무서운 존재니까
당연하다. 문제는 실체가 없는, 혹은 실체가 있더라도 얼마든 극복할 수도 있는 대상에 대한
것까지 불안의 대상이 된다는게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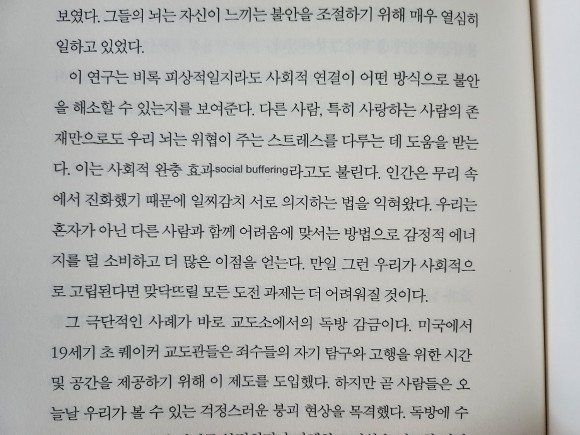
저자는 임상심리학 전문가로서 인간들이 느끼는 불안의 실체에 관해 알려주고 어떤 점에서
불안은 인간에게 성장과 발전을 줄 수도 있음을 조언한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뭐든 긍정적이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인류는 지금의 번영에 이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저자의 말처럼 불안을 친구처럼 협력자처럼 여긴다면 인생의 자극제가 될 수도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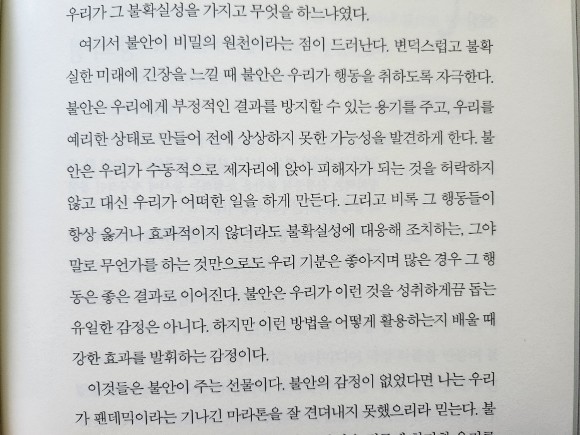
아무리 마음을 크게 먹어도 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가실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저자의 많은 증명을 보면 얼마든 동반자처럼 손을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제의 적을 오늘의 친구로, 내일의 동반자로 만드는 법을 잘 설명해주는 책이다.
불안하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선물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알려주어 내 불안이 부끄럽거나 두렵기만 하지는 않아서 안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