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죽음이 물었다 -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있느냐고
아나 아란치스 지음, 민승남 옮김 / 세계사 / 2022년 12월
평점 :



사실 인간은 무모하고 잔인하며 욕망에 무너지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번영을
이루고 살아남았다는 것을 보면 분명 위대한 존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행인건 유한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시대나 나라를 선택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들은 지금 이시대에 태어나 어찌어찌 살아내고 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한편으론 물러남없이 번영의 길을 이끈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기 싫어서 영원한 삶을 꿈꾸기도 한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세상의 끝에 사신을 보낸 이유도 이와같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역시 막연하게 죽음은 나와 먼 이야기처럼 생각한다.
분명, 반드시 찾아올 '죽음'에 이처럼 대비없이 살아도 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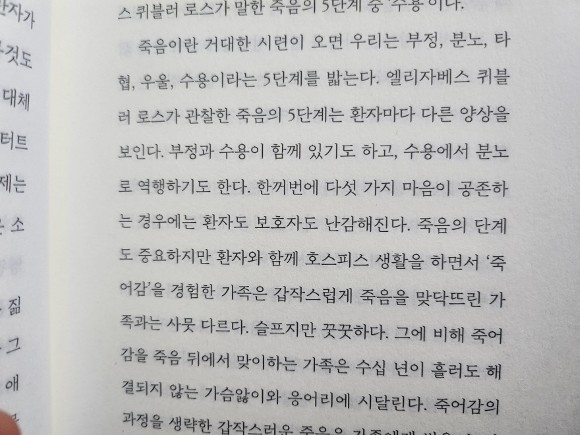
내가 이 책에 더 주목하는 이유는 내오랜 친구가 호스피스 관련일을 하고 있어서이다.
그 곳은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는 환자들에게 마지막 길을 인도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곳이다. 통증을 완화시키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
그래서 그 곳에 들어온 사람들이 살아서 나가는 일은 없다.
저자의 말처럼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화를 내고 결국 타협하면서 수용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아마 환자의 가족들도 그렇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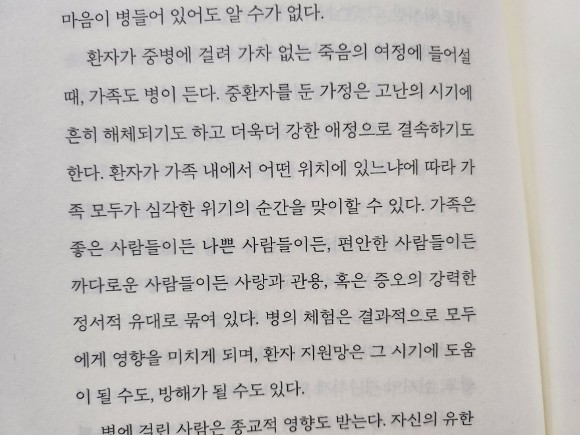
호스피스일을 하는 친구역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고
최근에도 가족처럼 든든했던 지인 하나를 먼저 떠나보내고 말았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얼른 전화기를
누르지 못했다. 그 어떤 말로 위로를 하고 또한 내 전화가 위로가 되기는 할 것인가.
수많은 죽음을 만났고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 친구도 죽음은 쉽지 않은 명제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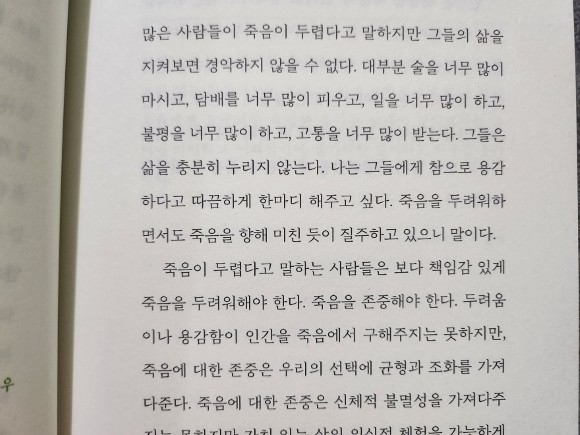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온다. 다행이다. 나에게만 부당하게 오는 것이 아니어서.
저자 자신은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고 훈련도 받았지만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많은 트라우마를 겪는다. 그리고 자신도 환자가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간디에 관한 연극을 보면서 삶의 전환을 맞는다.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 아들에게 설탕을 먹지 않게 말을 해달라는 어머니에게 간디는
2주후에 다시 오라고 말한다. 2주후에 다시 온 아들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말을 해준다.
어머니가 묻는다. 왜 2주전에 그 얘기를 해주지 못했냐고.
간디는 나도 2주전까지는 설탕을 먹었다고 말한다. 자신은 설탕을 먹으면서 누구에겐가 먹지 말라고 말하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자신도 죽음에 이르는 환자에게 휘둘리면서 어떻게 의사노릇을 잘 할 것인지 스스로
묻고 해답을 찾아간다. 그리고 결국 병을 고치는 의사보다는 평안한 죽음을 찾아가도록 돕는 완화의료를 선택한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운 환자들에게 존엄한, 그리고 평안한 죽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다.
살리는 의사도 있지만 이처럼 두려운 죽음을 마주볼 수 있도록 돕는 의사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한 번쯤
떠올릴 것이다. 죽음이 나에게 무엇을 물을까.
"너는 어떻게 살아왔니? 후회는 없었니?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마무리할 일은 없니?"
나는 어떤 대답을 준비해야하나. 많은 생각이 든 책이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