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래알만 한 진실이라도 - 박완서 에세이 결정판
박완서 지음 / 세계사 / 2022년 6월
평점 :



세월이 지나도 늘 그리운 사람이 있다. 어느새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된 박완서 작가님.
불혹의 나이에 문단에 데뷔하고도 '작가'라는 타이틀을 늘 어색해하셨다는 분.
혹시 낙선이라도 할까봐 쉬쉬하면서 쓴 소설 '나목'으로 시작된 그녀의 작품은 그 뒤
다양한 작품으로 선을 보인다. 그녀의 책에는 그녀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다.
개성 박적골의 이야기와 여덟살에 서울로 올라와 산꼭대기 동네에서의 고단한 삶들.
그런 뒤에 닥쳐올 삶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국전쟁으로 큰오빠와 숙부를 잃고
미군PX에서 돈을 벌어야 했던 시간들. 그 곳에서 만난 박수근화가와의 만남이 결국
그녀를 작가의 길로 이끌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목'의 시작은 바로 박수근의 삶을 쓰고자
했던 것에서 시작되었으므로. 하나 화가 박수근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어 포기하고
쓴 것이 바로 '나목'이었다. 분명 운명이긴 하겠지만 박수근은 작가발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셈이니 그의 어느 작품보다 대단한 열매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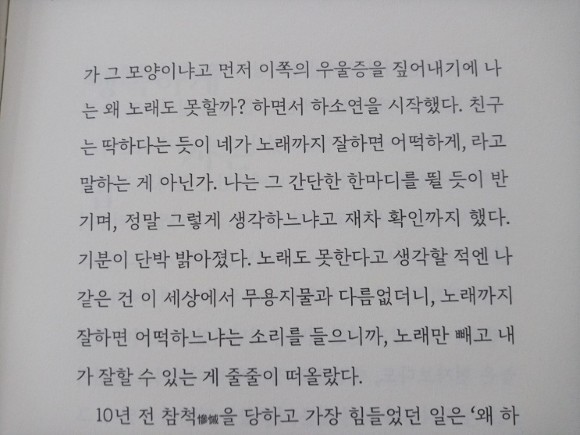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고통스런 시간들을 보냈던 글들을 오래전 만났었다.
평생 하느님에게 의지했던 그녀가 '한 말씀만 하소서'하고 절규하는 장면에서 가슴이 아려온다.
그랬던 그녀도 몇 개월 후 외손녀가 태어나자 다시 웃음을 찾으면서 이렇게 다시 살아도 되는가 묻는 장면은 어미로서 차마 부끄럽지만 할미로서 다시 살아가야 할 힘을 얻은 것 같아 다행스럽다.
노래를 못해 속상했다가 '노래까지 잘하면 어떡하느냐'는 소리에 뛸듯 좋아하는 장면이 너무
귀엽다. 사실 박완서는 수줍음이 많고 다소 내성적인 소녀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녀의 작품을 보면 그녀의 고집스럽고 단호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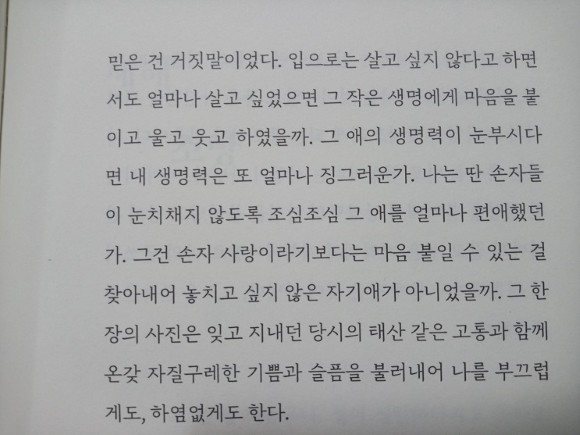
마지막 터를 잡은 아치울에서의 일상은 그린 작품에서 이제 남은 시간 고즈넉하게 정리하는 시간같아 평화스럽게 느꼈는데 어느 날 뜻밖에 와병소식을 들었다.
그녀가 돌아가기 몇 개월전 독자와 함께 영화를 보는 이벤트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자그마한 몸집에 고운 얼굴이었는데 당시에 병의 그림자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었다.
돌아다니는걸 과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혼자서 영화도 잘보러 다닌다고 해서 웃었던 기억이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솔직하게 밝히면서 언젠가 다가올 죽음이 미리 예고를 해준다면
주변을 정리하고 가고 싶다고 하더니 결국 그렇게 떠났다.
아들을 다시 만난다면 등을 철썩철썩 때리면서 왜 먼저 갔냐고 혼을 내겠다고 하더니
통일이 되면 개성 박적골을 터벅 터벅 산을 넘어 가겠다더니 아마 아들 손을 잡고 그 곳을
가보지 않았을까.
여든이면 아직은 살짝 아쉬운 나이였을 수도 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흔까지 장수하셨다는데 좀더 우리 곁에 있었더라면 그녀만의 느낌이
담긴 그 곱고 단호한 문장을 더 많이 만났을텐데 너무 그리워진다.
그래도 이렇게 그녀가 남긴 반짝 거리는 '모래알'을 만나니 어찌 반갑지 않을까.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