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햇볕이 아깝잖아요 - 나의 베란다 정원 일기
야마자키 나오코라 지음, 정인영 옮김 / 샘터사 / 2020년 3월
평점 :



10여년 전 섬으로 내려와 그토록 갖고 싶었던 텃밭을 가꾸면서 아 뭔가를 키워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공감하게 된다. 특히 약을 치지 않고 깨끗하고 싱싱한 채소를 길러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시장에 가서 채소를 고를 때 볼품없는 것을 고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농부는 보기좋고 풍성한 결실을 위해 농약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되면서 텃밭을 하든
제대로 된 농업을 하든 이 책의 저자처럼 베란다에서 가드닝을 하든 벌레와의 싸움을 각오해야
한다. 참 신기한 일이다. 벌레들은 서로 통신을 하는걸까. 어느 집 어느 밭에 뭐가 심어져있는지
서로 공유하는 것인지 잘 키워진 식물일수록 벌레들이 꼬여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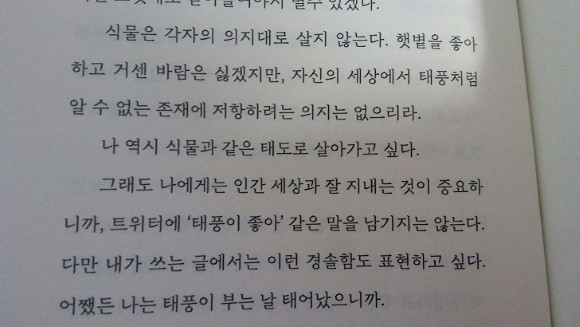
저자는 다소 내성적이고 번잡스러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조신한 식물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도시의 좁은 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꾸민다.
처음엔 올리브나무로 시작해서 허브종류들을 심었다고 한다. 화분이나 계란판등을 이용하여
아주 작은 정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안으로 들여놓을 화분이
즐비하게 되었단다. 사실 식물처럼 정직한 생명체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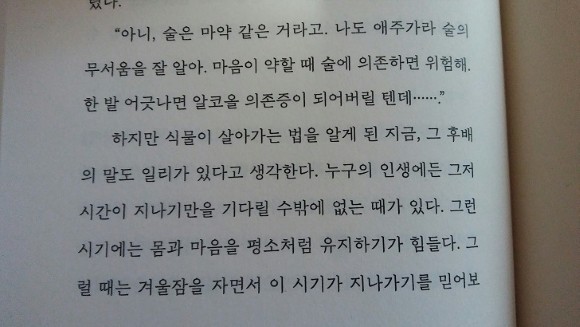
인간의 식성이 다 다른 것처럼 물을 더 좋아하거나 강한 햇볕보다는 엷은 햇볕을 더 좋아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 식성만 제대로 맞춰준다면 정직하게 성장한다. 물론 벌레들에게 뜯기지 않고
상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반려견처럼 여행을 갈 때 맡길 걱정은 없지만 물을 대주기 위한
고육책들을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저자가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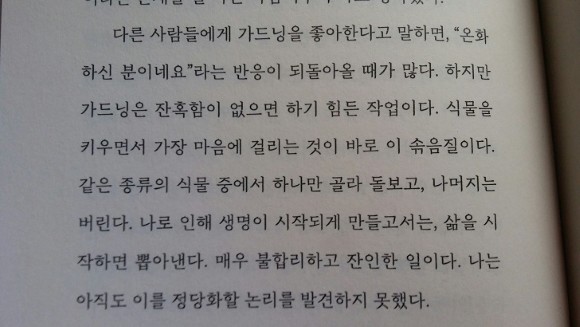
이 책에서 가장 나를 사로잡았던 문장은 바로 '솎음질'이었다.
지금 내 텃밭에는 지난 겨울을 보내고 남은 무우들이 몇 개 남았다. 작년에 싹이 올라올 때 사실
솎아줘야 했었다. 그냥 두었더니 서로가 자라겠다고 아우성을 쳐서 결국 다 고만고만한 크기로
볼품없이 자라고 말았다. 자랄 공간을 잡아주려면 솎아줘야 하는데 말이다.
나도 저자처럼 솎아주는 일이 겁이났던 것일까.
저자는 삶에도 이런 '솎음질'때문에 불합리하고 잔인하게 되는 것을 가슴아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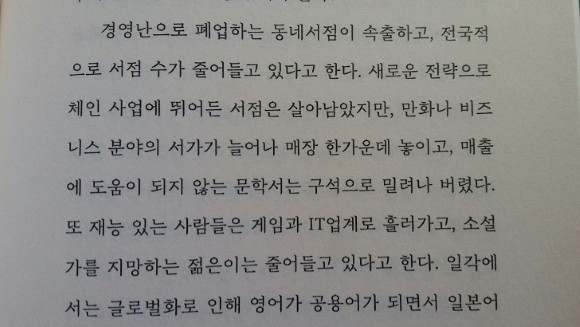
그렇게 솎음질이 되어야 우량이 살아남고 성장한다. 하지만 과연 우리네 인생에서 우량만
살아남아야 하는가가 저자가 가진 의문이고 내가 공감하는 물음이다.
처음에 글을 쓰는 일을 하면서 좋은 책을 만들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책들이 서점 가장 좋은 곳에 전시되길 원했던 바람들이 소박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책이 전시될 서점들이 '솎음질'을 당해 서서히 사라지고 거대 서점만
존재하게 되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아파한다.
소박하게 식물하나 키워내는 일도 '솎음질'이 없으며 우량을 만들 재간이 없어지고
과연 우량만 대접받는 세상이 온당한 일인지를 생각케한다.
그냥 아웅다웅없이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일은 한심한 일이기만 할까.
공평하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에서 씨를 뿌리며 생명을 기다리는 일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저자는 가드닝을 통해 알아버렸다. 그리고 솎음질 없이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다정함까지 곁들인 이 책에서 따스한 햇살이 느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