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 여름, 그 섬에서
다이애나 마컴 지음, 김보람 옮김 / 흐름출판 / 2019년 8월
평점 :



살다가 문득 바다가 그리운 날이 있다. 바닷가 근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면서 왜 늘 삶이 고단할 때마다 바다가 그리웠던 것일까. 인류의 기원이 바다라서 그런 것일까. 내가 처음 지금 머물고 살고 있는 섬에 닿았을 때는 퍽 지쳤있던 때였다. 지금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풍경들이 그 때는 그렇게 새롭고 나를 따뜻하게 감싸는 느낌이었다. 이 책의 저자인 다이애나도 그랬던 것 같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부모밑에서 어렵게 자랐고 직장마저 불안했던 기자 다이애나는 캘리포니아의 어느 농장에서 포르투칼령의 아조레스 섬 출신의 농장주를 만난다. 소를 키우던 남자는 천하태평 모든 것이 긍정 그자체였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고향 아조레스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해마다 여름이면 그 섬으로 가는데 돌아올 때 쯤이면 서글퍼진다고 했다. 다이애나는 문득 그 섬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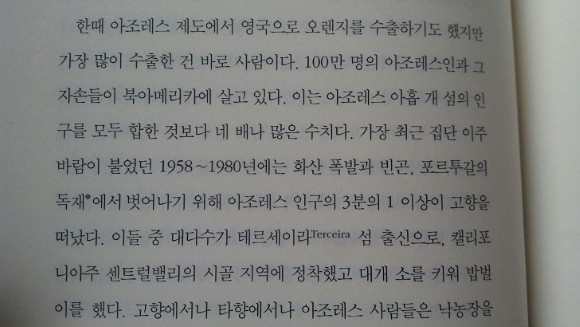
사실 아조레스 섬은 처음 들어보는 곳이다. 대서양 한 가운데 있다는데 대서양에 이런 섬이 있었던가.
책의 어디에서라도 지도 하나쯤 있을 줄 알았는데 살짝 아쉽다. 구글지도를 검색해서 보니 포르투칼에서 1500km쯤 떨어진 바다에 560km거리에 9개의 섬으로 흩어져 있는 군도였다.
아주 오래전 지진과 화산폭발로 생긴 섬들이라는데 고립이라는 섬의 특성상 오랜 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섬 사람들은 거대한 화산폭발을 경험한 후 대거 섬을 떠나게 된다.
미국으로 캐나다로 흩어진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섬을 잊지못해 다시 역이민을 오거나 해마다
여름이면 섬을 찾아온다. 섬을 찾아가게 만드는 매력은 무엇일까? 저자는 그 매력의 섬을 찾아간다.
사실 섬은 많이 지루하다. 오랜 고립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를 접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편견은 이 섬에서 예외가 된다. 투우하면 스페인일 것이라는 생각도 편견이다. 아조레스 섬에서 투우는 풍습 그 이상이었다.
투우사가 칼을 흔드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 소를 자극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표적이 되어 달린다.
울타리 너머 사람들은 그 모습을 즐겁게 지켜보고 표적인 사람들은 때로 다치고 심하면 죽기도 하지만 투우는 섬 사람들이 열광하는 축제다. 그 외에도 축제는 너무 많았다. 저녁 9시는 아직 저녁 먹기 이른 시간이고 새벽 두 세시면 아직 집에 들어가기 이른 시간이라고 했다.
도대체 이런 열정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리고 오랜 시간 축적된 이런 즐거운 유전자는 후손들에게 까지 이어져 세계 어디에 있든 섬으로 돌아오게 하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내가 사는 섬은 불과 30km정도의 거리에 세 개의 섬으로 이어져 있지만 각기 성격이 다르다.
하물며 560km로 흩어진 섬들의 특성은 어쩌겠는가. 섬 사람들은 자기네 섬이 가장 아름답다고 믿는다.
당연하다. 저자는 그 섬들을 돌면서 섬 사람들의 긍정에 사랑에 동화된다.
그리고 늘 곁에 있었지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아마도 섬의 능력은 제대로 뭔가를 알아보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신문사에 퇴직을 신청하고 다시 취직을 하지만 언제나 생활비 걱정은 떠날 날이 없는 도시생활은 고달프다. 그녀에게 '아메리카노'를 외치는 사람들과의 부대낌은 행복하다.
비밀이 없는 섬생활이 때로 부담스럽지만 맘껏 자유를 구가하는 장면은 나도 자유롭게 했다.
그 여름 그 섬에서의 일들은 결국 이 책을 탄생시켰다. 그러고보면 섬은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선사한 셈이다. 그녀가 가장 마지막 사랑을 쟁취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기자생활을 시작한지는 모르겠지만 뿌리하나는 섬에 묻어두고 살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나도 지금 이 섬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