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에 핀 꽃 한 송이에서도 우주를 본다는 말이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책을 읽다보면 알 수 있게 된다.
티끌보다도 적은 지구라는 별에 사는 '나'라는 존재가 바로 또 하나의 별임을.
오늘 뉴스에서는 일반인에게도 우주정거장으로의 여행을 허가한다는 소식을 실었다.
사실 일반인들이 우주정거장으로 간 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인간이라면 한 번쯤 지구 밖 여행을 꿈꾼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떤 모습인지, 우주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하지만 살아생전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일반인이지만 엄청난 거부가 아니면 도전이 불가능한 미션이기 때문이다. 680억? 거기에다 우주정거장에서 머무는 비용까지 더한다니 우리같은 서민들은 그저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쳐다보는 것으로 대신할밖에.
지금은 강화도 퇴모산으로 들어가 망원경으로 별을 보고 산다는 저자는 어려서 형의 말 한마디에 인생의 길이 결정되었는지도 모른다. 별빛이 여기까지 오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지금 저 별이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다는말이
아홉 살 소년에게 우주로의 꿈을 심어주었다.
별에 대한 책을 찾기위해 청계천 헌책방집을 헤매고 결국 나중에는 자신이 출판사를 차려 별과 우주의 이야기를 맘껏 풀어냈을 정도로 저자의 별에 대한 사랑은 남다르다.
나사의 탐사선 보이저 1호가 1990년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명왕성 궤도 부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보면 우리 지구가 얼마나 작은 별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 티끌 같은 별에 70억 인류가 살고 있고 나는 티끌의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되면서
겸허함을 배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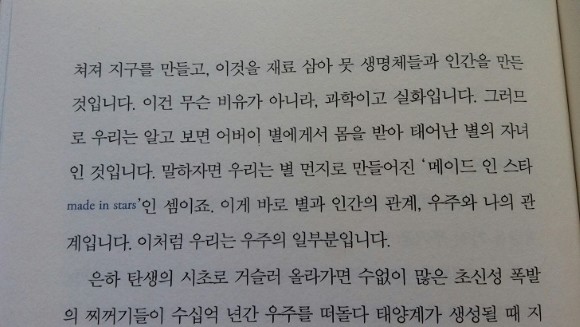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되며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별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반짝 거리는지를 알게되니 이제
밤 하늘의 별들을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할 수가 없다.
우주는 살아있고 별도 살아있고 그 우주에서 나의 삶이 시작되었음은 한 마디로 기적같은 일이다. 그렇다면 신은 우주의 어디쯤에 있었던 것일까.
범죄도시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에서 천문학의 힘을 보여주었다는 일화는 시사하는바가 크다.
방황하는 아이들이 우주의 별에서 느낀 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티끌만도 못하다는 지구에서 아웅다웅 쫌생이로 살아가는 모습이 부끄러웠다고 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허한 세상에 던지는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한다.
물질이 풍요는 정신의 나태로 이어지지만 우주속을 들여다봄으로써 스스로 빛나는 별임을
자각하는 일이 얼마나 큰 자존감을 느끼게 해주는지 정말 천문학의 힘이 어떤 변화를 이끄는지
확인하게 된다.
가까운 시간은 아니겠지만 언제가 우주가 소멸될 것이라는 이론은 더 쓸쓸함을 준다.
이 광할한 우주가 언젠가 소멸된다고?
당연히 지구도 인류도 함께 소멸되겠지.
우주에서 비롯된 우리도 언젠가 우주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이 엄숙하게 다가온다.
'왜 우주를 알아야 할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는 멋진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