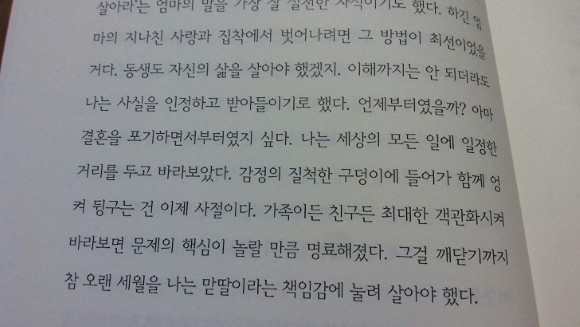가난으로 인하여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막내 동생 동우를
키우다시피했던 그 무렵
육영수여사가 돌아가셨다니 나와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아온 것
같다.
당시 6학년이었던 나는 어렸지만 뭔가 대단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던 것이
떠오른다.
바다에서 삶을 건져 올린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다.
월급쟁이
선장이었던 아버지의 사고로 엄마마저 선박의 녹슨 부분을 털어내는 깡깡이일터로
나서야했던 일이며 엄마를 대신해서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했던 맏딸의 애처로움.
돈을 벌겠다고 떠난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가족을 몰라라했던
일들이 묘하게
나의 삶들과 겹쳐졌다.
부산이 아닌 서울에서 아파트공사장을 전전하며 어린
5남매를 키워야했던 엄마의 얼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