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으면 딴 거 말고
방망이와 공 두개를 넣어주오.
내 묘비에는 딴 말 말고
스트라이크 아웃(struck out)되었다 적어주오.
-유니버설 야구연맹, 샌디 선수의 자작곡 중에서
미국은 장고한 역사라고 자랑할 게 별로 없지만, 그 역사가 긴 문학 이벤트 하나가 "best american short story올해 최고의 단편"가 있다.백년은 훌쩍 넘었고, 이 일만 전담하느라 편집자는 눈이 빠지도록, 어느 누구보다 많이 수천편 읽고 수백여 편 추려내면
여기서 특이하게 한해 명예 편집장처럼 소설가 한 명 선정되는데 이 사람 전권을 발휘 최종 몇 편을 고른다.
고르고 끝이다. 일이삼등 주는 치사한 짓은 않는데, 돈을 주고 받는지, 상패도 주며 시상식하는지, 자축하고 넘기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지 알 수는 없지만.
뽑힌 사람들은 책 한 권 못 내어보고 십년 세월에 잊히기 십상이지만 몇년도 해당 무소불위 심사위원에 촉구되면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지 않을까.(다들 이미 명예의 전당에 오른 스타 작가라도)
1986년 죽기 이태 전의 레이먼드 카버가 선정작을 뽑았다. 당연히 그의 작품처럼 치고 들어오는 단타, 간결한 문장, '옆눈으로만
흘긴 현실의 단면/단편/단원'그리는 작품이 주로다. 이미 필명이 난 작품들도 배분 차원에서 몇 편 끼워넣었는데,
카버의 분위기 좋아하고, 유명 작가들도 겸사겸사 만나고 아예 방향 전환을 한 작가들의 초기작을 만나고 싶으면 일독을-.
딱 하나 싹 다른 분위기 돈 드릴로의 작품이지만. (그래서 편집진에서 우기지 않았을까 넘겨 짚어 보기도 했다)
어쨌든 비슷한 분위기를 이어가는데, 어째 소재들이 '청소년기 경험'우세하고 '사냥'에 치우치더니, 급기야 청소년이 사냥에 나가는 '스포츠 라이터'의 작가, 리처드 포드의 단편에 불현듯 나는 사냥 이야기를 싫어하는구나' 깨달았다.
뒤이어 안드레 드뷔스의 단편집을 읽다가 유난히 '야구'이야기가 많이 나오기에 못 알아먹을 이 '전문용어'에 나는 야구 이야기도 싫어하는구나 절감했다.
그렇게 싫은 이야기들 솎아내어 보니,
'사냥'(낚시는 이상하게 괜찮다), '군대'(군대가 벌이는 전쟁, 주둔지 이야기도 동일), 야구(및 스포츠)도 싫어하고
정치, 성공담, 대놓고 연애 이야기, 소재로만 접근하는 사회문제 이야기도 싫다. 특히나 병원에서 피흘리는 이야기 질색이다.
즉, 군비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쥐잡듯이 잡아대던 재선 국회의원들이 뒤풀이 회식에서 군대에서 야구하던 이야기 하다가
아니꼬웠던 한 의원이 '니 어느 부대 출신이고' 삿대질로 물었다가, 뜨금한 상대가 주먹질로 화답, 병원으로 실려가는 이야기?
이렇게 입맛 안 맞는 이야기들 다 빼면 읽을 거리가 동화책 말고는 몇 권 남지도 않지만 계속 읽어가는 이유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야구'처럼 역시나 실망할 줄 알면서도 혹시나 맥주캔 옆에 끼고(?) 구장을 향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
1. 로버트 쿠버, 유니버설 야구연맹 법인, 부제 소유주 J. 헨리 워는 야구로 가득한 이야기다.
유니버셜 야구연맹 56회차 연맹전에 갓 스물의 '루키' 데이먼 러더퍼드가 퍼펙트 게임에 여섯 이닝 남겨놓고 있는데서
시작을 하고, 이를 관전하는 헨리는 똥줄이 탄다. 연맹 역사에 한번도 없던 일이기 때문이다. 선수들이 들고 나고, 치고 달리고, 고전을 하며 아슬아슬하게 이 젊은 선수 '퍼펙트 게임'을 이뤄내고, 관중들이 몰려내려와 어깨에 걸머 매고 축하를 하는데
이 현란한 게임은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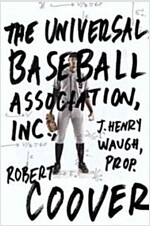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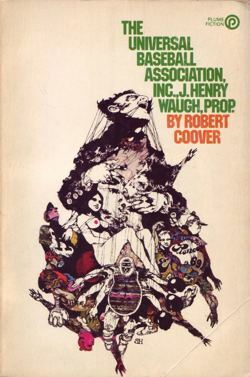
(스포일러----------)
먼지 가득한 야구장이 아니라, 50대 후반 회계사, 헨리 워의 부엌 식탁위에서 벌어지는 야구 게임이다.
실제 게임도 지루하고, 카드게임들, 핀볼도 너무 단순해 마음에 차지 않던 이 중년 독신,
주사위 세 개를 굴러, 수많은 확률들을 일일이 통계에 철저를 기하며 배분을 하고, 선수별 경우의 수에 따라 또 세분,
여덟팀, 스물한 명 이름까지 붙여가며, 그들의 퇴진과 이군 방출, 향후 진로까지 신경쓰고 그 코치와 구단주, 노조와 언론, 협회장, 내용까지 살을 입히며 보고서를 쓰고 기록하였다. 땀과 지력으로, 시간낭비와 체력 소모, 사직 위험까지 무릅쓰고
일상의 대부분을 야구장 위에서 살고 있다. 남다르게 애착이 가는, 애지중지하는 신입 루키 투수 녀석,
연맹의 규칙을 살짝 어겨 얼마 쉬지 못하고 투수로 투입, 기특하게도 세계 기록을 향해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
하지만 세계 기록까지 딱 2이닝 남겨 두고 타석에 섰다가, 확률이 똑같지만 더 의미를 두는 연속 숫자 111,세번, 그 1/216의 3승의 확률을 맞아, '아주 드문 경우/벼락 맞을 확률'의 차트에 따라,
'투수의 빈볼에 맞아 머리가 쪼개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다. (여기까지 책 1/3)
2 이 책 리뷰글 중에 야구는 비극이라고, 미국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만.

기다림과 실망과 좌절, 패배와 울분으로 점철한 비극이라고.
돈 드릴로의 (좌익 외야) 벽 앞에 선 파프코는 부제가 '언더월드의 프롤로그'라고 붙은 90페이지 중편이다. 이게 먼저 나왔고
조금 갈무리해서 칠백여 페이지 언더월드에 들어갔다고 한다.
1951년 뉴욕 자이언츠와 브루클린 다져스 사이 최종전 실제 있었던 시합과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와 버무렸다.
크게 흑인 소년 코터, 몰래 틈입하려던 무리에 운좋게 숨어들어 사람들이 로프코가 올 때마다 닿아보겠다고 종이쪽을 흩어대는 외야 3루수 관중석에 있고, 박스 석에 프랭크 시나트라와 3인방이 에드거 후버와 관람을 하고, 목이 쉰 아나운서 러스는
중계석에서 중계를 하고 있다. 이 주요 인물들 외에 '파편'으로 부서지는 여러 인물들이 한문장, 한 구절로 섞여 들고
자이언츠의 톰슨이 1:4로 뒤지던 9회말 상황에 막판 뒤집기 홈런을 치고, 사람들은 야구장 내외로 온통 광란의 환희에
휩싸이고 이순간 에드거 관중석에서 집어던지는 온갖 쓰레기 중 하나에서 잡지 두 쪽 그림 브뤼겔의 '죽음의 승리'를 집어들고 그 공 쫓아간 망연자실 파프코 벽을 넘긴 공을 쳐다보고 있다. 코터는 운동장 내 난리와 또 다르게 떨어진 공 잡으려는 그 짧은 싸움에 휘말리는데-
3 필립 로스도 야구광으로 유명해. 그래서 '위대한 미국 소설'을 썼다고 한다.

43년 2차 대전 신병 훈련장소로 구장을 내준
야구단이 전국을 떠돌며 순회 시합을 벌이는 내용이라고 하며,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책.
드릴로의 '언더월드'는 마오 II에 준하여 중요한 작품인데다, 호평을 받은 책이라 번갈아 출판해대는
작금의 경쟁적인 분위기에 십중팔구 번역되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68년 어언 50년 먹은 쿠버의 작품은 글쎄, '파프코'에 버금가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중견작가 드릴로에 꿀리지 않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 많은 장편들은 다 제쳐두고 겨우 출판된 게 몇 편 안되는 단편선,
역시나 이번에도 '메타픽션/이게 동화라는 걸 너도알고나도안다' 재해석/해석거부 동화류 단편 (요술부지깽이, 민음사)이 전부이고, 아마 대표작이라고 하는 '대중 화형식, public burning(로젠버그 이야기와 닉슨 이야기가 섞인 정치가 한몫을 하는 작품)은 아마 두어 발짝 뒤쳐진 '작가'라서 나올리는 없지 않을까 넘겨짚어 본다.
SF라고 보기에 무겁고, 블랙 코메디라기에는 가벼운 책,
야구 이야기로 가득 넘쳐나는 책, 따라가지도 못할 이름과 용어들로 범벅인 책 그래도 끝까지 읽은 이유,
하지 않은 이야기, 뺀 이야기, 숨은 이야기가 다른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며,
밀린 공부가 산더미라 동계 휴식에 들어가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