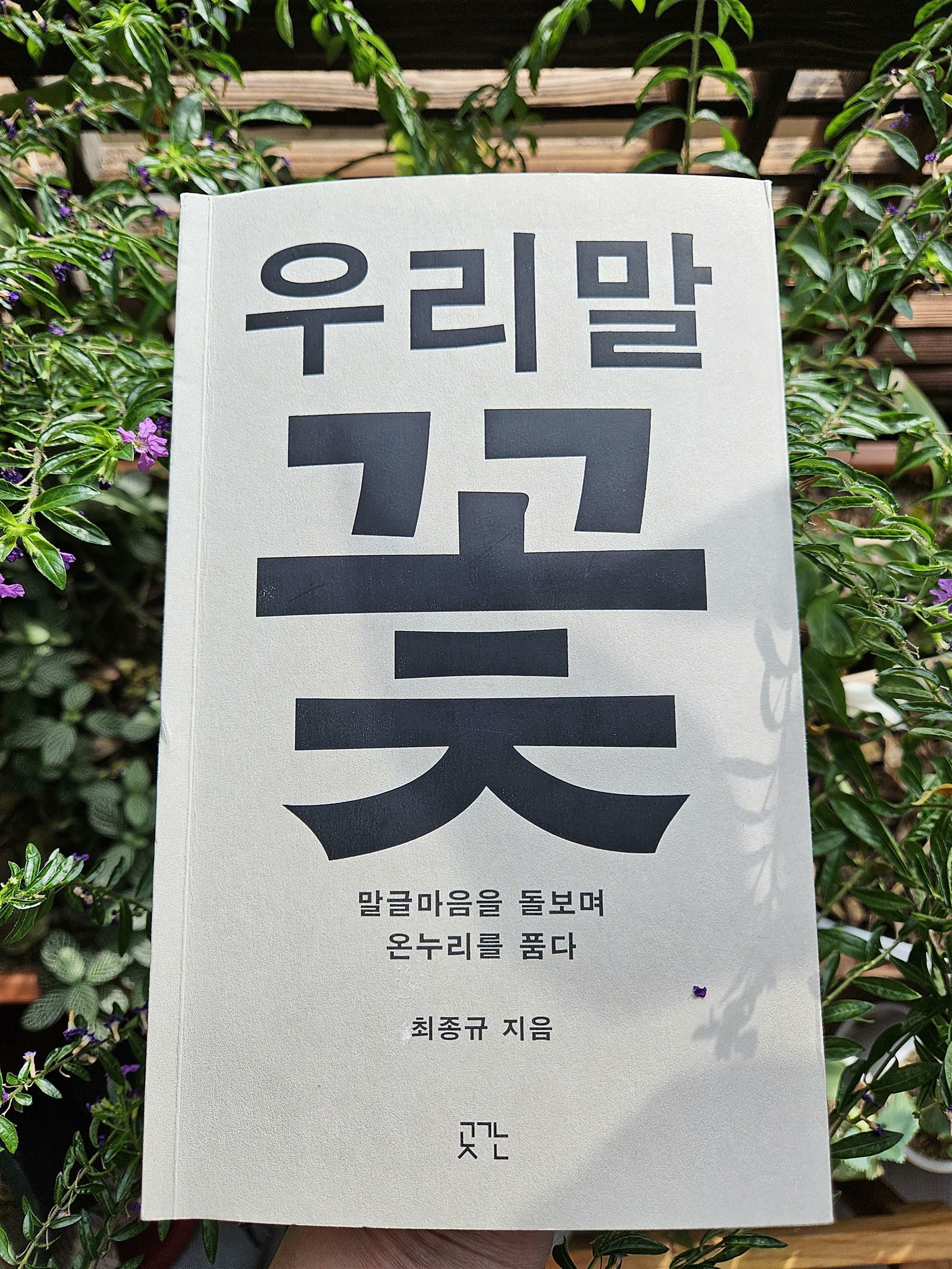-

-
우리말꽃 - 말글마음을 돌보며 온누리를 품다
최종규 지음 / 곳간 / 2024년 1월
평점 :



작게 삶으로 82 글쓰기 길잡이
《우리말꽃》
최종규
곳간
2024.1.31.
《우리말꽃》을 펼친다. 겉 종이에 '꽃' 글씨 하나가 꽉 찼다. 눈에 확 띄게 썼을까. 궁금해서 얼른 여는꽃을 읽는다. 글쓴이는 책이름처럼 ‘여는말’이 아닌 ‘여는꽃’이라는 이름을 새로 지었다. 이 ‘여는꽃’을 읽으니, 글쓴이가 걸어온 길이 죽 흐른다. 어릴 적에 인천 바닷가에서 놀며 들은 말에, 이오덕 어른이 남긴 글을 추스르면서 이웃에서 만난 연변사람 말씨를 들은 하루에, 이제 전남 고흥 시골로 옮겨서 새·풀꽃나무·비바람·흙·별을 동무하는 삶을 말빛 하나로 옮긴다고 한다.
여는꽃 다음으로 닫는꽃도 읽어 본다. ‘여는꽃’이 여는말이듯, ‘닫는꽃’은 닫는말이다. 무슨 책을 맨앞과 맨뒤부터 읽느냐고 할 수 있지만, 열고 닫는 말이 글쓴이 마음을 스스로 간추려서 들려준다고 여겨서 둘을 먼저 읽어 버릇한다.
《우리말꽃》을 쓴 사람은 ‘국어학’이라는 일본말을 쓰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 말글로 담을 적에 스스로 꽃처럼 피어나리라 여겨 ‘우리말꽃’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나 같아도 ‘국어학’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겠다. 우리말꽃, 여는꽃, 닫는꽃, 이런 이름은 어린이도 문득 눈을 반짝이면서 “무슨 이야기일까?” 하고 궁금하게 다가설 수 있구나 싶다.
책을 천천히 읽어 본다. 나도, 둘레 사람들도, 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말은 거의 일본말씨에 옮김말씨(번역체)에 한자에 길들었구나 싶다. 어느 모임과 얽힌 일을 떠올려 본다. 예전에 어느 모임에 글을 낸 적 있는데, 내가 쓴 글에서 쉬운 우리말을 편집부에서 한자말로 고쳐 놓았더라.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고, 그 모임에서 내놓는 책을 받아보고서야 뒤늦게 알아서 놀란 적이 있다. 편집부에 전화를 걸어 '나는 이런 말씨를 안 써요' 하고 따진 적이 있다.
나도 적잖이 일본말씨에 물들었겠지. 그러나 문학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씨에 물든 줄 잘 모르는 듯하다. 우리는 일본이 과거를 뉘우치지 않는다고 나무라는데, 우리로서는 일본한테 식민지를 살면서 물들거나 길든 말은 아직 뉘우치지도 씻지도 않는다. 일본 그늘에 억눌리면서 억지로 써야 하던 말이 어느새 다들 몸에 굳고 마음에 뿌리내린 듯하다.
우리 짝이 얼마 앞서 ‘내용증명’을 쓴 적 있는데, 어려운 한자말에 ‘-으로부터’ 같은 말을 잔뜩 써놓더라. 옆에서 이 내용증명을 읽어 보다가, 우리는 이렇게 쓰지 말자고 했는데, 짝꿍은 이런 말씨를 써야지, 받는 쪽에서 말귀를 알아먹는다고, 쉬운 우리말을 쓰면 말힘이 안 난다고 하더라.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 짝은 ‘내용증명’에는 “니가 쓰는 글결로 쓰면 말이 여려서 안 돼” 하고 덧붙이더라. 왜 안 되냐고 되물었지만 고치지 않았다.
나는 틈틈이 시를 써 본다. 수필이라기보다는 삶글도 써 본다. 둘레에서는 한자로 ‘수필’이라 하거나 영어로 ‘에세이’라 하는데, 나는 둘 다 내키지 않아서 ‘삶글’이라는 이름으로 내 하루를 글로 적어 본다. 그런데 시를 쓰는 여러 이웃들은 한자말을 넣어야 문학이 깊다고 힘주어 말한다. 일본말씨나 옮김말씨를 쓰지 않으면 문학맛이 안 난다고들 한다.
다시 《우리말꽃》을 읽는다. ‘구체적’(217쪽)을 다루는 꼭지를 눈여겨본다. ‘구체적’이라는 일본말씨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말도 글도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어떤 우리말로 차근차근 짚고 풀어낼 수 있는지 하나하나 들려준다. 그러고 보면 ‘구체적’이라 할 적에는 오히려 또렷하지 않다. ‘구체적’을 쓰지 않고 어느 무엇을 콕 짚어서 말할 적에 환하게 드러난다. 낱낱을 밝히면 될 텐데, 두루뭉술하게 글을 써서 문학이라고 내세우려니까 ‘구체적’ 같은 말씨를 못 버리는 듯하다.
《우리말꽃》은 우리 말밑(어원) 이야기도 곳곳에서 들려준다. 글쓴이는 국어사전을 쓰는 일을 하면서 말밑도 캐낸다고 하는데, 우리말 '가시내'는 시내와 뫼(갓)를 품은 큰말이라고 들려준다. 여태 생각도 해보지 못한 대목이다. 그냥그냥 쓰고 듣는 말로만 여겼는데, ‘가시내’도 ‘머스마’도 말밑과 말결이 깊구나. 겨울이 저물 무렵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들꽃은 ‘봄까치꽃’이 아닌 ‘봄까지꽃’이라는 이름이라는 대목도 곱씹는다. 왜 ‘까치’라고 하는지 알쏭했는데, 수수께끼를 풀었다.
나답게 살자는 말을 곧잘 외쳤다. 누구나 누리고 싶은 '자유'일 텐데, '나답게 나다움 나는 나'처럼, 바로 이 ‘나’와 ‘날개’가 한자말로 ‘자유’를 나타내는 줄도 곱씹는다.
《우리말꽃》은 글쓴이가 내 앞에서 이야기하듯 눈으로 읽는데 쩌렁쩌렁하게 들린다. 시나 문학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하지 말고 에둘러 말하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담 너머 구경하는 말은 하나도 없다. 에둘러 말할 수 없을 만큼 바르게 말을 한다. 에둘러 가다 보면 엉뚱하게 샛길로 빠지기 쉽겠지. 빙빙 에두르기 때문에 오히려 내 생각에 따라가지 않으면서, 불구경을 하듯 나를 잊을 수 있겠지.
나는 가끔 고개를 갸웃하거나 멍하다. 문학을 하는 분들은 으레 시와 글을 다르게 가르는데 왜 갈라야 하는지 모르겠다. 시를 쓰려면, 이름난 분들이 내놓은 시를 읽어야 하는 듯 여기고, 이름난 잡지에 실린 시를 알아야 하는 듯 여기고, 이런 이름난 잡지와 책에 실린 시를 따라가야 하는 듯 여기더라. 그렇지만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시는 ‘시를 쓴 분들 이름값’은 아니라고 본다.《우리말꽃》을 쓴 분은 “어린이는 이름값을 따지지 않고 줄거리에 빠져 이야기를 즐긴다.(174쪽)”고 들려준다. 그렇다. “이름값을 안 보면서 읽어야 마음에 눈을 틔운다(174쪽).”라는 대목을 새롭게 되새겨 본다.
2024년 2월은 여러모로 바쁘다. 여태까지 열한 해를 해온 가겟일을 접기에 힘들고 바쁘다. 쌓인 짐을 들어내고 쉴새없이 일하는데,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던 어린이들이 빠끔히 들여다보면서 묻는다. "아줌마, 여기 왜 이래요?" 나는 어떤 말을 하면 이 어린이들이 바로 알아들을까 어림하면서 눈알을 돌리다가,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 눈높이를 맞추면서 “응, 이제 우리 여기서 가게를 그만하거든. 그래서 가게를 치우느라고 이렇게 좀 어지럽고 바쁘단다.” 하고 말했다.
곰곰이 생각해 본다. 우리가 쓰고 읽을 글도 이렇게 늘 어린이 눈높이를 헤아리면서 쓸 적에 빛날 텐데 하고 새삼스레 깨닫는다. 마음을 담은 말을 사랑스럽게 혀끝에 얹어서 소리를 내어 보면, 내 목소리를 나부터 내 귀로 듣는다. 문학도 비평도, 모든 글도, “다섯 살 어린이한테 말하듯이 글을 써야 말결이 살아난다.(347쪽)”라고 들려주는《우리말꽃》은 나를 일으켜 세우면서 든든히 잡아 주는 길잡이 같다. 우리말로 담아내는 낱말 하나가 무엇인지, 이 낱말을 엮어서 글을 쓰는 길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새롭게 돌아본다. 두루 길을 터주는구나.
이제 책을 덮는다. 글쓴이는 남들이 쉬이 가지 않는 길을 뚜벅뚜벅 홀로 걸어온 분 같다. 숲을 사랑하고, 새가 내려앉는 나무를 쓰다듬고, 해와 별을 헤아리며 깃드는 조용한 마을에 살면서, 이 모든 마음을 글에 녹인 듯하다. 말더듬이였던 어린 날이었기에 우리말을 쉽게 살리는 길을 걸었고, 썩 쉽지 않은 길을 호젓이 걸어서 함께 나누려는 글을 내놓는구나 싶다.
우리 짝은 시골에 계신 어버이 말씀을 잘 듣는다. 말을 잘못하면 바로 꾸지람을 듣는다. 《우리말꽃》 글쓴이도 우리 아버님처럼 타이른다. 글을 쓰고 싶어 하는 나한테는, 틀리면 바로잡아 주는 틀이다. 남 눈치 살피지 않고 말한다. 길잡이가 하는 말이요, 글잡이가 되도록 이끈다. 참사랑을 담은 말과 글은 사랑을 듬뿍 받지 싶다.
2024. 2. 27. 숲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