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에 읽은 이택광의 <버지니아 울프 북클럽>은 좀 실망스러웠는데, 이번에 읽은 알렉산드라 해리스의 <버지니아 울프라는 이름으로>는 아주 좋았다. 짧은 분량이 아쉬울 뿐이었으니.
버지니아 울프의 대표적인 소설과 에세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책들과 함께 읽으면 더욱 좋을 듯. 다 좋은 책들이었다.
올해에는 읽다 만 <막간>이나 <제이콥의 방>, 그리고 아직 구하지 못한 허마이오니 리의 버지니아 울프 전기를 읽고 싶다.







독창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줄거리였지만(출항), 울프는 이 흔한 소재를 가지고 모종의 아스라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엮어냄으로써 뚜렷한 형태로 구체화되기를 거부하는 어떠한 의미를 가리켜보였다.
...이 침묵 속에는 여자들에게 주입되어 있는 수동성에 대한 울프의 맹렬한 비난이 깃들어 있지만, 그런 맹렬함이 터져 나올 만한 직접적 통로는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테렌스는 아무도 대변해주지 않는 여자들의 시각을 떠올리면서 "피가 끓지 않습니까?" 라고 묻지만, 독자의 귀에 들리는 것은 레이첼이 마음속에 떠올리는 막연한 대답과 레이첼이 겨우 꺼내놓는 양보와 타협의 몇 마디 뿐이다. 67

<밤과 낮>은 이행의 순간들에 주목하는 소설이자 "관습적 문체"가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하고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한 소설이자 마구 뻗어나가던 책 전체를 끝부분에서 하나의 단순하면서도 비전의 속성을 띠는 이미지로 압축하는 소설이다. 캐서린이 랠프와 함께 환한 가로등길을 걷는 장면이다.
"불가사의한 수수께끼가 풀린 느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느낌이었따. 우리가 혼돈과 혼란으로부터 평생을 바쳐서 다듬어내고자 하는 비뚤어짐 없는, 모자람 없는, 허술함 없는 유리구슬을 캐서린은 아주 짧은 순간 두 손에 담은 느낌이었다."
울프의 이후 소설들이 지향하는 선명한 비전을 미리 일별할 수 있는 순간이다. 77-78

<밤과 낮>은 울프의 전시 소설이다 (1918년 가을에 전쟁이 끝나면서 이 소설도 완성되었다). <밤과 낮>을 쓰는 동안 바람결에 실려 오는 소리들 중에는 프랑스 북부의 포탄소리도 있었다. 낮게 우르릉거리는 죽음의 소리는 약했고, 멀었고, 어떤 일상과도 잘 어우러지지 않았다.
나중에 <등대로>에서 울프는 앤드류 램지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꺽쇠 괄호에 넣게 된다. 그래서 전쟁이 비현실적이고 먼 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전사가 충격적인 죽음, 개죽음이라는 느낌은 그만큼 더 강해진다.
혹자는 울프가 자기 시대의 대규모 분쟁들을 직접 다루지 않은 작가라고 비판하지만, 울프의 모든 전후 소설들은 우리가 전쟁으로 무엇을 잃어버렸나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작품들이다. 79
울프에게 일기는 소설과 마찬가지로 삶의 덧없음에 저항하는 방법들 중 하나였다. 하루하루가 기록도 없이 그냥 흘러간다는 생각이 울프에게는 상실감의 원천이었다.
"삶이라는 수돗물이 그냥 허비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울프였다.
버지니아가 기록하고 싶어 하는 일 중에는 외적으로 보면 아무 것도 아닌 일들도 있었다. 버지니아에게 더없이 행복한 하루는 더없이 조용한 하루인 경우가 많았다. 버지니아와 레너드는 일과표를 준수함으로써 모종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하루하루에서 커다란 기쁨을 느꼈다.
.... 1922년 어느 목요일의 하루 일과를 완수한 버지니아는 그 날을 가리켜 "아름다운 서랍들을 아름답게 조립해서 만든 완벽한 캐비닛 같은" 날이었다고 했다. 버지니아에게 깊은 만족감을 안겨운 하루였다.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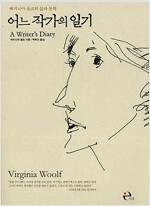
"삶이라는 수돗물"은 그렇게 울프의 일기와 편지를 채워나갔다. 87
과거와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울프의 머릿속에 문득 소설 한 편의 형태가 떠오른 것은 평소처럼 타비스톡 스퀘어를 산책하던 1925년 봄의 어느 날이었다. 울프의 다른 많은 소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떠오른 형태가 끝까지 유지되었다. 울프는 산책에서 돌아오자마자 노트에 "H" 모양을 그렸다. ("두 개의 직사각형이 한개의 선으로 연결된 모양")
과거, 중간 휴지,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 이렇게 세 부분이었다. 이 단순한 구조가 <등대로>의 플롯이자 요점이었다.
울프 자신도 인정했듯이 <등대로>는 가족력의 유령들을 잠재우는 작업이었다.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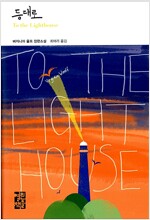
바로 이런 단순한 사실에 감정적 무게를 실을 수 있다는 것이 울프의 특징이자 강점이다. 울프는 어떤 면에서는 복잡미묘한 작가지만, 울프가 늘 추구하는 것은 아무 군더더기 없는 더없이 단순한 문장이다.
완성을 앞둔 릴리에게 남은 일은 화폭의 중심에 선 하나를 긋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 선은 바로 그 선이어야 한다.
"계단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고 그림은 아직 어렴풋했다. 갑자기 맹렬한 기세로, 마지 그 선이 한순간 눈앞에 나타나기라도 한 듯, 릴리는 거기에, 중심에 한 선을 그었다."
울프는 이런 분명함의 경험들을 설명할 수 있는 모종의 철학을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었다. 어렴풋했던 것들이 아주 잠시 분명해지는 충격적이거나 계시적인 순간들을 울프는 살면서 계속 경험해오고 있었다. 129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은 울프에게 깊은 만족의 원천이었고, 자신의 돈이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물건들로 번역된다는 사실은 울프 자신에게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상상력의 산물들을 꽃병이나 의자로 바꾸어놓는 돈의 연금술 앞에서 울프는 항상 경이로워했다.
<댈러웨이 부인>으로 번 돈은 몽크스 하우스에서 욕실 하나와 화장실 두 개로 바뀌었고 (그 중 하나의 이름은 '댈러웨이 부인 화장실'이었다.)
<등대로>로 번 돈은 자동차로 바뀌었다. 자동차는 정신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점에서 <자기만의 방>에서의 고급 런치와 같은 기능을 한다 (좋은 글은 정신의 풍요로움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울프 부부의 싱어 자동차 (애칭은 '등대')가 울프의 정신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주었는지는 <올랜도>의 문장 속에서도 감지된다. 장면이 휙휙 바뀌고 세상이 활짝 열린다.
.... <올랜도>로 번 돈은 몽크스 하우스에 울프의 새 침실을 마련하는 데 들어갔다. 146-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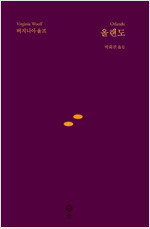
실제로 울프는 <세월> 곳곳에는 사실들에게 극도의 아름다움을 허용함으로써 자신이 일상의 것들을 미학적 쾌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솔직하게 보여준다. <세월>은 어른거리는 물그림자 같은 작품, 정확히 포착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작품이고, <세월>의 등장인물들은 "또 다른 삶", "또 다른 세상"에 대한 막연한 비전을 어떻게든 표현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세월>에서도 이면의 패턴을 찾는 일이 걔속된다는 뜻이다.
엘리노어는 이렇게 자문해보기도 한다.
"그 패턴을 만드는 건 누구일까? 그 패턴을 생각해내는 건 누구일까?" 183-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