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바다의 뚜껑
요시모토 바나나 지음, 김난주 옮김 / 민음사 / 2016년 7월
평점 : 



요시모토 바나나나, 에쿠니 가오리나, 히가시노 게이고나 어찌나 우리나라에서 책이 자주 나오는지 바나나 책에 이런 책이 사실 있는지도 몰랐다. 워낙 일본소설에 관심이 많다보니 간혹은 그냥 일본소설란으로 검색을 해 보다 걸려든(?) 책. 바나나나 가오리나 이제 소장욕은 바이바이~했으면서도 그녀들의 신간이 보이거나 내가 모르는 책이 보이면 언젠간 읽어야지! 이런 기분이 들어서 꼭 사게되거나 어디서든 구해 읽게된다. 근데, 아직 에쿠니 가오리는 질린거 까진 아닌데 읽을때마다 그래도 뭔가 새로운 기분이 들것만, 어째 요시모토 바나나의 이야기는 읽을수록 키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분이 든다. 물론 내가 그녀의 책을 완벽히 다 읽은것도 아니라서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오류를 일으키는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읽은 책들에 한에서는 다 어째 거기서 거기인 느낌.
작가의 색채라는 게 있어서 자신만의 색을 가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독자들은 대체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길 원하지 않나? 나만 그런가? 그녀의 이야기에서 치유 받는 느낌을 갖긴 하지만 그게 늘 나오는 책의 패턴이 똑같다면 차라리 그녀의 최애 작품인 키친만 주구장창 읽어도 별다를 게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녀의 새 책이 나오면 호기심을 갖는 나도 이러나저라나 뭐라 할 수도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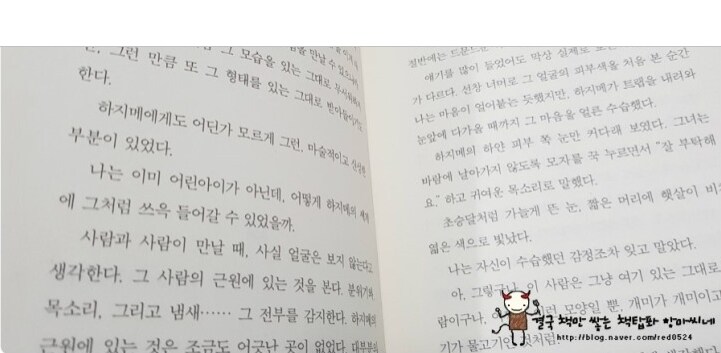
늘 그녀의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상처받은 여인. 대체로 그녀들은 누군가를 잃는다. 사랑의 배신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죽은 이들을 못 잊는 사람들에 대한 치유의 이야기가 많다. 예의 그런 인물이 여기서도 등장한다. 이번에는 할머니를 잃고 집안 재산싸움으로 방황하는 하지메라는 여자. 그리고 주인공인 마리. 서로가 서로를 어찌보면 치유해 주는 것 같지만 글쎄, 그냥 과거를 그리워하고 어릴적에 이랬던 고향이 지금은 쇠락해 가는걸 안타까워 하는 마리는 늘 과거에만 살고있고, 추억에만 젖어있는 기분이 든다. 뭐든 발전하는 것도 있고, 사라지는 것이 있으면 또 새로 생겨나는 게 있는게 세상사 살아가는 이치거늘. 하긴 나도 고향이 변해도 너무 변해서 이제는 거의 찾아가지 않게 돼 버렸지만 그것도 하나의 변화로 받아들이고 나니 그다지 그리운것도 없다. 이제는 그냥 지금의 세상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지.
암튼, 바나나 글의 배경은 또 해변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 늘 읽어도 새로움이 안 느껴지는 지 모르겠다. 꼭 읽다보면 내가 전에 읽었던 요시모토 바나나 글의 어느 한 부분인 듯한 기분. 같은 작가의 작품이니 그러려니 하지만 자기글을 자기가 복제하고 있는 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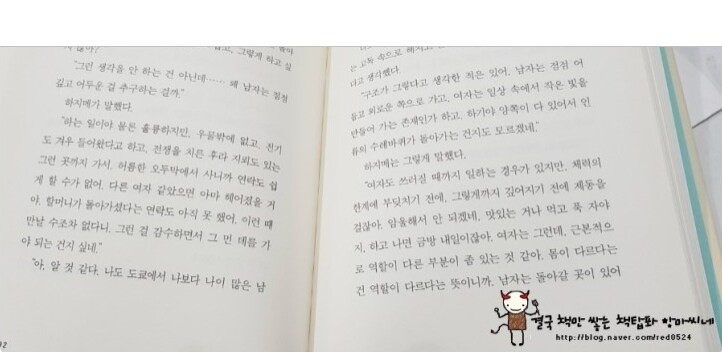
이제 이런 치유는 그냥 이 정도 읽었으면 되지 않았을까나. 이미 사 놓은 그녀의 책은 어쩔 수 없지만..ㅠㅠ
앞으로 새로 나오더라도 크게 호기심이 일지 않을 듯 하다. 습관적으로 찾아보는 작가다보니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지만 더이상 새로울게 없다. 자가복제로 이름과 장소만 바뀌는 기분. 결국 소장욕을 일으키지 않는 작가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키친에서 시작에서 키친으로 끝난다. 더이상 새로울 게 없는 그만그만한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