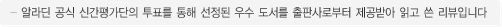[어쩌다사회학자가되어]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어쩌다사회학자가되어]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어쩌다 사회학자가 되어 - 피터 버거의 지적 모험담
피터 L. 버거 지음, 노상미 옮김 / 책세상 / 2012년 5월
평점 :

절판

기독교역사학자이신 어느 교수님께 어느 학생이 물었다. 언제 그 일을 하기로 마음 다짐하셨느냐고. 학부에서 영미문학을 공부하셨다고 알고 있는 우리에겐 영미문학과 미국종교학의 거리감이 상당했으니까, 여쭤볼 만도 했겠다. 그때 아마도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더랬다.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있는데, 그 후로는 돌아보지 말고 주욱 걸어나가는 거라고. 잘은 모르지만, 고개가 끄덕여진 건, 교수님의 삶의 궤적을 어렴풋하게나마 주워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만해도 반 등수로 전공을 정하던 그 시대에 공부를 잘 한다는 이유로 영문학과에 원서를 넣으면서 아주 오랜 후에 종교사를 공부하고 또 가르칠 거라 예상할 수 있었을까? 그 럴 리 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지, 한 해 전만해도 지금 이 사무실에 앉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될 줄은 나도 몰랐으니까.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이다. 지금 여기에서 뒤를 돌아보면 어딘가를 향해 내가 걷고 있다고 결론짓게 된다는 것이다. 어머나, 뭔소리야? ‘어쩌다 사회학자가 된’ 피터 버거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명확/알쏭달쏭 해질 지도 모르지.
이렇게 피터 버거를 알게 되다
피터 버거. 사회학에 대해 이름은 들어봤지만, 무엇을 하는 전공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내가 이 책을 읽고 알게된 건 무지하게 많다. 사회학이 어떤 건지 구경도 했고, 종교사회학이란 분야가 있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기독’이라고 쓰고 개독이라 읽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교회와 삶은 (신앙의 문제로 파고 들면 삼천포로 빠지게 되니 각설하고) 잘 나눠 놓는 게 마음이 가벼운 법인데, 종교사회학이란 걸 전공해버리고 나면, 일도 삶도 뭣도 다 종교라는 틀 안에서 애매모호한 채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걸 구경했다고나 할까? 그런 일을 하다보면 개인의 종교적 색채가 변하는 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피터 버거도 그랬으니까.
내 머릿속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책의 다양한 부분에서 조금씩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뭔가 부끄럽게, 혹은 민망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건 없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으니까. 자신이 공부해 온 흔적을 살피는 것도, 그때그때 했던 고민들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아주 사소할 수 있는 진리를 알았달까?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조언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아는 것 자체가 뭐 그리 중요한가에 대해 고민했다. 행동을 하기 위한 동인으로 아는 것이 존재해야지 단순히 알고만 있으면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냐고 따져묻고 싶은 적도 많았다. 하지만, 그래,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지침은 각자가 알아서 자신에 맞게 움직이면 되는 거다.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알게 된 것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남에게 어떤 걸 하라고 강요할 순 없다는 걸 계속해서 깨닫는다. 피터 버거가 시종일관 꺼내는 말은, ‘알았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알고 나니 궁금해졌고, 사람을 모아 이야기를 나눴고, 흥미로운 주제를 찾았고, 또 알기 위해 연구했다. 연구하다보니 새롭게 알았고, 알게 된 것을 써서 나누었더니, 무엇인가가 변했다.
워낙에 사회학에 대해 아는 게 없다보니, 알아들을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관심은 생겼다. 베버의 저작과 방법론도 궁금해졌지만, 뭣보다 <의심에 대한 옹호>에서 피터 버거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정말이지 궁금하다. 이렇게 아는 것이 책을 타고 전해질 수만 있다면,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게 되겠지?
정해지고 나면 정리가 되는, 구슬이 꿰어지는 놀라운 인생사.
앞서 언급한, 역사학자이신 선생님의 말씀 중에, 현재가 과거를 결정한다.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와 같은 문장이 있었는데, 정확한 건 후자인 것 같다. 어쩌거나 그렇다. 피터 버거가 마지막에 기차장난감 얘기를 꺼낸 걸 봐도.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면 재미없어지니까, 어쩌다로 시작했지만 알고보니 난 떡잎부터 그랬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노렸을 지 모른다.
하지만, 나도 (어쩌면 그대에게도) 마찬가지다. 배우가 되겠다고 대학로를 배회하던 그 시절에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행사로 짤막한 연극을 올리겠다고 밤마다 남아서 연습을 하던 어린 내 모습을 자주 떠올렸지만, 지금은 뜬금없이 내 눈을 바라보며 “너같은 눈을 가진 애들은 문학을 해야 해.”라고 말하던 학원 국어 강사의 말이 더 자주 생각나니까. 하긴 뭐, 쿠데타가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개인적인 얘기 더 해서 뭐하나. 연말이 되면 더욱 진하게 느낄 수 있겠지. 현재가 과거를 어떻게 정리해버릴 지를!
제목이 주는 무게감이 상당해서 책을 덮는 내내 ‘어쩌다’를 생각했지만, 정작 피터 버거는 어쩌다라는 말을 다양한 곳에 쓰지 않는다. 단 하나,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사회를 알아야겠어서 선택한 것이 사회학이라는 그 사실 하나에만 쓴다. (아니 어쩌면 내가 그렇게 읽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이후에 군 징집과 이어지는 생계유지수단때문에 사회학자의 길에 더욱 깊이 들어가긴 하지만, 확실한 건 원치 않았는데 자꾸 빨려들어간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분명히 즐겼고, 자발적으로 걸어갔다. 그 점이 너무나 좋았다.
“난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연기를 한다.”고 말했던 선배님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어린 마음에 나는 이것저것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내가 좋아서 연기를 한다고 말하는 선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젠 안다. 그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가득 담긴 말이었는지를. 피터 버거가 선택한 ‘어쩌다’라는 말을 자꾸 되뇌이게 되는 것은 그 단어가 가진 1차적인 의미 때문은 아니다. 심드렁하게 꺼냈지만, 전혀 심드렁하지 않은 그의 진심이 잘 포개져있기 떄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