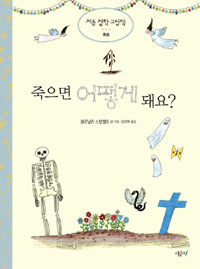
7월의 좋은 어린이 책 <죽으면 어떻게 돼요?>의 전문가 추천사입니다.
글 : 허은미(어린이 책 작가)
김애란의 장편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에는 이런 멋진 구절이 나온다. “기적이란 보통의 삶을 살다가 보통의 나이에 죽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총기난사 사고까지,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다. 유가족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지켜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아이들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자기 아이만큼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길 원한다. 나쁜 소식, 험한 꼴은 보지도 듣지도 당하지도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 일일까? 아무리 철의 장막을 치고 안 보고 안 듣게 하려고 기를 써도 아이들도 엄연히 이 사회의 일원이며, 희로애락의 감정을 지닌 인간이며, 생로병사의 숙명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해리 포터>의 작가 조앤 롤랑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왜 아이들 책에 부모의 죽음 같은 어두운 설정을 넣었느냐는 항의성 짙은 질문에 조앤 롤랑은 말한다. 문학 작품을 통해 죽음이나 삶의 어두운 면을 접하는 것은 일종의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고. 어렸을 때 예방주사를 잘 맞아야 면역력이 생기듯, 문학을 통해 정신의 면역력을 키워야 온전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다는 말이다.
수년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자란 두 딸은 한동안 할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힘들어했다. 아직 어린아이였던 둘째는 어디선가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것을 봤다는 등, 전봇대 뒤에서 할아버지가 “까꿍!” 하며 나타날 것 같다는 등 엉뚱한 말로 듣는 사람의 가슴을 시리게 했다. 생각다 못해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할아버지의 죽음을 다룬 책들을 빌려왔다. 그렇게 여러 번 책을 빌려오고 읽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아이는 서서히 할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슬픔을 객관화시킬 수 있었다.
그때 만약 아이에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를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물론 책장을 다 덮을 때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는다.(사실, 그걸 누가 알겠는가?) 그 대신 사후 세계에 대한 추측과 가설이 유머러스한 그림과 함께 등장한다. 더불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는 반드시 죽게 돼 있으며, 모든 사람이 ‘보통의 나이’에 죽는 것은 아니고 때론 예기치 않게 죽음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 특히 멕시코에서는 특별한 날 무덤에 찾아가 노래를 부르고 폭죽을 터뜨리면서 축제처럼 죽음을 기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웨덴 작가가 쓰고 그린 작품이라 우리의 장례문화가 소개되지 않는 건 아쉽지만, 곳곳에 포진해 있는 유머와 멋진 그림, 재치 있는 글이 그런 아쉬움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 시리즈의 면지에는 각 권의 주제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들어 있는데, 가령 이런 식이다.
“죽음이란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 먹고, 소화하고, 똥과 오줌을 눌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또 움직일 수도 없고,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는 상태이지요. 그래서 죽음이란 생명체가 살아 있지 않다는 뜻이랍니다.”
이 책을 보고 나서 <살아있어>(보물창고) 같은 책을 보면 어떨까?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적 같은 일인지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면 됐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전문가가 선택한 7월의 좋은 어린이 책 이벤트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