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식은 자존감은 사실 고정되거나 영구불변한 것이 아닌 것같다. 여기에서의 나의 자의식은 상당 부분 동양인, 유색인종에 닿아 있다. 백인만 있거나 너무 많은 동양인이 있거나 흑인이 있거나 그러한 것들이 부지불식 간에 의식된다. '다르다'는 반드시 어떤 위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자연스럽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아직은 부자연스럽다. 그것은 내가 그렇기도 하고 때로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러해서 그러한 것들을 전하기도 한다.
동네 도서관에서 신간은 한 곳에 모아 놓고 허리 높이에서 책을 뽑아 볼 수 있게 양방향으로 책등이 배열되어 있다. 건너편에 백인 중년 여자가 있었다. 다시 자리를 바꿔 내가 건너편으로 그녀가 내가 있던 자리로 건너오던 와중 그녀가 나에게 짜증스럽게 얘기했다. 그렇게 계속 책을 보지 말고 저기 의자가 있으니 앉아서 책을 보라는 나로서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다. 본능적으로 나는 그녀가 나를 거슬리게 느껴서 신간 코너를 어슬렁거리지 말라는 핀잔으로 받아들였다. 자격지심일까? 그녀는 내가 달라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녀의 근처에 있는 게 싫다,고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 사과를 얼버무리다 대출을 망설이던 책을 뽑아들고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도서관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정말 바보 같았다. 이런 걸까? 이게 그건가? 내가 한 일, 내가 한 말이 아닌 그냥 내 존재 자체에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한 기분은 뭐라 말로 설명하기 힘든 모멸감이었다. 한편 어느 한켠에서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시선과 대우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이게 어쩌다 겪는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거의 일상인 사람들도 있다. 가슴 한켠이 계속 아려왔다. 나는 그들이 겪었던 그리고 겪고 있는 그 수많은 고통의 만분지 일도 경험하지 못한 축에 속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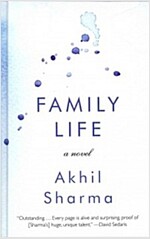

남자 줌파 라히리의 느낌일까? 미국에 정착한 인도 이민자 가정의 소년의 시선은 그보다는 훨씬 건조하고 가슴 아플 정도로 솔직하다. 아이는 인도에서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을 때에는 선택받은 소수의 자긍심 아닌 자부심이 있었지만 정작 미국에 왔을 때에는 소수자와 이방인으로서의 자의식을 뼈아프게 덧입혀야 했다. 게다가 성공적인 미국에서의 정착의 출발을 상징했던 형은 불의의 사고로 뇌에 영구 장애를 입고 침대에 누워 생활하게 되면서 소년의 성장기는 더욱더 비장한 것으로 변모한다. 그의 성장은 머나먼 이국에서 가족의 상실까지 감당해 가며 달콤하고 쉬운 것들과 결별해 가는 과정이었다. 누워있는 형은 어느새 소년의 거짓말과 환상의 매개가 된다. 소년은 위로받고 싶어 친구를 사귀고 싶어 거짓말을 시작한다. 그런 그의 모습은 그처럼 어떤 상실을 어떻게든 이겨 나가야 했던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나도 그때 견디기 위해 변명처럼 친구들 앞에서 공상과 상상으로 현실을 윤색해서 묘사했던 것같다. 그래야 그래야만 숨이라도 쉴 수 있었다. 소년의 어머니는 영어를 알지 못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길, 사람들은 그들의 피부 색깔과 그 이색적인 옷만으로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아이는 너무 슬프게도 그 영어로 된 욕설 전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묻지도 않는 어머니에게 아이는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어머니는 믿어준다. 이 이야기는 작가 자신의 것이기도 했다. 훌쩍 나이를 먹어 소위 미국 최고의 명문대를 가고 최고의 투자 은행에서 근무하며 거액을 벌어 경제적 문제에서 해방된 후에도 작가는 어린 시절 겪었던 숱한 일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 아물지 않아 아직도 그들을 대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고백한다. 누워있는 형 대신 형이 미처 이루지 못한 대부분의 꿈을 대리 실현하며 소년의 아픈 성장기는 막을 내린다. 아이는 고통을 먹고 자랐다.
그래서 솔직히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당연히 다르니까 때로 싫고 거부감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문제는 다른 이야기다. 하루키의 이야기처럼 비교적 교양 있는 사람들의 내심도 다르지는 않은데 잘 위장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그러한 대우나 그러한 이야기나 시선은 칼날 같다. 어쩌면 꼭 피부 색깔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나의 외피를 둘러싼 모든 주변인과 사물과의 경계에 위계를 입히는 과정을 마치 학습, 성장, 삶으로 포장한 것이 아닐까? 나와 조금만 달라도 내심으로 위계를 설정하고 때로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며 그것을 내면화하는 기제에 우리는 이미 포섭된 것이 아닐까?
어린 시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완벽하거나 아름답지 않다. 왜냐하면 아직 내면의 날것들을 숨길 수 없는 시간이라 그것이 때로 잔인하게 아이들 간에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성인의 사회를 모방한다. 어른들이 사는 사회의 추악한 일면은 때로 아이들 세계에서 적나라하게 재생된다. 절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된 아이들은 때로 괴물로 변모한다. 그 모습은 정치인들과도 닮았다.

하지만 그것 역시 나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결국 우리가 어른이 만드는 세계 안에 아이들의 세상이 자리잡는다. 수많은 편견과 경쟁심과 고정관념을 저도 모르게 주입하며 또 다른 우리의 최악의 단면을 극대화하여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세상은 힘과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재편하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선의로 포장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나 자문한다면 쉽게 부인하기 힘들 것같다. 성실과 열심의 지향이 가닿을 곳에 부와 권력과 힘이 놓여 있다면 그 과정에서의 소외되는 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어떻게 가르쳐질 수 있을까?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