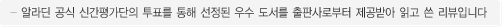[여울물소리]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여울물소리]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여울물 소리
황석영 지음 / 자음과모음 / 2012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2013년 새해 들어 읽은 첫 번째 책은 시대를 대표하는 중견 작가 중 한 명인 “황석영” 작가의 신작 소설 <여울물 소리(자음과 모음/2012년 11월)>이 되었다. 그러고 보니 황석영 작가는 그간 신문 기고(寄稿) 글이나 방송 인터뷰, 시사·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는 만나왔지만 소설 작품으로는 학창시절 필독서(必讀書)였던 장편 소설 <장길산> 이후이니 근 20 여 년 만에 만나는 셈이다. 그의 문학 인생이 지난 2012년 50 주년을 맞이했고 그만큼 많은 소설들을 발표 - 읽지는 않았지만 소설 제목들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작품들이 여럿 된다 - 해 왔는데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게 된 것은 지난 정권 들어 그가 보여준 정치적 행보가 영 마땅치 않아서였기도 했지만 전적으로 편벽(偏僻)한 나의 독서 이력(履歷)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일까? 이 책을 받아 들고서도 금세 책을 열어볼 수 가 없었다. 분명 “그”를 알고 있음에도 처음 만나는 것 마냥 “낯섦”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한동안 눈에서 멀리하다가 새해 들어 다시금 집어 든 이 책, 불과 20~30 페이지를 채 읽기도 전에 “낯섦”이 기우(奇遇)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소설은 격변기였던 19세기 후반 구한말(舊韓末) 시대를 살아갔던 민초(民草)들의 이야기다. 시골 양반과 기생 첩 사이의 서녀(庶女)인 박연옥은 열여섯 나이에 시골 부자의 후처(後妻)로 시집가게 되지만 어머니의 주점(酒店)에서 알게 되어 하룻밤 정을 나눈 이야기꾼 이신통을 못내 그리워한다. 3년 만에 친정으로 다시 돌아온 연옥은 그리워하던 신통과 재회한다. 천지도 민란에 참여했다가 큰 부상을 당하고 돌아온 신통과 짧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만 신통은 훌쩍 떠나버린다. 잠시 동안의 결혼 생활로 연옥은 아이를 가지지만 사산(死産)되고, 신통의 소식을 전해 들은 연옥은 그를 찾아 나서게 되고, 그 길에서 양반집 서얼(庶孼)로 태어났던 신통의 과거사와 천지도 입도 과정, 현재까지의 행적들을 지인(知人)과 가족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된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지만 연옥의 신통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오랜 수소문 끝에 다시 만난 둘은 이틀 동안의 짧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된다. 짧은 만남 이후 연옥은 다시 아이를 가지고 되고,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아 “노성”이라는 이름을 붙여 준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 일곱 살이 되었을 무렵 연옥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이번에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유골을 수습하러 길을 떠나게 된 연옥은 유골을 수습하고 고향 길로 돌아오는 길에 묵게 된 집에서 고요한 가운데 어디선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로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던 여울물 소리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
결코 짧지 않은 분량을 이틀 만에 다 읽었다. 낯섦으로 시작했지만 황석영 작가 특유의 입담과 서사(敍事)에 학창시절 읽었던 <장길산>의 향취와 감흥이 고스란히 다시 느껴지면서 낯섦을 금세 잊어버리고 초반부터 책에 빠져 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반동의 시대”라 일컬어지는 19세기 격변기의 “임오군란(壬午軍)”과 “동학혁명(東學革命)” 등 굵직굵직한 역사적 순간들을 관통하며 살아온 신통과 여옥의 삶의 궤적을 쫓아가는 재미가 즐겨 읽는 장르 소설 못지않게 쏠쏠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그가 풀어 놓는 구수하고 질펀한 판소리 사설들과 당시 이야기꾼들 - 이들을 “전기수(傳奇叟)” 또는 “강담사(講談師)”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 들려 주는 “장끼전”, “콩쥐팥쥐”와 같은 고전 동화들, 그리고 서럽고 애달프기만 하면서도 결코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민초(民草)들의 삶은 그를 왜 민중 소설가라고 부르는지를 여실히 깨닫게 해준다. 우리 고유의 말과 정서의 맛을,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살았던 민중(民衆)들의 삶을 이렇게 구성지고 드라마틱하게 그려낼 수 있는 작가가 이 시대에 과연 몇이나 될까? 그의 문학 인생 5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답게 작가로서 그의 문학적 소명(召命)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가 문학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여실히 가늠하게 해주는 소설이었다.
이 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일개 독자인 나로서는 감히 할 능력도 되지 않을 뿐더러 많은 분들이 알차고 좋은 서평들을 올려주셨으니 염치없게도 그분들의 글들로 가름하기로 하고 제목인 “여울물 소리”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받아들임(解釋)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겠다. 앞서 줄거리 소개에도 나와 있듯이 제목인 “여울물 소리”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여옥인 남편인 신통의 유골을 수습하고 신통의 마지막을 돌봐 준 뱃사공의 집에 하룻밤 묵는 장면에서 나온다.
까무룩하게 잠이 들었다가 얼마나 잤는지 문득 깨었다. 고요한 가운데 어디선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었다. 눈 감고 있을 때는 바로 귓가에서 들려오다가 눈을 뜨면 멀찍이 물러서서 아주 작아졌다. 가만히 숨죽이고 그 소리를 들었다. 여울물 소리는 속삭이고 이야기하며 울고 흐느끼다 또는 외치고 깔깔대고 자지러졌다가 다시 어디선가는 나직하게 노래하면서 흐르고 또 흘러갔다. (P.488)
어쩌면 책에서 그린 19세기 말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인 임오군란과 동학혁명 등은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그 성공 여부를 떠나 큰 물줄기(大河)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큰 물줄기를 이루게 된 것은 결국 바로 들릴 듯 말 듯 귓가에 맴돌듯이 흐르고 있는 수많은 여울물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가만히 숨죽이고 들어야만 비로소 들리는 물소리들이지만 분명히 흐르고 있으며, 그 물 소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기에 아무리 보잘 것 없고 가늘기만 한 물소리이지만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는, 그래서 그 소리에 담고 있는 민중들의 숨소리와 삶을 다시 한번 새겨 들으라는 작가의 바람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여울물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만 그런 여울물들이 함께 모여 이뤄내는 역사의 큰 물줄기를 제대로 바라보고(直視), 또한 그 의미를 올곧이 가슴에 담을 수 있다(理解)는 뜻일 수 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백년 후에는 우리들의 삶 또한 여울물 소리로 기억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를 다시 만나 보는 반가운 책읽기였다. 의식적이든 또는 무의식적이든 오랫동안 멀리 했던 “황석영” 이라는 이름 석자가 이 책으로 다시금 화인(火印)처럼 가슴에 각인(刻印)되었다. 이 각인, 오래 갈 것 같다.